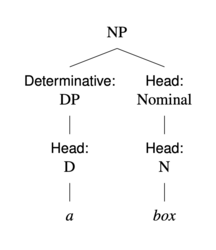이중관절음
Doubly articulated consonant이중 관절형 자음은 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발음이 동시에 발생하는 자음이다(양쪽 모두 플로시브, 또는 양쪽 비음 등). 그것들은 공칭 자음의 일부분이다. 그들은 2차 발음을 가진 공동 발성 자음과 구별되어야 한다. 즉, 같은 방식이 아닌 2차 발음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중 관절형 자음의 예로는 [k]와 [p]가 동시에 발음되는 무성 미역-벨라 플로시브[kpp]가 있다. 반면 무성 미사용 벨라 플로시브[kʷ]는 단 한 개의 정지 관절인 벨라 ([k])만을 가지고 있으며, 입술의 반올림과 동시에 근사치 같은 반올림을 하고 있다. 아랍어의 일부 방언에서는 무성 벨라 마찰음[x]은 동시 경구 수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 역시 이중 관절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중 이음매의 가능성
독립적으로 제어 가능한 4개의 관절들이 있으며, 동일한 관절 방식으로 이중화될 수 있다: 근막, 관상동맥, 등골 및 인두. (글로티스는 음음을 조절하며, 많은 자음과 동시에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관절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벨럼과 글로티스가 동시에 닫히는 발출성[kʼ]은 이중 관절성 자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w]와 [ɥ]와 같은 근사 자음은 두 배 또는 두 번째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w/는 [ɰʷ]로 번역될 수 있는 미사용 벨라(labialized velar)이지만, 일본어 /w/는 진정한 미사용 벨라(labial-velar) [ɰ͡͡β̞][citation needed]에 가깝다. 단, 근사치에는 기호 useww과 ⟨ɥ⟩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부 언어학자는 기호를 그 용어로 제한하기도 한다.
동시 다발성 치경-유방수조, *[r],r]와 같이 이중 관절형 플랩이나 전차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주장은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으로 표현된 프릭터나 친밀감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가장 악명 높은 스웨덴 음소로서 IPA 기호인 [ɧ]이 있다. 그러나 실험실 측정은 두 개의 관절 지점에서 동시 프레이션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소리는 이차적인 관절음 또는 두 개의 비동시 프리스틱의 순서인 것으로 판명된다.(이름에도 불구하고, "Voiceless labial-velar fricative"[ʍ]는 사실 무성 근사치인데, 이름은 a의 이름이다. 구별되기 전의 역사적 잔재)[citation needed] 이러한 소리는 노력하면 만들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이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나 독특한 소리로 발견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클릭은 클릭의 다양한 '유형'과 그에 할당된 IPA 편지와 등축 폐쇄를 규정하는 관상(더 드물게 근접한) 전방 관절과 관련되기 때문에 때때로 이중 관절이라고 한다. 단, 이 두 번째 등받이 폐쇄 장소는 클릭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되는 언어 수신 기류의 제어 메커니즘의 일부로 기능한다. 따라서 분출물의 글롯탈 폐쇄(그러한 자음의 기류 생성 메커니즘)가 관절의 제2의 장소로 간주되지 않는 만큼, 클릭도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설명되지 않는다. 실제로 Taa에 있는 양방향 클릭 / //의 근치 알로폰, [ʘ͡ǀ]과 같이 진정으로 이중으로 표현된 클릭을 할 수 있다.[1]
정지 상태의 이중 관절
이 잎은 멈추며, 구강과 비강 모두 이중으로 관절된 정지가 발견된다. 그러나 그들의 발음이 있는 곳에는 큰 비대칭성이 있다. 6가지 가능한 근막, 관상동맥, 등골, 인두의 조합 중에서 하나는 흔하고, 나머지는 거의 드물다.
- 공통 관절이 미근이다.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k͡p]와 같은 미근-벨라 정지 및 [q͡p]와 같은 미근-유전 정지 등이 포함된다. 동부 뉴기니는 물론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전역에서 미개척지가 발견된다. 근거리-부부 정류장은 훨씬 드물지만 콩고 민주 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사용되는 3개의 망부투-에페어 언어인 맘부투와 리스에서 발견되었다.[2] 이러한 언어에는 음소성 근위축 부분과 음소성 근위축 부분, 음소성 근위축 부분, [q͡ɓ], 음소성 근위축 부분, 음소성 벨라 부분 및 음소성 양막 부분[ɡ͡p]을 포함하여 음향 및 공기역학적 측정에 의해 확인된 몇 가지 매우 특이한 이중 관절형 정지가 있다.ch는 [ voicedɓ]라는 음성 근음파 충돌음, [ɠɓ]의 전축음, 그리고 [ tr tr̥̥](Efe에만 있음)이 트릴링된 릴리즈와 함께 비음파적 무성 근음 근음파 중지음으로서 발생한다.[2] /q͡ɓ/[2]의 모든 전화기로서 완전히 무성할 수 없는 labial-uvular[q͡p]도 발생한다.
- 두 번째 가능성인 미사-코론(labial-coronal)은 미사-양극 및 미사-양극(labial-postal volar)에 의해 음성적으로 입증된다. 뉴기니의 얄로 드네예(yelî dnye)이다. 다그바니, 네마와 같은 일부 서아프리카 언어는 높은 전면 모음 이전에 labial–postalvolars를 labial–velar의 allopones of labial-velars를 가지고 있다.
- 세 번째 가능성인 관상동맥-도맥은 소수의 언어에서 발견된다. 나이지리아에서 사용되는 이소코에는 일부 방언에서 치과-치과정지로 실현되는 라미날 치과정류소(플로시브와 나사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위에서 언급한 관절과 달리 치과나 구강정지와는 대조적이지 않으며, 피터 라데포게드는 이를 본질적으로 이중적이기보다는 "두 지역의 우연한 접촉"으로 간주한다. Hadza는 치경-치경-치경 측위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치과 접촉은 선택 사항이다. 이와 유사하게, 마웅과 같은 호주의 몇몇 언어들에는 "치에서 단단한 미각까지 전 지역을 포괄하는 확장된 폐쇄"와 함께, 소수 우체통의 변형인 치아-팔이 있다. 두 경우 모두 이중 발음은 입의 지붕과 본질적으로 넓은 접촉성을 갖는 소수 자음의 변형이다. 르완다는 때때로 내 /m³/, /b//, tw /tk//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것들은 이중 관절이 아니라 자음 순서다. 스웨덴어의 sj-sound [ɧ]가 사실 벨라 마찰음 [x]와 치경 후 마찰음 [ pronounced]이 동시에 발음된다면 그것은 관상음이다.
- 후두경이 관련될 나머지 세 가지 가능성은 최근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광섬유 후두경(fiber-optic laryngoshy)의 출현과 함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후두경 및 후두경 활동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어 /q/는 최근 경구-입자음[q͡]인 것으로 밝혀졌다.[1] 이러한 소리가 얼마나 널리 퍼질 수 있는지, 또는 후두 자음과 관상 자음 또는 유사 자음이 결합될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반투어는 일라어, 카푸에 트와어, 룬드웨어에는 연구용 광택과 팔라토 광택 프리크러티브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자세한 내용은 Ila 언어를 참조하십시오.
삼중 관절
삼행성 자음은 글로탈화 이중성 자음으로만 증명되며, 이는 다른 글로탈화 자음이 이중성 자음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3성 자음이 아닌 음운화 또는 기류 메커니즘의 효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유형의 글로탈라이즈 클릭이다. 또 다른 예로는 베트남어로 '유료되지 않은' 최종 /k/가 있는데, /u/ 또는 /w/이후로는 종종 labial-velar[kpp̚ʔ]가 된다.
참조
- ^ 트래일, 앤서니(1985) 부쉬먼의 음성학 및 음성학적 연구. (Qellen sur Khoisan-Forschung, 1) 함부르크: 헬무트 버스케.
- ^ a b c Didier Demolin, Bernard Teston (September 1997). "Phonetic characteristics of double articulations in some Mangbutu-Efe languages" (PDF). International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803–806.
- 피터 라데포게드와 이안 매디슨, 세계 언어의 소리. 블랙웰 출판사, 1996년 ISBN 0-631-198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