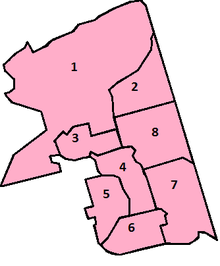설명 스타일
Explanatory style설명 스타일은 사람들이 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는지 자신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여주는 심리적 속성이다.
양상
개인적인
이 측면은 사건의 원인을 내부 또는 외부 출처에 귀속시키는 정도를 포함한다. 낙천주의자는 나쁜 경험을 불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반면 비관주의자는 자신의 잘못이나 처벌이라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은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적응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외부 세력에 귀속시킬 수도 있다(예를 들어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영구적
이 측면은 안정적 대 불안정적(시간 경과에 따른)으로 간주되는 특성을 포함한다. 낙관론자는 자신의 실패를 불안정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비관론자는 "나는 시험을 잘 못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퍼베이시브
이러한 구별은 글로벌 대 국부 및/또는 특정 효과의 범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비관주의자는 '어디서나 불행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낙관주의자는 '나는 주로 정직한 사람들과 거래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성격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무한정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러한 사건들이 그들 삶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 비관적인 해명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여준다.[1] 반대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 외부의 힘을 비난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으며, 그러한 사건들이 그들의 삶의 너무 많은 측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낙관적인 설명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여준다.[2]
일부 연구에서는 비관적인 설명방식이 우울증이나[3] 신체적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4] 설명 스타일의 개념은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사이의 흑백 차이보다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건 모두에 대해 가능한 광범위한 반응을 포괄한다. 또한, 개인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반드시 통일된 설명 스타일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귀인 스타일에 관한 문헌
Abramson, Seligman, Teasdale(1978)은 부정적인 결과를 내부적, 안정적, 세계적 원인에 귀속시키는 독특한 방법이 그들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에 대응하여 우울증과 연관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울증에 대한 연구에서 귀속적인 스타일이 나왔다. 우울증의 직교-스트레스 모델로서,[5] 모델은 객관적 부정적인 사건(스트레스터)이 없는 경우 우울증과 귀인적 스타일의 연관성을 예측하지 않는다. 그 이론의 104개의 경험적 연구의 메타 분석은 그 예측이 뒷받침된다는 것을 나타낸다.[6] 그러나 데이터는 모호했고, 일부 연구자들은 이 이론이 잘 뒷받침된다고 믿고 있으며, 일부는 인상적인 경험적 뒷받침이 없었다고 믿고 있으며, 일부는 적어도 이론 초기에는 이 이론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7] 모델에 대한 연구의 모호성을 설명하는 한 가지 요인은 연구자들이 가상의 사건이나 실제 사건에 대한 귀속성을 평가했는지 여부다. 가상 사건에 대한 귀속성을 살펴본 연구는 이 연구들이 사건 심각도를 통제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모델을 더욱 뒷받침해 주었다.[5]
"배운 무력감" 모델은 아브람슨, 셀리그만, 티스데일 진술의 원론적인 근거를 귀속적 스타일에 대해 형성했다.[8] 더 최근에, 에이브람슨, 메탈스키, 알로이즈는 변형된 "홉리스 이론"[7]을 제안했다. 이것은 절망적인 우울증과 더욱 제한적인 비관주의를 두드러지게 했다. 내적성보다는 안정성과 글로벌성의 차원을 강조하고, 안정성과 글로벌적 귀속성(내적 원인 귀속성보다는)이 절망성 우울증과 연관돼 있음을 시사한다. 절망 이론은 또한 임상적 우울증의 요인으로 인과적 귀속 외에 부정적인 결과의 인식된 중요성과 결과를 강조한다.
연령대 별로, 귀인 양식의 신뢰 신뢰 부족의 경험에서 행사에[9]일부 유전, 기초 위해 쌍둥이 연구 귀인 style.,[9]아이스너까지 증거와 함께 시작하는 제안되어 왔다 반면에 반복 노출은 조절할 수 있는 행사에 반복적 노출, 낙관적인 설명 스타일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다. unc에존재 가능한 이벤트는 부정적인 귀속 스타일을 조성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가 낙관적인 해설 스타일을 구축한다고 주장한다.[9]
측정
귀인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Attributional 스타일 질문지나 ASQ,[10]6과 6긍정적인 가상의 사건 확대 Attributional 스타일 질문지나 EASQ,[11]는 18가상의 부정적인 이벤트에 대한 사례를 평가하며 부정적인 것에 대해 사례 평가하고 다양한 피하에 같은 설문지를 활용하여 평가된다.ales를t는 Real Events Attributional Style 앙케이트[12] 또는 Attributions 앙케이트와 같은 실제 이벤트에 대한 귀속성을 평가한다.[13] 이러한 척도가 귀인 스타일 연구를 위한 경험적 방법론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험적 데이터가 에이브람슨-셀리그만-을 지원한다.티스데일 우울증 모델, 이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Cutrona, Russell, Jones는 partum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서 상당한 상호관계적 편차와 일시적 귀속적 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14] 그러나 Xenikou는 Cutrona, Russell, Jones가 내부화보다 안정성과 글로벌리즘의 교차적 일관성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다고 언급한다.[15] Burns와 Seligman의 일기 연구에서 귀인 스타일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지지하는 더 많은 데이터가 나왔다.[16] 이 저자들은 '베어바텀 설명의 내용 분석(CAVE)'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귀속형태를 찾아냈다.[17][16]
귀인 스타일은 도메인별로 다를 수 있다. 앤더슨과 동료들은 Attributional Style Assessment Test를 사용하여 작업 관련 귀속 대 대 대인 관계 귀속과 같은 영역별 스타일의 특정성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찾아냈다.[18]
ASQ의 항목을 모델링하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건 정보(예: 승진, 실직 등)와 귀속 인과관계(예를 들어 사건이 범지구적 또는 범위상 국소적 또는 일시적 안정 또는 불안정적)가 구별되는 요소를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의 용기와는 무관하게 세계적인 초점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19] 그러한 영향은 글로벌 대 로컬 우선 순위라고 하는 인식에서 더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낙관적 귀속과 비관적 귀속성은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들 양식이 뚜렷한 유전적, 환경적 기원을 갖는 모델을 뒷받침했다.
다른 구조와의 관계
귀인 스타일은 적어도 피상적으로 통제의 중심과 유사하다. 그러나 지배력의 중심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반면 귀속 스타일은 과거의 귀속과 관련이 있다.[20]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 모두에 걸쳐 통제력의 위치가 감소하는 반면, 귀인 스타일 분야의 저자들은 실패가 내부, 안정 및 글로벌 요인과 외부, 불안정 및 특정 원인에 대한 성공으로 귀속되는 비관적 설명 스타일과 낙관적 설명 스타일을 구별해 왔다.ch의 성공은 내부적, 안정적, 세계적 요인과 외부적, 불안정하고 특정한 원인에 대한 실패에 기인한다.[21]
참고 항목
참조
- ^ 셀리그먼, 마틴 학습된 낙관론. 뉴욕, 뉴욕: 포켓북스, 1998.
- ^ 셀리그먼, 마틴 학습된 낙관론. 뉴욕, 뉴욕: 포켓북스, 1998.
- ^ Seligman, M. E. P.; S. Nolen-Hoeksema (1987). "Explanatory style and depression". In D. Magnusson and A. Ohman (ed.). Psychopathology: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pp. 125–139. ISBN 978-0-12-465485-3. OCLC 12554188.
- ^ Kamen, Leslie P.; M. E. P. Seligman (1987). "Explanatory style and health". Current Psychological Research and Reviews. 6 (3): 207–218. doi:10.1007/BF02686648. S2CID 144589303.
- ^ a b Robins, C. J.; A. M. Hayes (1995). "The role of causal attributions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In G. M. Buchanan and M. E. P. Seligman (ed.). Explanatory Style.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 71–98. ISBN 978-0-8058-0924-4.
- ^ 스위니, P.D., K.앤더슨, S. 베일리(1986년)."우울증에 귀인 스타일은meta-analytic 검토".사회 심리학 저널 50(5):974–91. doi:10.1037/0022-3514.50.5.974.PMID 3712233.람슨 씨, L.Y.F. 나 Metalsky에 인용한;L.B합금(1989년)."Hopelessness 우울증:한 이론 depression"의 하위 유형 기반을 두고 있다.심리학 개관 학술지. 96(2):358–372. doi:10.1037/0033-295X.96.2.358.
- ^ a b Abramson, L. Y.; F. I. Metalsky; L. B. Alloy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 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 (2): 358–372. doi:10.1037/0033-295X.96.2.358.
- ^ Abramson, L. Y.; M. E. P. Seligman; J. D. Teasdale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1): 49–74. doi:10.1037/0021-843X.87.1.49. PMID 649856.
- ^ a b c Eisner, J. E. (1995). "The origins of explanatory style: Trust as a determinant of pessimism and optimism". In G. M. Buchanan and M. E. P. Seligman (ed.). Explanatory Style.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 49–55. ISBN 978-0-8058-0924-4.
- ^ Peterson, C.; A. Semmel; C. von Baeyer; L. Abramson; G. I. Metalsky; M. E. P. Seligman (1982).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3): 287–289. doi:10.1007/BF01173577. S2CID 30737751.
- ^ Peterson, C.; P. Villanova (1988). "An expanded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 87–89. doi:10.1037/0021-843X.97.1.87. PMID 3351118.
- ^ Norman, P. D.; C. Antaki (1988). "Real events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7 (2–3): 97–100. doi:10.1521/jscp.1988.7.2-3.97.
- ^ Gong-Guy, Elizabeth; Constance Hammen (October 1980). "Causal perceptions of stressful events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outpati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5): 662–669. doi:10.1037/0021-843X.89.5.662. PMID 7410726.
- ^ Cutrona, C. E.; D. Russell; R. D. Jones (1984). "Cross-situational consistency in causal attributions: Does attributional style exi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5): 1043–58. doi:10.1037/0022-3514.47.5.1043.
- ^ Xenikou, A.; A. Furnham; M. McCarrey (1997). "Attributional style for negative events: A proposition for a more valid and reliable measaure of attributional styl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8: 53–69. doi:10.1111/j.2044-8295.1997.tb02620.x.
- ^ a b Burns, Melanie O.; M. E. P. Seligman (March 1989). "Explanatory style across the life span: Evidence for stability over 52 yea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3): 471–77. doi:10.1037/0022-3514.56.3.471. PMID 2926642.
- ^ "Archived copy".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15-02-13. Retrieved 2010-03-05.
{{cite web}}: CS1 maint: 타이틀로 보관된 사본(링크) - ^ Anderson, C. A.; D. L. Jennings; L. H. Arnoult (1988). "Validity and utility of the attributional style construct at a moderate level of specific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6): 979–990. doi:10.1037/0022-3514.55.6.979.
- ^ Liu, C.; Bates, T. C. (2014). "The structure of attributional style: Cognitive styles and optimism–pessimism bias in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6: 79–85. doi:10.1016/j.paid.2014.03.022.
- ^ Furnham, A.; H. Steele (1993). "Measuring locus of control: a critique of general, children's health and work related locus of control questionnaire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4 (4): 443–79. doi:10.1111/j.2044-8295.1993.tb02495.x. PMID 8298858.
- ^ Buchanan, Gregory McClellan; M. E. P. Seligman (1995). Explanatory style.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SBN 978-0-8058-0924-4. OCLC 29703766.[페이지 필요]
추가 읽기
- Lefcourt, Herbert M. (April 1966).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65 (4): 206–20. doi:10.1037/h0023116. PMID 5325292.
- Oettingen, Gabriele (1995). "Explanatory style in the context of culture" (PDF). In Buchanan, Gregory McClellan; Seligman, Martin E. P. (eds.). Explanatory Style. Erlbaum Press. pp. 209–224. ISBN 9780805809244.
- Seligman, M. (2006).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New York City: Random House. ISBN 978-1-4000-7839-4.
- Weiner, Bernard (1974). Achievement Motivation and Attribution Theory. Morristown, New Jersey: General Learning Press. ISBN 978-0-382-25065-1. OCLC 1031013.
외부 링크
| 무료 사전인 위키트리노에서 설명 스타일을 찾아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