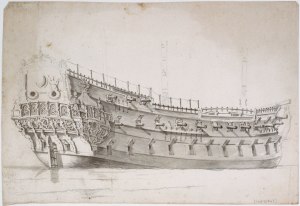갈릴레이 유대화
Judaization of the GalileeJudaization of the Galilee (Hebrew: ייהוד הגליל Yehud ha-Galil; Arabic: تهويد الجليل, tahweed al-jalīl) is a regional project and policy of the Israeli government and associated private organizations which is intended to increase Jewish population and communities in the Galilee, a region within Israel which has an Arab majority.[1][2][3]
배경
1948년 5월 중순에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이 종식되고 영국군이 철군하면서 유대인과 아랍계 사이의 내전은 이스라엘 독립선언과 함께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의 군대가 옛 국경을 넘어갔다.e 영토, 그리고 아랍과 이슬람 국가로부터의 유대인 이탈이 일어났고, 때때로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떠나면서, 대부분의 경우 무력으로, 그들 중 대다수가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유엔총회 결의안 181호에 담긴 팔레스타인 분할계획은 유대인과 아랍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후자에는 서부 갈릴레이 지역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4] 그러나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의 공식적인 적대행위를 종식시킨 1949년 정전협정에 따라 이 지역은 대신 이스라엘로 편입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 소멸된 아랍 인구는 여전히 이 지역에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5]
이스라엘의 독립은 시오니즘 운동의 우선순위가 유대인 이민자들의 안전한 영토 기반 확보(이들 중 다수는 유럽 박해의 피난민)에서 새롭게 탄생한 주권국가의 실행 가능한 유대인 공동체를 건설하고 '탈주자의 유입과 동화'(mizug galuyot)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했다.[6]
오렌 이프티첼에 따르면 유대화는 1948년 전쟁으로 추방된 75만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환을 막고,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유대인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 차원의 정책이며, 전쟁 후에도 그 곳에 남아 있던 아랍 인구의 13~14%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6] 유대화는 또한 아랍인으로부터 수용된 땅을 유대인에게 양도하는 것, 1948년과 1967년 6일 전쟁으로 주민들이 도망치거나 추방당한 아랍인 마을, 마을, 이웃들의 물리적 파괴, 아랍인의 정착과 개발에 대한 제한, 유대인의 도시와 산업 중심지인 헤브라에 대한 병행 개발 등을 수반하고 있다.팔레스타인의 지명(아랍어 지명 대신 히브리어 지명)과 유대인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시 경계선의 재구축.[7][8] 유대화 전략의 두 가지 주요 지역은 네게브와 갈릴레이다.[6]
시행이력
'갈릴레이 유대인' 정책은 1949년 3월 이스라엘 내각에 의해 처음으로 승인되었다.[5] 1950년대 초반부터 유대인 기구, 이스라엘 방위군(IDF), 내무부는 갈릴리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조율했다.[9] 이 프로젝트의 주요 지지자들은 "아랍의 위협"을 줄이고 "유대국가 내 아랍 민족주의의 핵"의 형성을 막기 위해 갈릴레이에서 유대인 다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요세프 나마니와 요세프 웨이츠를 포함했다.[1]
갈릴레이를 개발하여 유대인 다수로 채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는 1953년 토지취득법이 있었는데, 토지취득법은 시행 후 첫 해에 아랍인 소유의 1,22만 두남의 토지를 몰수하였다.[1]
나마니는 1953년 데이비드 벤구리온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자렛 시에 유대인을 정착시키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10] 1954년 하반기, 국방부는 갈릴리 개발부를 설치하여 갈릴리 정착 계획에서 그 해 정부가 설립한 나사렛 일리트(Upper Nazareth)의 새로운 유대인 정착을 배려하는 역할을 확대하였다.[9] 나자렛 일릿은 나자렛 자체보다 인구수는 적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북구의 행정수도가 되었다. 1962년 나자레스 일릿과 같은 아랍 마을에 유대인 도시 카르미엘이 생긴 것도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몫했다.[11]
유대화 정책을 시행한 또 다른 이유는 "유엔이 아랍 국가로 지정한 이 땅들 중 어떤 것도 아랍의 통제에 반환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데이비드 맥도왈은 말했다.[11] 1964년까지 이스라엘 북구에는 200개 이상의 유대인 정착촌이 존재했고, 갈릴레이에서는 유대인이 집중적인 정착을 한 결과, 유대인이 팔레스타인보다 3:2로 앞섰다.[11]
유대인 이주 정책을 타겟으로 하는 지역으로 유대인의 이주를 유치하기 위해 공공자원을 정비하여 세제 혜택, 토지 및 주택 보조금, 저금리 대출, 임대료 지원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직접설립보조금도 제공되었고 유대인 정착촌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기반시설이 개발되었다.[12]
1970년대 사업 추진에는 1976년 2월 '갈릴레이의 유대화' 기치 아래 명시적으로 발표한 아랍 땅에 대한 국가의 추가 몰수 작업이 수반되었다.[13] 이 발표는 6명의 아랍 시민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군에 의해 부상당하고 체포되는 아랍 인구의 총파업과 시위를 촉발시켰다. 이 행사들은 매년 팔레스타인에 의해 랜드 데이에 기념된다.[13]
1970년대 중반까지 "갈릴리에서의 유대인 정착운동은 실패작임이 분명했다."[14] 쾨니히 비망록의 저자인 이스라엘 코에닉은 1977년 갈릴리 유대화의 요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14] 국제환경개발연구원은 아랍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들의 지속적인 토지 소유가 한국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주창했던 쾨니히에게 경악의 원천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14]
갈릴리에서의 유대화 노력은 계속되었고, 1990년대 중반까지 갈릴리(및 네게브)의 인구구조가 크게 바뀌었지만, 갈릴리 중심부에서 아랍인들은 여전히 인구의 72%를 차지하고 있다.[12] 1995년 지역계획위원회가 초안해 언론에 유출한 갈릴레이 계획지도가 유대인 정착촌 증대를 통한 유대화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팔레스타인 지리적 연속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배포됐다.[15]
아사프 아디브는 제2차 인티파다 발생 이후 정부가 갈릴리 개발정책을 기술하기 위해 '유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했지만, 정부 정책은 갈릴리 유대인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아 있다고 말한다.[16]
아랍-유위시 혼합 공동체
정부가 유대인 인구를 갈릴레이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의 예기치 않은 효과는 아랍과 유웨이의 혼합된 공동체의 성장이었다. 하아레츠의 메이론 라파포트는 "갈릴리 유다이즈를 향한 분노는 역설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썼다. "번영하는 유대인들은 북부 도시를 떠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는 아랍인들이 온다."[17] 정부가 유대인 정착을 위한 마을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동안 유대인들은 예상대로 이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았다.[18] 한편, 자기 마을에서의 개발 제한으로 인해 주거 선택권이 점점 제한되고 있던 아랍인들은 유대인 마을에 있는 단위를 구입했다.[18] 현재 상부 나자렛(약 20%)과 카르미엘(10%)[19]을 포함한 몇몇 새로운 갈릴레이 마을에 상당한 아랍 인구가 살고 있다.
이러한 통합을 다루기 위한 국가 정부의 지침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는 이러한 발전을 다루기 위해 스스로에게 맡겨졌다. [18][19] 예를 들어, 갈릴레이 하부의 메나시 지역 의회는 아랍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랍어 강좌에 도시 노동자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18] 미스가브 지역 의회는 "모든 부문 간의 협력"을 선언했다. 유대인과 아랍인"은 발전 목표지만,[20] 유대인과 아랍인 관계는 문제가 없었다.[21]
이스라엘의 비정부기구(NGO)는 통합을 촉진하고 정부 개발 정책을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아브라함 펀드의 Amnon Beeri-Sulitzeanu 공동이사는 "혼합된 분야에서 공유사회를 촉진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 계획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사회경제, 교육, 공공, 정부의 고려를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썼다.[18] "오늘날 이스라엘이 혼혈 국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혼합 도시와 지역의 유대-아랍 관계의 본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참고 항목
참조
- ^ a b c 피로, 1999, 페이지 134-135. 그것을 "프로젝트"라고 부른다.
- ^ 벤-아미 외, 2000년, 페이지 249. 그것을 "지역 정책"이라고 한다.
- ^ 1980년 129페이지 이를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이 수행하는 지속적인 체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 ^ 맥도월, 1991, 페이지 127.
- ^ a b 라비노위츠 1997, 페이지 6
- ^ a b c 이타첼 외, 2001, 페이지 118–120.
- ^ 홀츠만-가짓, 2007, 페이지 105.
- ^ 야코비, 2009년, 페이지 9. "우주 유대화와 탈아랍화는 다양한 전략을 채택했고, 1948년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비행과 퇴거에 이은 것이었다. 여기에는 반환권 방지, 아랍인 400여 마을 파괴(모리스 1987년), 이스라엘에 남아 있던 아랍인 소유 토지의 5060% 가량을 수용(케다르 1998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 a b 수피안과 레빈, 2007, 페이지 81–83.
- ^ 웨슬리, 2006년, 페이지 29.
- ^ a b c 맥도월, 1991, 페이지 131.
- ^ a b 2001년 이타첼, 페이지 120.
- ^ a b 키머링과 미그달, 2003, 페이지 195.
- ^ a b c IED, 1994, 페이지 98.
- ^ 카나네, 2002 페이지 53.
- ^ Assaf Adiv (May–June 2001). ""Judaizing" Galilee!". Challenge: a Jerusalem Magazine o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August 17, 2002.
- ^ Meiron Rapaport (November 17, 2007). מעורב צפוני [Mixed North]. Haaretz (in Hebrew).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une 5, 2011. Retrieved October 15, 2014.
- ^ a b c d e Amnon Be'eri-Sulitzeanu (March 15, 2009). "A coexistence-policy imperative". Haaretz. Retrieved October 15, 2014.
- ^ a b Ofer Petersburg (December 12, 2007). "Jewish population in Galilee declining". Ynetnews. Retrieved October 15, 2014.
- ^ חזון מועצה אזורית משגב [Misgav Regional Council Vision] (in Hebrew). Misgav Regional Council.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October 25, 2007.
- ^ 예를 들어,
참고 문헌 목록
- Ben-Ami, Shlomo; Peled, Yoav; Spektorowski, Alberto (2000). Ethnic challenges to the modern nation state (Illustrated ed.). Palgrave Macmillan. ISBN 978-0-312-23053-1.
- Falah, Ghazi (1991). "Israeli "Judaization" Policy in Galilee".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on behalf of the Institute for Palestine Studies. 20 (4): 69–85. doi:10.1525/jps.1991.20.4.00p0268u. JSTOR 2537436.
- Holzman-Gazit, Yifat (2007). Land expropriation in Israel: law, culture and society. Ashgate Publishing, Ltd. ISBN 978-0-7546-2543-8.
- Firro, Kais (1999). The Druzes in the Jewish state: a brief history (Illustrated ed.). BRILL. ISBN 9789004112513.
- Kanaaneh, Rhoda Ann (2002). Birthing the nation: strategies of Palestinian women in Israel (Illustrated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53. ISBN 978-0-520-22379-0.
judaization galilee.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 Development (IIED) (1994). Evictions - 7010iied. IIED. ISBN 978-1-84369-082-5.
- Kimmerling, Baruch; Migdal, Joel S. (2003). The Palestinian people: a history (Illustrated ed.). Harvard University Press. ISBN 9780674011298.
- Lustick, Ian (1980). Arabs in the Jewish State: Israel's control of a national minority (2nd ed.). University of Texas Press. ISBN 978-0-292-70347-6.
- McDowall, David (1991). Palestine and Israel: The Uprising and Beyond (Reprint, illustrated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ISBN 978-0-520-07653-2.
- Rabinowitz, Dan (1997). Overlooking Nazareth: the ethnography of exclusion in Galilee (Illustrate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 978-0-521-56495-3.
- Sufian, Sandra Marlene; LeVine, Mark (2007). Reapproaching borders: new perspectives on the study of Israel-Palestine (Illustrated ed.). Rowman & Littlefield. ISBN 9780742546394.
- Wesley, David A. (2006). State practices and Zionist images: shaping economic development in Arab towns in Israel (Illustrated ed.). Berghahn Books. ISBN 9781845450588.
- Yacobi, Haim (2009). The Jewish-Arab city: spatio-politics in a mixed community (Illustrated ed.). Taylor & Francis. ISBN 978-0-415-44500-9.
- Yiftachel, Oren (2001). Oren Yiftachel; Jo Little; David Hedgcock (eds.). The power of planning: spaces of control and transformation (Illustrated ed.). Springer. ISBN 978-1-4020-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