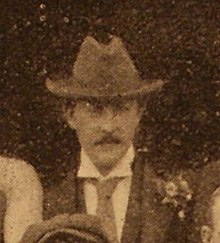클라인 역설
Klein paradox이 글은 물리학 전문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 제시된 도표와 해석은 확인이 필요하다.위키프로젝트물리학( Project )이 수 2019년 10월) |
물리학자인 오스카 클라인은[1] 1929년 잠재적 장벽에서 전자 산란이라는 익숙한 문제에 디락 방정식을 적용해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비상대적 양자역학에서는 전자 터널링을 방벽으로 관측하며, 지수적 감쇠가 있다. 그러나 클라인의 결과는 잠재력이 전자 질량 ~ m 인 경우장벽이 거의 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전위가 무한대에 가까워질수록 반사는 줄어들고 전자는 항상 전달된다.
그 역설의 즉각적인 적용은 중성자가 발견되기 전, 핵 내의 중성입자에 대한 러더포드의 양성자-전자 모델에 대한 것이었다. 그 역설은 핵 안에 갇힌 전자의 개념에 양자역학적으로 반대했다.[2] 이 명확하고 정확한 역설은 전자가 어떤 전위 우물에 의해서도 핵 안에 갇힐 수 없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 역설의 의미는 당시 치열하게 논의되었다.[2]
질량이 없는 입자
< > 및 모멘텀 의 잠재적 단계에 접근하는 질량 없는 상대론적 입자를 고려하십시오
입자의 파동 인 , 은 시간 독립적인Dirac 방정식을 따른다.
그리고 는 Pauli 행렬이다.
입자가 왼쪽에서 전파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해결책을 얻는데, 하나는 단계 전, 하나는 지역 (1)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잠재력 (2)에서 얻는다.
여기서 계수 A, A′, B는 복잡한 숫자다. 수신 및 송신파 함수는 모두 양의 그룹 속도(그림 1의 파란색 선)와 연관되어 있는 반면, 반사파 함수는 음의 그룹 속도와 연관되어 있다. (그림 1의 녹색 선)
이제 전송 및 반사 계수 , . 을(를) 계산하려고 한다. 이 계수들은 확률 진폭 전류에서 파생된다.
Dirac 방정식과 관련된 확률 전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전달 및 반사 계수는 다음과 같다.
= 에서 파형 함수의 연속성:
그래서 전송 계수는 1이고 반사되는 것은 없다.
역설의 한 가지 해석은 잠재적 단계가 질량이 없는 상대론 입자의 집단 속도의 방향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위에 인용한 단일 입자 용액에 가장 적합하다. 그 밖의 문헌에서는 입자-항문자 쌍의 전위성으로 인해 구속되지 않은 튜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양자장 이론의 맥락에서 보다 복잡한 해석을 제시한다.
매시브 케이스
이 구간은 확장이 필요하다. 더하면 도움이 된다.(2018년 5월) |
대규모 사례의 경우, 계산은 위와 유사하다. 그 결과는 질량이 없는 경우만큼이나 놀랍다. 전송 계수는 항상 0보다 크며, 전위 단계가 무한대로 갈 때 1에 접근한다.
클라인 존
입자의 에너지가 < < V- 범위에 있으면 전체 반사보다는 부분 반사가 발생한다.
대규모 사건 해결책
전통적인 분해능은 양자장 이론(Hansen 1981년)의 맥락에서 입자/반입자 쌍 생성을 사용하지만, 물리적 쌍 생성을 장벽 아래 음의 에너지 해결책의 산란을 대체하는 단순한 분해능이 존재한다(Alhaidari 2009년). 이 전략은 무한정 사각형의 우물용 디락 방정식에 대한 분석적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도 적용되었다.
기타경우수
이러한 결과는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되었고, 선형 계단, 사각 장벽, 부드러운 전위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전위로 확장되었다. 그래핀의 전자 운송에 관한 많은 실험들은 질량이 없는 입자에 대해 클라인 역설에 의존한다.[3][4]
참고 항목
참조
- ^ Klein, O. (1929). "Die Reflexion von Elektronen an einem Potentialsprung nach der relativistischen Dynamik von Dirac". Zeitschrift für Physik. 53 (3–4): 157. Bibcode:1929ZPhy...53..157K. doi:10.1007/BF01339716.
- ^ a b Stuewer, Roger H. (1985). "Niels Bohr and Nuclear Physics". In French, A. P.; Kennedy, P. J. (eds.). Niels Bohr: A Centenary Volum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97–220. ISBN 0674624165.
- ^ Katsnelson, M. I.; Novoselov, K. S.; Geim, A. K. (2006). "Chiral tunnelling and the Klein paradox in graphene". Nature Physics. 2 (9): 620. arXiv:cond-mat/0604323. Bibcode:2006NatPh...2..620K. doi:10.1038/nphys384.
- ^ Pendry, J. B. (2007). "PHYSICS: Negative Refraction for Electrons?". Science. 315 (5816): 1226–7. doi:10.1126/science.1140178. PMID 17332397.
추가 읽기
- Dombey, N; Calogeracos, A. (July 1999). "Seventy years of the Klein paradox". Physics Reports. 315 (1–3): 41–58. Bibcode:1999PhR...315...41D. doi:10.1016/S0370-1573(99)00023-X.
- Robinson, T. R. (2012). "On Klein tunneling in graphene". American Journal of Physics. 80 (2): 141–147. Bibcode:2012AmJPh..80..141R. doi:10.1119/1.3658629.
- Calogeracos, A.; Dombey, N. (1999). "History and physics of the Klein paradox". Contemporary Physics. 40 (5): 313. arXiv:quant-ph/9905076. Bibcode:1999ConPh..40..313C. doi:10.1080/001075199181387.


 잠재적 단계에 접근하는 질량 없는 상대론적 입자를 고려하십시오
잠재적 단계에 접근하는 질량 없는 상대론적 입자를 고려하십시오








 (를) 계산하려고 한다. 이
(를) 계산하려고 한다. 이 
![J_{1}=2\left[\left|A\right|^{2}-\left|A'\right|^{2}\right],\quad J_{2}=2\left|B\right|^{2}\,](https://wikimedia.org/api/rest_v1/media/math/render/svg/3d904d953ab1a5f259c32036b600913eedde9d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