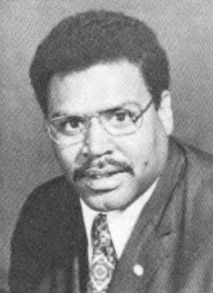음악적 평형이론
Theory of musical equilibration음악적 평형 이론(독일어: die strebetenz-theory, 문자 그대로 이론을 노력하는 경향)은 음악이 직접적으로 감정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신 청취자가 "음악적으로 인코딩된 의지의 과정과 동일시"하고 그것들을 해석하여 감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는 심리 이론입니다.[1] 이 이론은 음악 이론가 에른스트 쿠르트의 음악 심리학에 소개된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청취자들이 주법의 해결을 피하기 위한 열망으로 동일시할 것을 제안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있습니다. 이 이론은 1997년 독일의 음악 이론가 베른트 윌리멕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그는 그의 아내이자 동료 이론가인 다니엘라 윌리멕과 함께 이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1997년과 2012년 사이에, 그들은 2000명 이상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특정한 음악 작곡의 감정적인 측면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일련의 연구를 세계 곳곳에서 수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조화와 정서적 효과 사이의 연관성을 비슷하게 해석했으며, 86% 정도의 답변이 일치했습니다.
개요
베른트 윌리멕은 1987년[2] 그의 논문인 Das musikalische Raumphänomen(음악적 공간 현상)에서 처음으로 음악적 평형에 대한 생각을 탐구했습니다. 이 논문은 에른스트 쿠르트의 1931년 저서 음악심리학에 소개된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 책에서, 커스는 음악이 먼저 물리적으로 경험되고, 청취자들이 주파수를 음악으로 인지하기 전에 "내부 번역"을 거쳐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Kurth는 청취자들이 "순수한 느낌"을 사용하여 음악의 물리적인 잠재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Willimek는 청취자들이 물리적인 잠재적 에너지보다는 음악에서 의지(또는 자발적인 콘텐츠)의 음악적으로 인코딩된 과정과 동일시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이 아이디어에 도전했습니다.[1] 그는 또한 청취자들이 리딩 노트를 변함없이 유지하려는 열망으로 동일시한다고 언급했습니다.[citation needed] 이것은 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음들 사이에 "끌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 커트의 가설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3] Willimek는 1997년 Karlsruhe University of Music과 University of Rostock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 이 이론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은 1998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1]
1997년부터 베른드 윌리멕과 그의 아내이자 동료 이론가인 다니엘라 윌리멕은 이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citation needed] 음악적 평형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음악 자체가 감정적인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듣는 사람들이 음악의 추상적인 자발적인 내용과 동일시하여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3] 다른 화음은 존재하는 자발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감정 반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강약화음은 종종 듣는 사람이 쾌활함을 인식하게 하는 반면, 작은 강약화음은 그들이 (부드럽게 연주될 때) 슬프거나 (크게 연주될 때) 화가 난 것으로 해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4]
국제학
1997년, 윌리멕스 부부는 앞으로 15년 동안 전 세계 2,100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게 궁극적으로 투여할 테스트를 고안했습니다. "로키 테스트"로 알려진 이 테스트는 참가자들에게 동화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로키 왕자의 8가지 장면과 음악적 선택을 일치시키도록 요청했습니다. 각각의 음악 선곡은 특정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화음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움(증강화음), 전진하는 느낌(지배적), 무중력(전체 음계), 절망(7화음 감소), 용기(자연적 단조), 정서적 따뜻함(주요 하위 영역에서 6번째 추가), 소원한 이별(주요 7번째 하위 영역에서 6번째 추가), 외로움(단조 하위 영역에서 6번째 추가)이 포함됩니다.[citation needed] 독일, 오스트리아(빈 소년 합창단 단원 포함), 태국, 일본, 중국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여 86%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시험은 시드니, 리우데자네이루, 헬싱키, 스톡홀름에 있는 독일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시행되었습니다.[5]
두 연구원은 또한 "기본 테스트"라고 알려진 두 번째 테스트를 개발했는데, 이 테스트에서 그들은 학생들에게 (동화 속 장면보다는) 기본적인 감정 개념과 화음을 맞추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92%의 정답이 일치했습니다.[5] 이 연구의 결과는 2011년 "음악과 감정:"이라는 제목의 책에 실렸습니다. 음악적 평형이론에 관한 연구 이 책은 2013년에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6] 독일어 버전의 업데이트된 책은 2019년 Deutscher Wissenschafts-Verlag를 통해 출판되었습니다.[7] 이 연구는 음악과 정서 인식,[8] 음악 치료,[9] 선언적 기억,[10] 의식(다른 주제들 중)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에도 사용되었습니다.[citation needed]
참고문헌
- ^ a b c Willimek, Bernd; Willimek, Daniela (2011). Music and Emotions: Research on the Theory of Musical Equilibration (PDF). Translated by Russell, Laura.
- ^ Zeuner, Florian (12 November 2010). "Musiktheoretiker Bernd Willimek und seine Strebetendenz-Theorie". Stimme.de (in German). Retrieved 2 December 2020.
- ^ a b "Der Wille hinter den Emotionen in der Musik – Die Strebetendenz-Theorie beantwortet eine alte Frage". Tabula Rasa Magazine (in German). 12 July 2020. Retrieved 2 December 2020.
- ^ Willimek, Bernd; Willimek, Daniela (15 April 2013). "Warum klingt Moll traurig? – Die Strebetendenz-Theorie erklärt das Gefühl in der Musik". Musik Heute (in German). Retrieved 2 December 2020.
- ^ a b Willimek, Daniela (December 2010). "Mit gespitzten Ohren". Neue Musikzeitung (in German). Retrieved 2 December 2020.
- ^ Meeson, Catherine (20 March 2014). "REVIEW OF LAURA RUSSELLS TRANSLATION (2013) OF "RESEARCH ON THE THEORY OF MUSICAL EQUILIBRATION (die Strebetendenz- Theorie)'". Cyclic Defrost. Retrieved 2 December 2020.
- ^ Willimek, Bernd; Willimek, Daniela (9 July 2019). Musik und Emotionen. Studien zur Strebetendenz-Theorie [Music and Emotions: Research on the Theory of Musical Equilibration] (in German). Baden-Baden: Deutscher Wissenschafts-Verlag. ISBN 978-3868881455.
- ^ Zhang, Fan (15 May 2019). Music Emotion Recognition based on Feature Combination, Deep Learning and Chord Detection (PDF) (PhD). Brunel University London. Retrieved 2 December 2020.
- ^ Honeycutt, James; Harwood, Jake (15 January 2019). "Chapter 5: Using Music Therapy and Imagined Interaction to Cope with Stress" (PDF). In Honeycutt, James (ed.). Coping with trauma: Promoting mental health through imagery and imagined interactions. Peter Lang. pp. 73–92. ISBN 978-1433154096.
- ^ Sayar, Anita (2018). "Comparison of the Effect of Major- Versus Minor-Keyed Music on Long-Term Declarative Memory in High School Students". Indiana University Journal of Undergraduate Research. 4: 97–106. Retrieved 2 December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