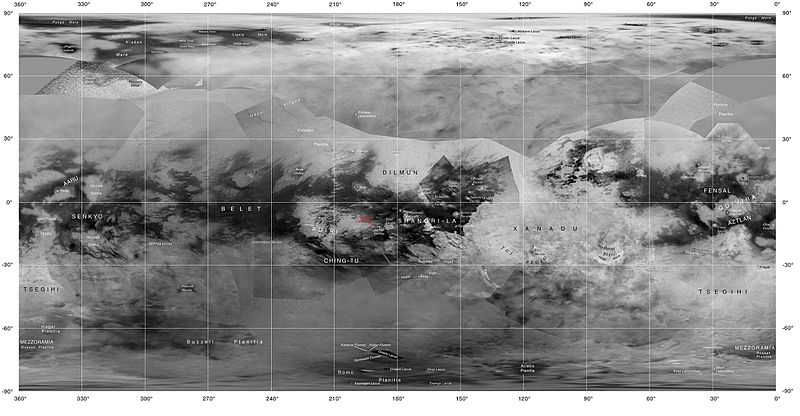앤드루 아라토
Andrew Arato안드라스 아라토 | |
|---|---|
| 태어난 | 아라토 안드라스 1944년 8월 22일 |
| 수상 | 요하네스버그 위트워터스랜드 대학교 명예교수,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의 저명한 풀브라이트 교수 |
| 학력 | |
| 모교 | 퀸즈 칼리지 시카고 대학교 |
| 박사학위 자문위원 | 레너드 크리거, 윌리엄 H. 맥닐 |
| 영향 | 게오르크 루카스, 위르겐 하버마스, 아그네스 헬러 |
| 학술사업 | |
| 주된 관심사 | 정치사상, 시민사회, 정치이론, 법률 및 헌법이론의[1] 역사 |
| 주목할 만한 작품 | 시민사회와 정치이론 |
앤드루 아라토(헝가리어: 아라토 안드라스[ˈɒr augustto born bornndraː sociology]; 1944년 8월 22일 출생)는 신학교 사회학과 정치사회이론 교수로, 영향력 있는 저서 '시민사회와 정치이론'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장 L과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코헨. 비판 이론, 구성 등에 관한 연구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낸시 프레이저, 나디아 우르비나티와 함께 《별자리》지의 공동편집자였다.[2]
교육
아라토는 1966년 역사학 학사 과정을 마치면서 뉴욕 퀸즈 칼리지에 처음 입학했다. 그 후, 아라토는 1968년 시카고 대학으로, 1975년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혁명 주제의 탐색: 레너드 크리거와 윌리엄 H. 맥닐의 지도 아래 '젊은 루카스 1910-1923'의 철학과 사회론. 아라토는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1970년 봄 부다페스트 학파 학자인 아그네스 헬러(Agnes Heler), 마쿠스 교르지(Gyöguri Markus), 미할리 바즈다(Mihaly Vajda)의 지도 아래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에서 예비 연구를 실시했다.[3]
아라토 사상의 4단계
뚜렷한 연대기는 아라토의 지적 전기를 정의하는데, 이것은 종종 유사하며, 동유럽의[4] 옛 공산주의 국가들과 특히 아라토 탄생의 나라 헝가리의 반대파 지식인들의 생각의 진화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5] 동시에, 그의 많은 작품들이 오랜 지적 파트너인 장 엘과 함께 만들어 졌다. 코헨,[6] 그리고 위르겐 하버마스의 철학적이고 사회학적 작업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7]
아라토의 지적 여행 일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첩 단계로 단순화할 수 있다. 헤겔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프랙시스'로 그려 마르크시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나) 노력에서 시작된다.2단계에서 (II) 아라토는 서구 마르크스 사상가들의 말뭉치를 통해 국가 사회주의 사회의 비판적 이론을 구축했다. 3단계는 (III) 동서양의 민주화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기 위한 도덕적, 분석적 범주로 시민사회를 마르크스주의 이후 강조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IV) 아라토는 최근 제헌법에 대한 비교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후주권' 제헌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제1단계 : Praxis 이론(1971~1979)
아라토의 학문적 연구의 제1단계는 초기 인문주의적 헤겔 마르크스주의의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한 헤겔 마르크스주의는 '프락시', 즉 상호 작용하는 집단의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질서의 능동적 체질을 부각시켰다. 여기서 아라토의 철학적인 연구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마르크스주의의 르네상스"에서 동양, 특히 "부다페스트 학교"의 비판적 지식인들의 사상과 유사했다.[8] 이러한 관점은 급진 이론 텔로스의 미국 학술지에 실린 철학적 전망에서도 나타났다. 아라토는 1971년부터 1984년까지 텔로스의 편집 위원회에서 일했다.[3]
아라토가 강조하는 사회적 프락시(praxis)와 주관성, 문화, 소외성의 일치된 범주에 대한 그의 논문은 20세기 초의 마르크스 철학인 료르지 루카스(Györguri Lucacs)에 관한 논문에서 나타났다.[9] 아라토가 1979년 저서 『젊은 루카크와 서양 마르크스주의의 기원』에서 언급했듯이, 의도적인 집단행동이나 프락시즘을 중시하여 비판적인 서구 마르크스주의를 정교하게 기술한 것도 동유럽의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의도된 바 있다.[10] 아라토의 프락시 이론과 서구 마르크스주의는 일반적으로 집단적 자기결정권에 집단과 개인의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특권하고, 그들은 노동계급의 진정한 이익을 알고, 그들을 위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정통 공산당을 비난했다. "신체주의"의 형태 노동자 계급의 강제적인 수동성으로 공산국가를 지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진정한 사회주의"는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정치 영역에서 경제로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회 제도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이러한 암묵적 비평은 대체로 추상적 사회철학의 수준에서 운용되었다. 헝가리 비평가인 Gyorgy Bence와 Janos Kis가 지적했듯이, 동양의 마르크스 철학의 이러한 부활은 동유럽의 사회주의 독재 정권에 내재된 "기본 계급 반목의 문제를 뒷받침했다".[11]
두 번째 단계: 국가사회주의(1979~1981)
그의 지적 여정의 2단계에서 아라토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동유럽 사회 형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정확하게 전환했다.[12]
그의 수술 절차는 다소 학구적이었다. 아라토는 허버트 마르쿠제, 코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 루돌프 바로, 하버마스, 이반 젤레니 등의 저자들이 쓴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신마르크시스트 분석의 최고점을 차례로 검토했다. 그는 국가사회주의 사회의 사회적 역학, 계층화, 위기 잠재력, 합법적 이념을 분석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적절하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이 모든 것에서 아라토는 사회 형성의 착취적이고 위계적인 차원을 분석하고 비판함으로써 마르크스를 모델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마르크스 자신이 제공한 이론적 도구, 즉 역사적 유물론(역사적 유물론)이 종종 국가사회주의 사회가 그들의 정치적 기반 계급 불평등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13]
또한, 아라토는 마르크스의 작가들이 마르크스의 역사철학의 문제점에 의해 전형적으로 갇혀 있다고 주장했는데, 마르크스의 역사철학은 자본주의 사회와 진보적 사회주의 사회 중 두 가지 가능한 현대 산업화된 사회 형태를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대신 아라토는 다수의 동유럽 이론가들과 함께 국가사회주의 사회를 새롭고 계층적이고 착취적인 사회형성 "수이생성"으로 분석하려 했다; 그는 공산주의 사회를 통제, 착취, 위기의 특정한 메커니즘을 가진 독특한 사회형성으로 이해했다.[14] 아라토는 이런 유형의 사회는 시장이나 경제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고, 대신 관료적 국가를 통해 운영되는 일종의 특권적 정치적 통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라토의 에세이는 1993년 책 《신마르크시즘에서 민주이론: 소련형 사회의 비판 이론에 관한 에세이》에서 수집되었다. 그의 노력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아라토는 사회 시스템 분석에서의 그의 연습과 국가 사회주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활발한 사회 운동 사이에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구조적 분석 방식이 동유럽의 증가하는 사회운동과 특히 1980년에 등장한 폴란드의 솔리다르노치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차단했다고 언급했다.[15] 1980년대 후반, 아라토는 동유럽의 증가하는 사회운동과 반대에 대해 새롭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포착하는 듯한 이론을 위해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론을 전개하는 그의 프로젝트로 "해체"하는 한편, 서구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불충분함을 비판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도 제공했다.즉 시민사회론이다.
아라토가 (마르크스의 quip을 반복하기 위해) 쥐를 갉아먹는 비판에 자신의 작품을 맡긴 이 전환은 동유럽 비판 지식인들 사이의 비슷한 변화들과 병행했다.[16] 그러나 동시에, 이번 순서는 그의 원래 프로젝트에 본질적인 한계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라토는 사회시스템 역학의 추상적(이상적으로 전형적) 모델들이 종종 계승된 사회 제도와 함께 국가사와 문화적 전통에 대한 고려를 통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17]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에 반대하는 운동에 대한 상징적 자원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경쟁적인 국가 문화 전통이다(그리고 대조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통치를 정당화한다.[18]
더욱이, 시스템 재생산에 대한 그러한 분석(국가 및 시장의 역학 및 기구의 논리학)은 일반적으로 연대와 개방적 공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자율적 사회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생활 세계와 시민 사회의 규범적이고 제도화된 범주를 무시하며, 이는 사회적 영역이기도 하다. 동작[19]
세 번째 단계: 시민사회(1981–1989)
아라토가 3단계에서 전환한 것은 정확히 국가, 즉 시민사회와 분리된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자치의 범주에 해당된다. 이러한 지적 방향의 변화는 1980-81년 폴란드의 흥미진진한 발전에 대한 Solidarnośchi의 반대 운동이 고조되면서 분명히 촉발되었고, 그 결과 아라토는 그의 열성적인 1981년 에세이 "시민사회 대 국가: 폴란드: 1980-1981"에서 시민사회의 범주를 일찍부터 표현하게 되었다.[20]
시민사회에서 아라토(그리고 폴란드, 헝가리, 프랑스, 남아메리카에[21] 있는 작가들)는 단체와 개인이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거의 자유로운 관계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의 통제 밖에 있는 사회적 공간을 의미했다. 이 사회적 공간은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상적으로 모든 법, 권리 및 제도를 수반한다.
시민사회가 완전히 발전한 현대적 형태에서, 그러한 영역은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되고, 경제와 국가의 분리된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생활과 미디어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고 아라토는 썼다. 어느 곳에서도 이 모든 요구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고 시민사회의 이상은 따라서 자신의 이상을 풍부하게 하고 확장하려는 사회운동의 기초를 제공했다.
아라토에게 있어서 시민사회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초점은 부분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이후의 마르크스주의자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의 거부를 구성했다. 그와 동유럽의 지식인들은 마르크스가 민족과 사회의 급진적인 민주통일을 주장하는 것을 집단적 자유로운 사회질서로 비판하였다. 그들은 마르크스의 국가와 사회(또는 국가와 시장)의 구별을 끝내려는 사상과 더불어 완전히 분열되지 않은,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집단 문제에 대한 관념도 거부했다. 동유럽과 러시아의 경험은 정부와 사회의 이러한 유토피아적 융합이 필연적으로 권위주의적 형태의 통치를 초래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것은 당-국가의 포용적 통제 하에 시민사회의 독립적 자유를 상실하거나 공동체나 국가가 경제를 그들의 전통적인 규범과 정치적 계산에 복종함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이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대신 규범적 이유와 전략적인 이유(국가나 구소련의 침공을 막기 위한 것) 때문에 동유럽(그리고 전 세계)의 반대운동은 정부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시민사회의 자유의 형태, 즉 연대의 형태, 자유로운 의사 소통만을 강화하려고 했다.ve 상호작용, 그리고 자율적인 대중과 다수의 협회에 대한 적극적인 민주적 참여. 아라토는 동유럽을 주장했지만 곧 이 모델을 서구까지 확장한 목표는 시민사회와 민주화의 강화와 국가 및 자본주의 경제의 전략적 기구의 로직과 권력 위계로부터 분리된 제도 구축이 되어야 한다. 아라토는 장 코헨과 공동으로 "시민사회의 재건과 민주화의 사상이 서구를 포함한 모든 현대사회의 비판적 이론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22]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이후까지 시민사회의 문제점은 유럽, 중남미,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어 자유에 있어 사회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과 이상이었다. 아라토는 "좋든 나쁘든 간에 진 코헨과 내가 미국에서 시민사회의 논의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여기서도 역시 아라토는 하베르마스의 작품, 특히 하베르마스의 공적인 영역의 흥망성쇠에 관한 책에 무겁게 그림을 그렸다. 아라토는 하버마스의 글이 "초기 현대 시민사회의 개념의 재발견, 비평, 재건에 독특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23]고 언급했다. 그러나 덧붙여 하버마스의 후기 사회이론은 현대 사회의 "차별화된" 구조의 이상적인 모델과 생활 세계에 적합한 문화적 전통과 의사소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개별적 제도에 대한 방어 필요를 명확히 하였다.[24] 나아가 하버마스의 이론은 시민사회가 사회 문화생활계의 제도적 구조였으며 경제와 국가에 구현된 전략적이고 기구의 합리성에 반대되는 사회의 삼자 모델을 제시했다. 이상적인 사회조직인 국가, 경제, 시민사회의 3부분 모델로 아라토는 시민사회와 그것의 강화가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도구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와 시민사회에 대한 그의 초기 1981년과 1982년 사이에, 그와 장 코헨이 그들의 magnum opus: Civil Society and Political Irony를 발표하기까지 10년이 흘렀다. 출판이 늦었고 794페이지로 위협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빠르게 인기를 끌었다. 2010년 10월, 구글 스콜라지는 이 책을 인용하여 2,600개가 넘는 출판물을 열거했다. 이 기간 동안 아라토는 급진적인 저널 텔로스(Telos)와 계속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양에 대한 시민사회 범주의 관련성과 활력은 텔로스에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이 잡지의 탐욕적인 편집자인 폴 픽코네에 의해 더욱 그러했다. 피코니는 '인공적 부정성'이라는 루브릭 아래 자신의 관점을 정교하게 설명했는데, 이 이론은 국가가 원자화되고 나르시시시즘적인 소비자의 인구 조작과 통제 외에 현 미국 시민사회의 어떤 자율적 문화역학도 보지 못한 이론이다.[25] 이어진 토론에서 아라토와 코헨은 1987년 저널과의 오랜 인연을 끊었다.[26]
4단계: 헌법 제정(1989–현재)
1989년은 구소련의 지배로부터 동유럽 국가들이 해방되고, 구소련의 변혁과 1989-90년에 동유럽의 정부 및 헌법의 변혁을 협상하면서 세계 역사상 획기적인 해였다.
전환의 독특한 성격과 새로운 헌법을 쓰는 강력한 지적, 정치적 이슈는 곧 아라토의 지적 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그는 헝가리의 헌법 입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면밀히 따랐는데, 그는 1991년까지 헝가리의 자유당인 자유민주연합의 공동 창립자 겸 초대 의장인 야노스 키스와 같은 비판적인 지식인들과 함께 계속 지냈다. 1996-97년 아라토는 헝가리 의회의 헌법 문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2003년 미국의 네팔 침공 이후 네팔, 터키, 남아프리카, 이라크의 헌법 문제에 대한 논평과 분석을 발표했다. 이라크에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그의 분석은 그의 2009년 저서로 귀결되었다. 점령하의 헌법 제정: 이라크의 강요된 혁명의 정치.
아라토는 "주권 이후" 헌법 제정 이론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그는 동유럽은 물론 남아공, 스페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독재정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헌법으로의 협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야기된 핵심 정치혁신을 고려했다. 그는 이러한 특정한 형태의 헌법을 만드는 것이 전통적인 모델에 비해 정치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 두드러진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89년은 혁명적인 민주 유럽 모델을 넘어 역사적으로 새롭고 우월한 헌법 창조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급진적 변혁의 정치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27]고 선언했다.
아라토에 따르면 주권 후 모델은 일반적으로 독재에서 헌법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2단계 과정을 수반했다. (I) 첫째는 권력자들과의 초기 원탁 협상이었고 모든 중요한 사회적 목소리였다. 이 협상은 선출된 의회가 새 헌법을 작성한 후속 단계인 (II)의 기본 규칙을 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원탁회의 기본원칙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 의미 있는 개요를 제시했다. 이상적으로 아라토는 그 과정은 넓은 사회적 포함, 평등, 투명성, 공공성으로 특징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8]
'포스트 주권'에 의해 아라토는 헌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 스스로가 궁극적인 주권적 권위로서 발행되고 있다는 신화를 버렸다는 뜻으로, 즉석에서 직접 말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신화는 종종 권위주의적인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지도자나 정당이 민중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실제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제한이나 권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민중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고 아라토는 말했다. 그러한 과정은 과거의 결함을 고치는 것 외에도 민주주의는 항상 그들의 건국에서 비민주적이고, 사생적이며, 자의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인 순간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한 자크 데리다와 조르지오 아감벤과 같은 사상가들이 요약한 정치적 정당성의 난제를 해결할 것이다.
출판 도서
- '필수 프랑크푸르트 학교 독서자' E로 편집됨 게브하르트 1978년
- 젊은 루카스와 서양 마르크스주의의 기원. P. Breines와 공동 저술. 1979.
- 시민사회와 정치이론. 1992년 J. Cohen과 공동 집필.[29][30][31]
- 신마르크시즘에서 민주이론: 에세이까지. 1993.
- 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하버마스: 비판적 교류. 1998년 M. 로젠펠드와 함께 편집되었다.
- 시민 사회, 헌법과 정당성. 1999.
- 점령하의 헌법 제정: 이라크의 강제 혁명의 정치. 2009
- 포스트 주권 헌법 제정: 학습과 정당성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시민권력의 모험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참조
- ^ "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Faculty Profile: Andrew Arato". Retrieved 16 May 2016.
- ^ "Nadia Urbinati". Columbia University. Retrieved 13 January 2020.
- ^ a b "Andrew Arato Curriculum Vitae" (PDF). Retrieved 16 May 2016.
- ^ Tom Bottomore가 편집한 마르크스 사상의 사전(Blackwell, 1998년)의 "동유럽의 마르크스주의" 아라토에서 헝가리인의 사고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진화를 보라.
- ^ 아라토의 부다페스트 학교와의 긴밀한 연대는 1987년 책 <이스턴 레프트, 웨스턴 레프트>에서 아그네스 헬러와 페렌크 페헤르에 의해 인정받고 있다. 아라토는 부다페스트 지식계의 사고 진화에 "밀접 접촉과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관여했다, 페이지 39.
- ^ 아라토, 신-마르크시즘에서 민주 이론으로: 소비에트 타입 사회의 비판 이론에 관한 에세이 (M. E. 샤프, 1993), p. XIII.
- ^ 아라토, 신-마르크시즘에서 민주 이론으로: 소비에트 타입 사회의 비판 이론에 관한 에세이 (M. E. Sharpe, 1993), 페이지 X.
- ^ 389년, 389년, 그리고 마크 라코프스키, 동유럽 마르크시즘(런던: 런던: 앨리슨과 버스비, 1978), 130.
- ^ 마르크스 역사론에 관한 국제사회학술지 특별호(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1974년 봄)에 대한 그의 소개도 볼 수 있다.
- ^ 앤드류 아라토와 폴 브레인스, 젊은 루카스와 서양 마르크스주의의 기원 (Seabury Press, 1979년), ix-xiii. 이러한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 대한 명확한 조사는 현대 좌파의 기원 리처드 곰빈(Penguin, 1971)을 참조한다.
- ^ 라코프스키, 동유럽 마르크시즘을 향하여, 132. 라코프스키는 빈스와 키스의 필명이다. 미할리 바즈다는 동양의 마르크스주의의 르네상스가 사회주의 체제 개혁에 대한 "희망"이며 집권당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진 개혁가들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쓰고 있다. 1970년대에 비판적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도구로서 그리고 정치 프로그램으로서 마르크스주의와 거리를 두면서 그러한 희망을 잃었다. Vajda, The State and Socialism (Allison & Busby, 1981년) 2를 참조하라.
- ^ 아라토는 1968년 이후 헝가리의 비판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회 구조와 역동성에 대한 분석으로 유사한 전환점을 찾아낸다. 357년 그의 "동유럽에서의 마르크시즘"을 보라.
- ^ 아라토, 신-마르크시즘에서 민주 이론으로: 소비에트 타입 사회의 비판 이론에 관한 에세이 (M. E. Sharpe, 1993) 도입부
- ^ 아라토, "관료 중심주의의 이해", 텔로스 35 (1978년 봄) 참조
- ^ 아라토, "동유럽의 마르크시즘", 357년
- ^ 아라토 "동유럽의 마르크시즘"
- ^ 아라토, "관료 중심주의의 이해" 76 대 77 그리고 Vajda, State and Socialism 6.13–17.
- ^ 물론 아라토는 이것을 인식하고 특정한 국가 문화 전통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에 종사했다. 예를 들어, 그의 "부다페스트 학교와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 이론과 사회 V.16 (1987년)을 보라.
- ^ Jean Cohen, Class and Civil Society: 마르크스 비판 이론의 한계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2년) 201-03, 209-, 223.
- ^ 텔로스 47 (1981년 봄) 이때 장 코헨은 1982년 계급사회와 시민사회로 25-36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시민사회의 이상을 옹호하고 있었으며, 텔로스 40 (1979년 여름)에서 그녀의 "왜 더 많은 정치적 이론"을 보고 있었다.
- ^ 로버트 배로스 "좌파와 민주주의: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논쟁," 텔로스 68 (1986년 여름), 필립 슈미터와 기예르모 오도넬의 권위주의 통치로부터의 전환: 잠정 결론(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 아라토, 신-마르크시즘에서 민주이론까지, xi.
- ^ 즈위셴베트라흐퉁엔의 "정치와 시민사회의 재건"은 프로제스 데어 아우프클라룽(Cambridge, 1989년) 491년.
- ^ 쥬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동 이론, 제2권 (비콘 프레스, 1989년)
- ^ 보라, 예를 들어 폴 피코네. Telos 53 (1982년 가을)
- ^ Andrew Arato, Jean Cohen, Joel Whitebook 및 Jose Casanova로부터의 편지, 1987년 6월 1일자로 텔로스 뉴스레터, 1987년 10월 19일에 발행되었다. 패트리샤 니켈(ed.),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 이후 북아메리카 비판론(2012) 인용
- ^ 아라토(2009)는 http://publicsphere.ssrc.org/arato-from-revolutionaries-to-external-vanguards/에 글을 올렸다.
- ^ 아라토, "아직 상환할 수 있는 것을 되찾기: 포스트 소버린 헌법 제정," 국제 정치, 문화, 사회 저널 22:4 (2009).
- ^ 마크 위버 "시민사회와 정치이론" 장 L. 코헨, 앤드류 아라토 "," 정치학 저널 55호, 제2호 (1993년 5월) : 542-544.
- ^ Brad Pedersen, 리뷰 : Jean L. Cohen과 Andrew Arato, Civil Society and Political Ironics (MIT Press, 1992), Statement Eleveneval 38, 이슈 1, 페이지 181 - 187, 1994
- ^ 보만, J. (1993) 시민사회와 정치이론 Jean L. 코헨과 앤드류 아라토. 케임브리지: 1992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미국 정치학 리뷰, 87(1), 198-199.
외부 링크
- 뉴 스쿨 대학교 개인 웹 페이지
- "폴란드 야당 민주론"(1984년)
- "시민사회, 민주주의의 전환과 통합"(1996)
- "이라크 점령과 독재로부터의 어려운 전환"(2003)
- "시스타니 대 부시: 이라크 헌법 정치" (2004)
- "후국헌법과 이라크 병리학"(2006)
- "1989년 헌법 창조의 새로운 모델" (2009)
- 동영상 강의 : 유튜브 (2010년 5월)에서 이란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5부)
- "이집트의 변신: 혁명, 쿠데타, 정권교체, 또는 위의 모든 것?"(2011년 2월)
- "이집트의 혁명?" (2011년 3월)
- 강연 : "사후 주권적 권력에 대한 이론과 실천"[permanent dead link] (2012년 3월)
- 비디오 강의: "1989년의 철학자로서의 레포트"
- "세 가지 정의: 시민사회, 혁명, 헌법" Reset.Doc(2013년 1월)
- 정치신학과 포퓰리즘 사회연구(2013년)
- "우크라이나에서 국정을 만드는 국제 역할" (2015년 7월)
- "터키의 하드 민주주의: 앤드루 아라토와의 인터뷰 (2015년 11월)
- "연방의 약속과 논리와 안정성의 문제" (201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