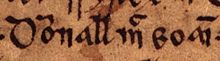동물원 동물학
Zoopoetics이 기사는 위키백과 편집자의 개인적인 감정을 진술하거나 주제에 대한 원론적인 주장을 제시하는 개인적인 성찰, 개인적인 에세이 또는 논쟁적인 에세이처럼 쓰여진다.으로 하여 하십시오. (2013년 9월) (이 |
동물원시학은 "다른 종의 양귀비에 대한 주의력을 통해 형태로 혁신적인 돌파구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것은 많은 실제 생물학적 동물들이 동물과 다른 동물들과의 사회적 결속을 형성하기 위해 제스처, 발성, 즉 분명한 물질적 징후를 조작할 수 있는 기관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1]
동물원시학은 시에서 작은 사건이 아니며, 인간의 영역에 국한된 일도 아니다. 다른 종들은 때때로 인간에 대한 주의력을 통해 그들의 신체의 양귀비의 혁신적인 형태를 발견한다. 많은 학문들이 문화와 사회에서 동물을 급진적으로 재평가하는 데 기여했다; 동물원 시학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신체의 양귀비의 "동일한 옛 법칙"을 따른다는 휘트먼의 통찰의 의미를 추적함으로써 기여한다.[2][3]
사용법
자크 데리다 씨는 '카프카의 광대한 동물원시학'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나는 동물'(1997년 처음 전달된 주소)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4] 그래서, 가장 넓은 의미에서, 동물원시학은 텍스트 안에 인간이 아닌 동물의 존재를 암시한다. 2008년 논문에서 크리스토퍼 화이트는 동물원세미오틱스(비인간 동물의 기호체계)라는 용어와 혼동함으로써 동물원시학의 또 다른 면을 확립하고 있으며, 그는 윌리엄 포크너의 'As I Lay Dieing'에서 동물의 존재와 기호 체계를 탐구하는 데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한다.[5]
동물원의 또 다른 면은 "동물학: 커밍스, 머윈, 그리고 에코크라시즘의 확장된 분야를 보라." 여기서, 동물원시학은 생태권과 텍스트 내에서 "비인간 동물의 기관에 중력을 가하는" 접근에 가깝다. 동물 에이전시의 개념은 인간이 아닌 동물이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하고 수사적이며 문화적인 존재에 의해 정의된다.[6] 이 에세이는 1992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어둠 속의 후트: 일반 수사학의 진화." 그 속에서 케네디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모든 동물이 '깊은' 보편적인 수사법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7] 이 미사여구는 수화체계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소위 그 수화체계를 전달하는 몸짓의 "희극적 에너지"에 기초한다. 동물(인간 포함)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청중에게 제스처를 전달함으로써 수사적인 상황을 끊임없이 탐색한다. 케네디의 기사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관한 오랜 가설들 중 하나에 도전했는데, 그는 언어를 인간의 예외성을 나타내는 구별되는 표시보다는 많은 동물들이 공유하는 진화적 기원을 감안할 때 더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케네디의 아르티에 대한 반응의 역사를 다시 요약하기 위해)클레어는 그 안에 있는 사상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데브라 호희의 "최고의 미사여구"를 참조한다.[8]
아론 모의 저서 동물원시학: 동물과 시의 제작은 휘트먼, 커밍스, 머윈, 힐만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시인들의 시에서 동물 시적 역동성을 탐구한다.
많은 문학 용어와 마찬가지로 그 용어의 어원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동물원시학은 어원학적으로 말해서 동물(zoo)이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 또는 '시'를 만들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동물시학은 동물 수사학이 특정 시뿐만 아니라 특정 시와 특정 시 모두의 제작과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여진다.[9]
동물원시학의 한 가지 전제는 지구상에 (하이데거의 의미에) 살고 있는 존재는 인간만이 아니라는 개념이다. 인간이 아닌 동물들도 마찬가지야. 어떤 인간의 시는 동물의 거주지를 암시하지만, 분명한 이유로 그러한 노력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자크 데리다는 그의 용어 한계성을 통해 이 도전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다.
- 그러므로 한계생리는 나의 대상이다. 한계치 주변, 한계치 주변, 한계치 유지에 의해 무엇이 싹트고 자라나느냐를 걱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계치를 먹이고, 생성시키고, 키우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걱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확실히 한계를 없앨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곱할 때, 복잡하게 만들고, 두껍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접게 하고, 선을 정확하게 나누면서, 증가시키고, 증식하게 하는 데서 성립될 것이다.…. [한계는] 심연을 가지고 있다. 이 심연 한계, 이 가장자리, 이 복수형, 반복적으로 접혀진 변경의 개수, 형태, 감각 또는 구조, 모순 일관성을 결정하는 문제라면 토론은 일단 착수할 가치가 있다.[10]
인간과 동물 사이의 한계는 텍스트 안에서 그 자체의 무한한 지형이 되지만 데리다는 한 가지 결정적인 측면을 간과한 것 같다. 동물들도 그들의 몸짓과 그 몸짓 안에 내재된 발성을 통해 인간의 심연 속으로 모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단 인간만이 아니다. 스테파니 로우는 이 썰물과 흐름의 만남이 어떤 모습일지 텍스트로 보여준다. 로우는 자신의 글에서 포의 이야기 속의 오랑우탕이 인간의 심연 속으로 어떻게 도달하는지 탐구하며 인간의 공간을 공유된 공간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는 몸치장을 통해 문화를 규정하는 종인 오랑우탕이 인간의 면도의식을 밟을 때 발생한다. 그의 몸짓은 물론 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오해를 받는다.[11]
그렇다면 동물원시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에너지의 쇠퇴와 흐름이다. 인간은 동물의 심연 속으로 도달하지만, 동물들도 도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마도 동물원시학은 인간의 언어에 비인간적인 동물의 몸짓과 발성이 스며들도록 하는 시학에서 가장 잘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공유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6]
동물문자
문학 연구 내에서는 비인간의 동물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다문화주의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12]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은 동물들이 수사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청중들을 위해, 그들 자신의 텍스트를 조작하는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동물 행동에[13]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글들을 조작하는 동물들의 비디오 다큐멘터리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플래닛 어스는 크릴을 그들의 구멍에서 나오는 거품으로 둘러싸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는 몇몇 혹등고래들을 포착한다. 영상이 펼쳐지면서 시청자들은 혹등고래가 조종하는 문자를 듣고 목격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들이 한 세대의 혹등고래에서 다른 세대로 사회적으로 전해져 학습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혹등고래 한 마리, 즉 혹등고래 집단이 일괄적으로 거품을 도구로 사용하는 혁신적인 돌파구를 마련했음을 더욱 추론할 수 있다. 이 혁신은 다른 혹등고래들에게 전달되어야 했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혹등고래는 의사소통을 위한 노래와 몸짓의 텍스트에 의존하여 수사적인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오르카는 또한 문자를 만든다. 윤리학자들은 그러한 텍스트가 집단의 결속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14] 따라서 동물 텍스트가 어떻게 비인간적인 동물 문화를 지속하는지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푸젯 사운드의 오르카 발성(및 과거 녹음 파일 보관 파일) 라이브 피드는 이 친수성을 들어 보십시오.
다양한 동물들이 비슷한 글의 교재를 보여주지만,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닌 동물들이 수사적인 상황에 어떻게 진입하는가에 대한 함의와 씨름해야 한다.
참고 항목
참조
- ^ Moe, Aaron (2014). Zoopoetics: Animals and the Making of Poetry. Lanham: Lexington Books. pp. 10, 19–22. ISBN 978-0-7391-8662-6.
- ^ Whitman, Walt (1982). Poetry and Prose. New York: The Library of America. p. 199.
- ^ Moe, Aaron (2013). "Toward Zoopoetics: Rethinking Whitman's 'original energy'". Walt Whitman Quarterly Review. 31 (1): 1–17. doi:10.13008/0737-0679.2091.
- ^ Derrida, Jacques (2007). Marie-Louise Mallet (ed.).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 Translated by David Wills. New York: Fordham UP. p. 6.
- ^ White, Christopher (2008). "Dissertation". Animals, Technology, and the Zoopoetics of American Modernism: 115.
- ^ a b Moe, Aaron (2012). "Zoopoetics: Cummings, Merwin, & the Expanding Field of Ecocriticism". Humanimalia: A Journal of Human/Animal Interface Studies. 3 (2).
- ^ Kennedy, George (1992). "A Hoot in the Dark: The Evolution of General Rhetoric". Philosophy and Rhetoric. 25 (1): 6.
- ^ Hawhee, Debra (2011). "Toward a Bestial Rhetoric". Philosophy and Rhetoric. 44 (1): 81–87. doi:10.1353/par.2011.0007.
- ^ 모, 애런(2012년 3월 21일) "동물학 재방문" (블로그 게시물)
- ^ Derrida, Jacques (2008). Marie-Louise Mallet (ed.).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 Translated by David Wills. New York: Fordham UP. pp. 29–30.
- ^ Rowe, Stephanie. Sarah E. McFarland; Ryan Hediger (eds.). No Human Hand? The Ourang-Outang in Poe's '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in Animals and Agency: An Interdisciplinary Exploration. Boston: Brill. pp. 107–128.
- ^ Feder, Helena (2010). "Rethinking Multiculturalism: Theory and Nonhuman Cultures".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Literature and Environment. 17 (4): 775–777.
- ^ Laland, Kevin N. and Bennet G. Galef (2009). The Question of Animal Culture. Cambridge: Harvard UP.
- ^ Sargeant, Brooke L. and Janet Mann (2009). "From Social Learning to Culture: Intrapopulation Variation in Bottlenose Dolphins". In Kevin N. Laland; Bennet G. Galef (eds.). The Question of Animal Culture. Cambridge: Harvard UP. p.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