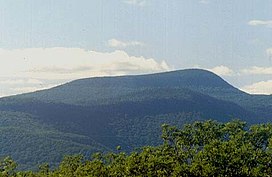프리즌 노트북
Prison Notebooks
감옥 노트북(이탈리아어: Quaderni del carcere [kwaˈdɛrni del ˈkartʃére]는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쓴 수필 시리즈였다. 그람시는 1926년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수감되었다. 이 수첩은 그람시가 병세를 이유로 감옥에서 의료원으로 풀려난 1929년과 1935년 사이에 쓰여졌다.[1] 그의 친구 피에로 Sraffa는 필기 도구와 공책을 제공했었다. 그람시는 1937년 4월에 죽었다.
그는 수감 기간 동안 30권이 넘는 공책과 3000쪽이 넘는 역사와 분석을 썼다. 비록 체계적이지 않게 쓰여졌지만, 감옥수첩은 20세기 정치이론에 대한 매우 독창적인 공헌으로 여겨진다.[2] 그람시는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니콜로 마키아벨리, 빌프레도 파레토, 조르주 소렐, 베네데토 크로체와 같은 사상가들도 다양한 출처에서 통찰력을 끌어냈다. 그의 노트는 이탈리아 역사와 민족주의, 프랑스 혁명, 파시즘, 테일러리즘과 포드주의, 시민사회, 민속, 종교, 높고 대중적인 문화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수첩들은 1930년대에 감옥에서 밀반출되었다. 초판은 1947년에 출판되었고 몇 달 후에 비아레지오 상을 받았다.[3][4][5] 그람시의 사후 비아레기오상 수상은 1947년 4월 28일 이탈리아 제헌국회의 기념비가 뒤따랐다.[6] 최초의 영어 번역은 1970년대에 스코틀랜드의 시인 겸 민속학자 해미쉬 헨더슨에 의해 출판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 비판 이론, 교육 이론에서 그람시의 이름과 관련된 몇 가지 사상은 다음과 같다.
- 자본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화적 헤게모니.
- 서민 지식인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대중적 노동자 교육의 필요성.
- 직접적·강제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사회(경찰·군·법률체계 등)와 이념적·동의적 방법으로 리더십을 구성하는 시민사회(가족·교육체계·노조 등)의 구분이다.
- "절대 역사주의"
-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숙명론적 해석에 반대하는 경제결정론에 대한 비판.
- 철학적 물질주의에 대한 비평.
헤게모니
헤게모니는 과거 블라디미르 일리히 레닌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민주혁명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리더십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개념이었으나 그람시에 의해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예언한 '불가역적' 사회주의 혁명이 왜 20세기 초까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설명하기 위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발전했다. 자본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착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람시는 자본주의가 폭력과 정치 경제적 강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부르주아 계급의 가치가 만인의 '상식' 가치가 되는 패권 문화를 통해서도 이념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제안했다. 이리하여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이 부르주아 계급의 선으로 자신의 선을 확인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보다는 현상유지에 도움을 주는 공감대 문화가 발달하였다.
노동계급은 부르주아적 가치가 사회를 위해 '자연적' 또는 '정상적' 가치를 나타낸다는 개념을 전복시키고 억압받고 지적 계층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의에 끌어들이는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레닌은 문화가 정치적 목적에 '부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람시에게는 문화적 헤게모니가 먼저 달성되는 것이 권력 획득의 기본이었다. 그람시의 견해로는 현대적 조건에서 지배하기를 원하는 어떤 계급도 자신의 좁은 '경제-기업'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지적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양한 세력과의 동맹과 타협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람시는 이 사회 세력 조합을 조르주 소렐의 말을 빌려 '역사적 블록'이라고 부른다. 이 블록은 제도, 사회관계, 사상의 접점을 통해 지배계급의 패권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특정 사회질서에 대한 동의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그람시는 기지의 관계를 유지하고 파쇄하는 데 있어 상부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을 전개했다.
그람시는 서구에서는 부르주아적 문화적 가치가 종교에 얽매여 있었으며, 따라서 패권적 문화에 대한 그의 강렬함의 상당 부분은 종교적 규범과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이 남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힘과 학자들의 종교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종교 사이에 과도한 격차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교회가 취한 보살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람시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에서 발견된 종교에 대한 순전히 지적인 비판과 대중에게 호소했던 종교개혁의 요소들과 결혼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과제라고 믿었다. 그람시에게 마르크스주의는 사람들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종교를 대체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경험의 표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람시에게는 패권적 지배가 궁극적으로 강요에 의존했고, '권위 위기'에서는 '동의의 마스크'가 빠져나가 무력의 주먹이 드러났다.
지식인과 교육
그람시는 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많은 생각을 했다. 유명하게도 그는 모든 사람은 지식인이며, 모두가 지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지식인의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현대 지식인들이 단순히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 언론 등 이념적 기구를 통해 사회를 건설하고 헤게모니를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을 준 감독이나 주최자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스스로를 사회와 떨어져 있는 계급으로 보는 '전통적인' 지식인과(잘못된) 모든 계급이 만들어내는 사고 집단을 '조직적인' 계급으로 구분했다. 그러한 '유기적인' 지식인들은 단순히 과학적 규칙에 따라 사회생활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스스로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과 경험을 문화의 언어를 통해 분명히 표현한다. 노동자 계급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람시가 단순히 프롤레타리아 밖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대중들의 지적 활동의 현상을 혁신하고 비판적으로 만들 수 있는 노동자 계급 지식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종의 교육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그의 생각은 브라질의 파울로 프리레에 의해 후세에 이론화되고 실행된 비판적 교육학 및 대중교육의 개념과 일치하며, 프란츠 파논의 사상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과 대중교육의 당파들은 그람시를 오늘날까지 중요한 목소리로 여긴다.
국가 및 시민 사회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은 그가 무력에 동의를 더하여 통치한다고 주장하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그의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국가가 정부의 좁은 의미로는 이해될 수 없다. 대신 그람시는 그것을 정치 제도와 합법적인 헌법 통제의 장인 '정치사회'와 흔히 '사적' 또는 '비국가' 영역으로 보는 '시민사회'로 구분하여 국가와 경제를 모두 차별화한다.[7] 전자는 힘의 영역이고 후자는 동의의 영역이다. 그러나 그는 분열이 순수하게 개념적이고 현실에서는 두 가지가 종종 겹친다고 강조한다.
그람시는 헤게모니는 현대 자본주의 아래에 있으며 시민사회 내 노동조합과 대중정당의 특정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부르주아 계급이 경제적 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부르주아 계급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헤게모니의 형태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동적 혁명에 관여한다. 그람시는 프레데릭 테일러와 헨리 포드의 '과학적 경영'과 조립라인 방식뿐 아니라 개혁주의, 파시즘 등의 움직임이 그 예라고 본다.
마키아벨리로부터 끌어내려, 그는 '현대판 왕자' 즉 혁명당이 노동자 계급이 유기적인 지식인과 시민사회 내부의 대안적 헤게모니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주장한다. 그람시에게 있어 현대 시민사회의 복잡한 성격은 부르주아 패권을 훼손하고 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은 '입장 전쟁'(참호전과 유사)이라는 뜻이며,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의 전쟁은 '운동 전쟁'(또는 정면 공격)에 길을 내줄 것이다. 그람시는 '운동의 전쟁'이 러시아 혁명 당시 윈터 궁전의 폭풍우가 예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선이 흐릿해질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람시는 자코뱅과 파시스트들이 했던 것처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되는 국사를 거부한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과제가 '규제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국가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시민사회의 규제 능력의 완전한 발전으로 규정한다.
역사주의
그람시는 초기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역사주의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그람시의 견해에서, 모든 의미는 인간의 실제 활동(또는 "프랙시")과 그것이 일부인 "객관적인" 역사적, 사회적 과정 사이의 관계에서 유래한다. 아이디어는 기능과 기원을 떠나 사회적, 역사적 맥락 밖에서 이해될 수 없다. 우리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조직하는 개념은 주로 사물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들의 사용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도출된다. 그 결과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역사적으로 달라진 것에 대한 관념만이 있을 뿐이다. 나아가 철학과 과학은 인간과 무관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역사적 상황의 진정한 발전적 흐름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진실'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진실은 언제 어디서 알려지든 진리였고, 과학적 지식(마르크스주의를 포함)은 이러한 일상적 의미에서 진리의 진보로서 역사적으로 축적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는 과학이기 때문에 상부구조의 환상적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람시는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실용주의적인 의미에서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을 표현함으로써 그 시대의 '진실'을 어떤 이론보다 잘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과학적이고 반포시티비즘적인 입장은 베네데토 크로스의 영향력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람시의 '역사론'은 크로스의 사상과 역사적 '운명'에서 형이상학적 합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의 헤겔주의와 이상주의 테너와 결별한 '절대 역사론'이었다. 그람시는 그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설명은 상대주의의 한 형태로 비판되어 왔다.[citation needed]
'경제주의' 비판
그람시는 '다스 카피탈에 대항한 혁명'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사전 기고문에서 러시아의 10월 혁명은 자본주의 생산력의 완전한 발전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무효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가 결정론 철학이 아니라는 그의 견해를 반영했다. 그가 쥐고 있는 생산력의 인과적 "우선주의"의 원리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오해였다. 경제적 변화와 문화적 변화는 모두 '기초적 역사적 과정'의 표현으로, 어느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초창기에 노동자들의 운동 내에 널리 퍼져 '역사적 법칙' 때문에 필연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숙명론적 믿음은 그람시의 견해로는 억압된 계급의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 주로 방어적 행동에 제한되어 있었으며, 일단 노동계급이 할 수 있게 되면 방해물로 버려지게 되어 있었다. 주도권을 잡다 마르크스주의는 '프랙시스의 철학'이기 때문에 사회변화의 주체로서 보이지 않는 '역사법칙'에 의존할 수 없다. 역사는 인간의 프락시(praxis)에 의해 정의되므로 인간의 의지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력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노동자 계급의 의식이 행동에 필요한 발전 단계에 이르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역사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발전들 중 어느 것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필연성에 의해 미리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의 경제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탈리아 노동조합의 신디칼리스트들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는 많은 노동조합원들이 경제 전선 외에도 정치 전선에서 투쟁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정착시켰다고 믿었다. 그람시는 노동조합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헤지모닉 세력의 하나의 기관으로 상상했지만, 노조 지도자들은 단지 이러한 조직들을 기존 구조 내에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람시는 이러한 노동조합원들의 견해를 "불가르 경제주의"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그가 은밀한 개혁주의와 심지어 자유주의까지도 동일시했다.
물질주의 비판
인간의 역사와 집단적 프락시(praxis)가 어떤 철학적 질문의 의미 여부를 결정한다는 신념 때문에 그람시의 견해는 [citation needed]엥겔스와 레닌이 진일보한 형이상학적 물질주의와 '복사' 인식 이론과는 정반대로 흐른다. 그람시에게 있어서 마르크스주의는 인류와 독립된, 그 자체로 존재하는 현실을 다루지 않는다. 인간의 역사와 인간 프락시 이외의 객관적 우주의 개념은 그의 견해로는 신에 대한 믿음과 유사했다; 객관성은 있을 수 없고, 다만 미래 공산주의 사회에서 확립될 보편적 주체성일 뿐이다. 따라서 자연사는 인간의 역사와 관련하여만 의미가 있었다. 그의 견해로는 원시적인 상식처럼 철학적 물질주의는 비판적 사고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레닌의[8] 주장대로 종교 미신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람시는 거의 틀림없이 더 구질구질한 형태의 마르크시즘의 존재에 자신을 내맡겼다: 프롤레타리아의 종속계급으로서의 지위는 마르크시즘의 철학으로서 마르크시즘은 대중적인 미신과 상식의 형태로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은 계층의 이념에 효과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좀 더 정교하게 자신의 철학을 제시하고, 상대의 견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다.
원천
- ^ Rosengarten, Frank (June 27, 2019). "An Introduction to Gramsci's Life and Thought". International Gramsci Society. Retrieved June 17, 2021.
- ^ Sassoon, Anne Showstack (1991). "Prison Notebooks". In Bottomore, Tom; Harris, Laurence; Kiernan, V.G.; Miliband, Ralph (eds.). The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Second ed.). Blackwell Publishers Ltd. p. 446. ISBN 0-631-16481-2.
- ^ Nel mondo delle lettere: il premio Viareggio [In the world of letters: the Viareggio Prize] (in Italian). Istituto Luce Archives. August 22, 1947. Retrieved June 15, 2021.
- ^ Guadagnini, Rossella (June 15, 2017). "Il 26 agosto convegno sul politico nel 70° del premio postumo per le 'Lettere dal carcere'" [On August 26, conference on politics for the 70th anniversary of the posthumous prize for "Lettere dal carcere] (PDF) (in Italian). Rome. Retrieved June 15, 2021.
- ^ Bucciarelli, Stefano (2018). "1947, il Premio Viareggio alle Lettere dal carcere di Gramsci". Filosofia Italiana (in Italian). XIII (2): 245–265. Retrieved June 15, 2021.
- ^ Bertani, Glauco (October 21, 2020). "Gramsci, in cella l'umanità del politico" [Gramsci, in prison the humanity of the politician] (in Italian). Retrieved June 15, 2021.
- ^ 레만, 1월 시민사회의 "철폐"? 「시민사회」의 해석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오해에 관한 발언.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제13권 제2호 1999. 페이지5
- ^ 레닌: 물질주의와 엠피리오-비판.
번역
노트북의 다양한 영어 번역이 있었다.
- Joseph Buttigieg, Prison Notebooks (Volumes 1, 2, 3), 뉴욕: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ISBN 0-231115755-X
- 퀸틴 호어리와 제프리 노웰 스미스, 뉴욕 교도소 노트북의 선택: 1971년 국제 출판사 ISBN 071780397X
외부 링크
추가 읽기
- Boggs, Carl (1984). The Two Revolutions: Gramsci and the Dilemmas of Western Marxism. London: South End Press. ISBN 0-89608-226-1.
- Bottomore, Tom (1992). The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Blackwell Publishers. ISBN 0-631-18082-6.
- Gramsci, Antonio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International Publishers. ISBN 0-7178-0397-X.
- Jay, Martin (1986). Marxism and Totality: The Adventures of a Concept from Lukacs to Haberma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ISBN 0-520-05742-2.
- Joll, James (1977). Antonio Gramsci. New York: Viking Press. ISBN 0-670-12942-9.
- Kolakowski, Leszek (1981). Main Currents of Marxism, Vol. III: The Breakdow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0-19-285109-8.
| 위키미디어 커먼스는 쿼드니 델 카세레와 관련된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