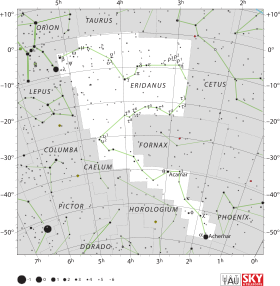정복권
Right of conquesthide이 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대화 페이지에서 토의하십시오. (이러한 템플릿 메시지를 제거하는 방법 및 시기 알아보기)
|
정복권은 무력을 통해 즉시 소유 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다. 뉘른베르크 원칙에 도입된 평화에 반하는 범죄의 개념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의 후폭풍으로 그 추진까지 점차 의미가 퇴화된 국제법의 원리로 인정받았다. 영토 정복에 대한 개입은 유엔 헌장에 의해 확인되고 확대되었다. 이 헌장은 2조 4항에 "모든 회원국은 영토의 완전성 또는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으로부터 국제관계를 삼가야 한다. 또는 그 밖의 어떤 방식으로든 푸와 불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유엔의 포스." 내전이 계속됐지만 1945년 이후 기성 국가들 간의 전쟁은 드물었다. 헌장이 발효된 이후 무력 사용에 의존해 온 국가들은 전형적으로 자위권이나 집단방어의 권리를 발동했다.[1]
역사와 주장
찬성론자들은 정복권은 현상을 인정하며, 그 권리를 부정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고 기꺼이 사용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 권리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왜냐하면 정의에 따르면, 그 권리는 대체되었을지도 모르는 합법적인 권리 통치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복 권리는 그 목적을 향해 정복자를 정당화한다.[not verified in body]
세계의 많은 부분에 대한 식민지 정복의 완료(아프리카를 위한 스크램블 참조),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의 참화, 미국과 소련이 모두 자기 결정의 원리에 동조하는 것은 형식적인 국제법상의 정복권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1928년 켈로그-브리앙 조약, 1945년 이후의 뉘른베르크와 도쿄 재판, 유엔 헌장, 그리고 탈식민지화에 대한 유엔의 역할은 이 원칙의 점진적인 해체를 보았다.[citation needed] 동시에, 유엔 헌장의 회원국들의 "영토적 청렴성" 보장.
정복과 군사 점령
1945년까지 정복원리에 따라 획득한 영토의 처분은 기존의 전쟁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다. 이는 군사 점령에 이어 평화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었고, 패배한 군주가 땅을 되찾을 수 있는 합당한 기회는 없었다. 공식적인 평화 조약은 "제목상의 어떤 결함도 보상한다"[2]고 하지만, 그것은 요구되지 않았다. 패한 당사자의 인정은 "정복에 의해 기득권을 빼앗긴 국가의 동의에 좌우되지 않았다"[3]는 요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대안은 불법으로 항의할 경우 평화협정이 전쟁 시기에 정복을 합법화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병합(부분 또는 전체)이었다. 본질적으로 정복 자체는 다른 국가의 법적 권리를 그들의 동의 없이 소멸시키는 법적 행위였다. 이 새로운 틀 아래, 전쟁 이외의 정복과 그에 따른 점령은 불법이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토 획득과 관련된 모든 전쟁이 평화 조약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에서의 전투는 휴전으로 중단되었고, 어떠한 평화 조약도 그것을 덮지 않았다. 북한은 2021년 현재도 기술적으로 남한,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4]
참고 항목
참조
- ^ Silke Marie Christiansen (2016). Climate Conflicts – A Cas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Humanitarian Law. Springer. p. 153. ISBN 9783319279459.
- ^ 코만 1996, 페이지 127.
- ^ Jump up to: a b 코만 1996, 페이지 128.
- ^ "The Korean War never technically ended. Here's why". History. June 24, 2020.
인용된 작품
- Korman, Sharon (1996). The Right of Conquest: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by Force in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0-19-828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