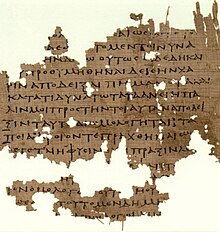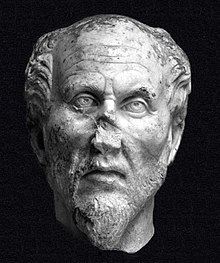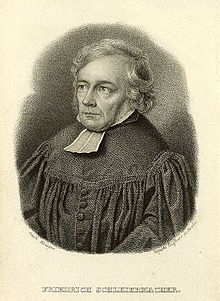플라톤의 불문율
Plato's unwritten doctrines| 다음에 대한 시리즈 일부 |
| 플라톤주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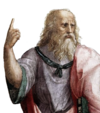 |
| 우화와 은유 |
| 관련기사 |
| 관련 카테고리 |
플라톤의 소위 불문율 교리는 그의 제자들과 다른 고대 철학자들이 그에게 귀속시킨 형이상학적 이론이지만 그의 저술에서 명확하게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최근 연구에서 그것들은 플라톤의 '원칙론'(독일어:Prinzipienlehre)으로 알려지기도 하는데, 이는 시스템의 나머지가 파생되는 두 가지 기본 원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카데미의 다른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리를 구두로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후 후대에 전파되었다.
이러한 교리를 플라톤에 귀속시키는 근원의 신빙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들은 플라톤이 그의 가르침의 어떤 부분이 공개적인 출판물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교리는 일반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로 설명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보급은 오해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아마도 아카데미에서 더 발전된 학생들에게 불문율을 가르치는 데 그 자신을 한정했을 것이다. 불문율의 내용에 대한 살아남은 증거는 이 구술적 가르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20세기 중반 철학의 역사가들은 불문학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고전학자들과 역사가들 사이에서 잘 알려지게 된 이 조사를 주도한 연구자 집단은 '튀빙겐 학교'(독일어로: 튀빙거 플라톤슐레(Tübinger Platonschule))의 주요 구성원 중 일부는 독일 남부의 튀빙겐 대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수많은 학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거나 아예 비난하기까지 했다. 많은 비평가들은 튀빙겐 재건에 사용된 증거와 출처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불문율 교리의 존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최소한 그들의 체계적 성격을 의심하고 그것을 단지 잠정적인 제안이라고 여겼다. 튀빙겐 학파의 옹호자와 비평가들 사이의 격렬하고 때로는 극렬한 논쟁이 양쪽에서 크게 전개되었다. 지지자들은 그것이 플라톤 연구에서 '패러다임 변화'에 해당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용어
The expression 'unwritten doctrines' (in Greek: ἄγραφα δόγματα, ágrapha dógmata) refers to doctrines of Plato taught inside his school and was first used by his student Aristotle. 물리학 논문에서 그는 플라톤이 하나의 대화에서 ' 소위 불문율 교리'와는 다른 개념을 사용했다고 썼다.[1] 플라톤에 기인하는 불문율의 진위를 옹호하는 현대 학자들은 이 고대의 표현을 강조한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소칭'이라는 표현을 어떤 아이러니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중립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학구적 문학에서는 '성리학적 교리'라는 용어도 가끔 사용한다. 이것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소성적'의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비밀의 교리를 나타내지 않는다. 학자들에게 있어서 '소성적'은 불문율이 플라톤의 학교 안에서 철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만을 나타낸다(그리스어로 '소성적'은 문자 그대로 '벽 안'을 의미한다). 아마도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플라톤의 출판된 교리, 특히 그의 '특출한 교리'라고 불리는 그의 '형식론'을 이미 연구했을 것이다('특출한 교리'는 '벽밖의' 또는 어쩌면 '공중소비를 위한'을 의미한다).[2]
불문학의 교리를 재구성할 가능성을 현대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짧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소테리시스트'라고 불리고 그들의 회의적인 반대자들은 따라서 '반제스테리시스트'이다.[3]
튀빙겐 학파는 같은 대학에 기반을 둔 신학자들의 초기 '튀빙겐 학파'와 구별하기 위해 때때로 플라톤 학파라고 불린다. 일부에서는 '튀빙겐 패러다임'을 언급하기도 한다. 플라톤의 불문율도 밀라노에서 가르친 이탈리아의 학자 조반니 레알에 의해 강력하게 옹호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플라톤 해석의 '투빙겐과 밀라노의 학교'를 언급하기도 한다. 레알은 플라톤에 귀속된 원리 중 가장 높은 것이 '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문율 교리를 위해 '프로토콜', 즉 '원'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4]
증거 및 출처
불문율의 경우는 두 가지 단계를 수반한다.[5] 첫 번째 단계는 플라톤이 구두로 가르친 특별한 철학적 교리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 상황적 증거의 제시에 있다. 이것은, 모두 살아남은 플라톤의 대화에는 그의 가르침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문자에 의한 보급에 적합한 교리만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불문율 교리의 추측된 내용에 대한 출처의 범위를 평가하고 일관성 있는 철학적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한다.
불문율의 존립에 대한 주장
플라톤의 불문율의 존재에 대한 주요 증거와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물리학의 구절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명시적으로 '일명 불문교리'를 언급하고 있는 물리학의 구절들.[6]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해 동안 플라톤의 제자였으며, 아카데미에서의 교수 활동에 숙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정보 제공자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아리스토세노스가 플라톤의 공개강연 '선(善)에 대하여'[7]에 대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게 그 강의에는 수학적, 천문학적인 삽화가 들어 있으며 플라톤의 주제는 그의 가장 높은 원리인 '원(one)'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강의 제목과 함께 불문율의 핵심에 있는 두 원리를 다루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보고에 따르면 철학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청중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강연을 만났다.

- 플라톤의 대화(독일어: 슈리프트크리틱).[8]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많은 대화들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쓰여진 단어에 대해 회의적이며 구술전송에 대한 선호도를 표현한다. 플라톤의 파에드루스는 이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다. 거기서 철학을 전달하기 위한 필기 교육보다 구술의 우위는 결정적인 이점이 될 수 있는 구술 담론의 훨씬 더 큰 융통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문의 저자는 지식의 수준과 독자의 요구에 적응할 수 없다. 더구나 독자들의 질문과 비판에는 대답할 수 없다. 이것들은 살아있고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대화에서만 가능하다. 글로 쓰여진 텍스트는 단지 연설의 이미지일 뿐이다. 글쓰기와 독서는 우리의 정신의 약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구술교육에만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글씨는 이미 알고 있지만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으로만 유용하다. 따라서 문학 활동은 단순한 놀이로 묘사된다. 학생들과의 개인적인 토론은 필수적이며, 다양한 개별화된 방식으로 단어들이 영혼에 새겨지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즉 파에드루스가 계속되는 사람만이 진정한 철학자로 여겨질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다듬어온 문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작가들(Gk, timiotera)은 작가나 작가일 뿐 아직 철학자는 아니다. 여기서 그리스인의 '더 소중한'에 대한 의미는 논의되지만 불문율의 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9]
- 진위 여부를 다투는 플라톤의 7차 서신에서의 글쓰기에 대한 비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빙겐 학파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10] 거기서 플라톤은 자신의 가르침이 말로만 전달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최소한 그 부분은 그가 '심각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다른 가르침처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철학을 표현할 수 있는 텍스트는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영혼 속의 진정한 이해, 그 편지는 계속되며, 오직 강렬하고 공통된 노력과 인생의 공유된 길에서 생겨난다. 깊은 통찰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불꽃이 날아올라 불을 붙이는 방식이다. 생각을 글로 고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경멸하거나 피상적인 학습에 거만해지는 독자들의 마음속에 환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피해를 준다.[11]
- 대화 상자의 '예비 문서'. 대화에는 특히 중요한 주제가 도입되었지만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수많은 구절이 있다. 사안의 핵심에 접근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들은 종종 철학의 근본적인 의의에 있는 질문들에 관한 것이다. 튀빙겐 학파의 변호인들은 이러한 '리저브'의 사례들을 서면 대화에서 직접 다룰 수 없는 불문율의 내용에 대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12]
- 고대에 공개 토론과 공개 토론에 적합한 '외향적인' 문제와 학교 내 교육에만 적합한 '외향적인'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이러한 구별을 채용했다.[13]
- 구전용으로 유보되어 있던 플라톤의 교리의 내용이 대화에서 표현된 철학을 크게 넘어섰다는 고대에 널리 퍼진 견해는 더욱 그러했다.[14]
- 불문율의 교리는 플라톤이 주장했던 통일성으로의 다중성을 줄이고 일반성으로의 특수성을 감소시키는 논리적 결과라고 생각된다. 플라톤의 '형식론'은 외모의 다양성을 상대적으로 작은 형태의 다양성으로 축소시켜 그들의 토대가 된다. 플라톤의 양식 서열 내에서, 종의 많은 하급 형태는 각 속들의 더 높고 일반적인 형태로부터 파생되고 의존한다. 이는 폼의 도입이 외형상의 최대 다양성에서 가능한 최대의 통일로 가는 한 발짝에 불과했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 따라서 플라톤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다중의 통일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그의 최고 원칙의 미발표 이론에서 일어나게 된다.[15]
재건을 위한 고대의 원천들

제7편지가 진품이라면 플라톤은 가설이 씌어 있지 않은 교리의 내용을 글로 공개하는 것을 날카롭게 못마땅해 했다. 그러나 '초동'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가르침의 '소성적인' 성격은 그들을 비밀에 부치도록 하는 요구조건이나 그에 대한 글쓰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나중에 쓰여지지 않은 교리에 대한 글을 출판하거나 그들의 작품에 그것들을 재사용했다.[16] 다른 고대 저자들로부터 끌어낸 증거인 이 '간접적 전통'은 플라톤이 구두로만 소통했던 교리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플라톤의 불문율 교리를 재구성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책 α, μ, N)과 물리학(책 Δ)
- 아리스토텔레스의 잃어버린 조각들은 '선'과 '철학'을 다룬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테오프라스토스의 형이상학
- 플라톤의 제자 시러큐스의[17] 헤르모도루스(Hermodorus)의 잃어버린 논문 플라톤에 관한 두 토막
- 플라톤의 제자 슈푸시푸스의[18] 잃어버린 작품에서 나온 단편
- Pyrrhonist 철학자 Sextus Empiricus의 물리학 반대 논문. Sextus는 이러한 교리를 피타고라스로 묘사하지만,[19] 현대 학자들은 플라톤이 그들의 작가였다는 증거를 모았다.[20]
- 플라톤의 공화국과 파르메니데스. 간접적인 전통에서 플라톤에 기인하는 원칙들은 이 두 대화에서 많은 진술과 사상의 기차가 다른 시각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에 따라 해석되어, 그들은 불문율 교리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의 윤곽을 날카롭게 하는 데 기여한다. 다른 대화에서의 토론, 예를 들어 티메우스와 필레부스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고 튀빙겐 재건에 통합될 수 있다. 불문율의 교리에 대한 암시는 플라톤의 초기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1]
불문율의 내용.

튀빙겐 학파의 옹호자들은 플라톤의 불문율의 원리를 재구성하기 위해 출처에 흩어져 있는 증거와 증언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에서 플라톤의 철학의 핵심을 보고, 비록 많은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들의 기초에 대해 상당히 정립된 그림에 도달했다.[22] 튀빙겐 패러다임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불문율 교리가 서면 교리와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이에 밀접하고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투빙겐의 해석이 플라톤의 진정한 가르침에 해당하는 한, 그의 원리가 형이상학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형식론은 사회 이전의 철학 학교인 엘리엇의 많은 견해에 반대한다. 플라톤의 불문율의 기초에 있는 원칙들은 오직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만이 존재한다는 엘레아틱스의 신념과 실제로 깨진다. 플라톤의 원칙은 이 존재를 새로운 개념의 절대 초월성으로 대체하는데, 그것은 어떻게든 존재보다 더 높은 것이다. 그들은 평범한 존재의 범위를 넘어 절대적으로 완벽한 '치과적 존재'의 영역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치과적 존재'는 보통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존재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초월적 존재에서 평범한 존재로 내려가는 것은 원래의 절대적인 완벽함의 제약을 수반하기 때문에, 모든 친숙한 종류의 존재는 어떤 면에서 불완전하다.[23]
두 가지 기본 원칙과 상호 작용

플라톤의 형태론은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는 세계는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형태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형태의 영역은 객관적이고 형이상학적 현실이며, 이는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하는 보통의 물체에서 보다 낮은 종류의 '존재'와는 무관한 것이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감각의 대상이 아닌 형태는 진짜 존재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들은 현실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양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감지하는 개별 사물에 대한 모델로서, 형태는 평범한 사물이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들에게 어떤 이차적인 종류의 존재를 빌려준다.[24]
플라톤의 출판된 대화에서 형식 이론이 외관 세계의 존재와 특징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듯이, 불문율의 두 원리는 형식 영역의 존재와 특징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형식론과 불문율의 원리는 모든 존재의 통일된 이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로 들어맞는다. 우리가 감지하는 물체뿐만 아니라 형태의 존재는 두 가지 기본 원칙에서 파생된다.[25]
플라톤의 불문율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는 두 가지 근본적인 'ur-원칙'은 다음과 같다.
- 원 : 사물을 분명하고 결정적으로 만드는 통일의 원리.
- 무기한 다이아드: '지적'과 '무제한'의 원리(Gk, 아호리스토스 디아스)
플라톤은 이 무기한 다이아드를 '위대한 것과 작은 것'(Gk, 메가 카이에게 미크론에게)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26] 이것은 점점 더 많은 것, 과잉과 결핍, 모호함과 불분명한 것, 그리고 다중의 원리 또는 원천이다. 그것은 공간적 또는 양적 무한대의 의미에서의 무제한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 그 불침투는 결정성의 결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고정된 형태. 다이드는 그것을 확실한 2 네스, 즉 숫자 2와 구별하고, 다이드가 수학 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무정'이라고 불린다.[27]
원과 무제한의 다이아드는 플라톤의 형태와 현실의 총체성이 그들의 상호작용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모든 것의 궁극적인 토대가 된다. 감각 현상의 모든 다양성은 결국 두 가지 요인에만 의존한다. 생산적인 요소인 원으로부터의 이슈를 형성하라; 형태가 없는 무한 다이어드는 원(One)의 활동을 위한 기질 역할을 한다. 그런 기질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었다. 모든 존재는 무한정 다이드에 대한 한 사람의 행동에 달려있다. 이 작용은 형태 없는 것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형태와 특수성을 부여하며, 따라서 개별적인 실체를 존재하게 하는 개인화의 원칙이기도 하다. 두 원칙의 혼합은 모든 존재의 기초가 된다.[28]
어떤 사물에 있어서 어떤 원리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질서나 무질서가 지배한다. 무언가 혼란스러울수록 무한대의 존재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29]
튜빙겐 해석에 따르면, 대립되는 두 원리는 플라톤 체제의 온톨로지뿐만 아니라 그 논리, 윤리, 인식론, 정치철학, 우주론, 심리학까지 결정한다고 한다.[30] 온톨로지에서는 두 원칙의 반대가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반대에 해당한다. 무제한의 다이아드는 어떤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수록 존재는 줄어들고 존재론적 등급은 낮아진다. 논리적으로 보면, 1은 정체성과 평등을 제공하고, 무기한 다이드는 차이와 불평등을 공급한다. 윤리학에서 하나는 선(또는 미덕, 아레트)을 의미하고, 무한다이아드는 악함을 의미한다. 정치에서 원은 그것을 통일된 정치 주체로 만들고 그것을 살아남게 하는 대중에게 주는 반면, 무한 다이드는 파벌, 혼란, 그리고 해체로 이어진다. 우주론에서 하나는 휴식, 지속성, 그리고 세계의 불멸성에 의해 증명되며, 또한 우주에서의 생명의 존재와 플라톤이 그의 티메우스에서 언급하는 데미우르게 플라톤의 미리 정해진 활동에도 의해 증명된다. 무기한 다이애드는 우주론에 있어서 움직임과 변화, 특히 불변과 죽음의 원리에 있다. 인식론에서, 원은 플라톤의 변하지 않는 형식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는 철학적 지식을 의미하고, 무한다이아드는 감각적 감상에 의존하는 단순한 의견을 의미한다. 심리학이나 영혼의 이론에서 원은 이성에 해당하고, 무한다이아드는 본능과 육체적 영향의 영역에 해당한다.[31]
일원주의와 이원론
두 가지 기본 원리를 내세우는 것은 불문율의 교리와, 따라서 그들이 진실한 경우에는 플라톤의 철학 전체가 일원론적인 것인지 이원론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32] 원과 무한다이아드의 대립이 단일한, 보다 근본적인 원리에 기초하는 경우 철학적 체계는 일리주의적이다. 이것은 다중성의 원리가 어떻게든 통일의 원리로 축소되어 그 원리에 종속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불문율적 교리에 대한 대안적이고 일원론적인 해석은 두 원칙의 토대가 되는 더 높은 '메타-원'을 내세우고 이를 하나로 묶는다. 그러나 무한 다이드가 어떤 종류의 단결과는 구별되는 독립적 원리로 이해된다면 플라톤의 불문율적 교리는 결국 이원론에 있다.
고대의 출처에 있는 증거는 두 원칙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일관되게 그 한 사람을 무한정 다이드보다[33] 높은 지위에 동의하고 그 한 사람만을 절대적으로 초월적이라고 여긴다. 이는 두 원리에 대한 일원론적 해석을 내포하고 있으며, 단일론적 철학을 제시하는 대화에서의 주장과 들어맞는다. 플라톤의 메노는 자연의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고,[34] 공화국은 만물의 기원(아카이브)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35]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튀빙겐 해석 옹호론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36]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라톤이 정말로 무기한 다이애드를 명령된 세계의 필수불가결하고 근본적인 요소로 간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더 높고 중요한 통합의 원칙으로 내세웠다고 결론짓고 분쟁 해결을 선호한다. 이것은 플라톤을 단일주의자로 만들 것이다. 이 포지션은 옌스 하프웨센, 데틀레프 티엘, 비토리오 sle슬이 오랫동안 방어해 왔다.[37] 하프웨센은 그 결과 기본 원칙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기 때문에 무기한 다이드를 하나에서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종류의 잠재된 다수를 포함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무기한 다이드는 그러므로 원과 같은 기원과 권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에게 의존한다. 따라서 하프와센의 해석에 따르면 플라톤의 철학은 종말론적 일변도에 있다. 존 니메이어 핀들레이도 마찬가지로 두 원리에 대한 독단적인 이해를 강조한다.[38] 코넬리아 데 보겔은 또한 시스템의 일원론적 측면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한다.[39] 튀빙겐 학파의 두 대표 인물인 한스 요아힘 크레이머와[40] 콘라드 가이저는[41] 플라톤이 단수주의와 이원론적 측면을 모두 가진 단일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Christina Schefer는 원칙들 사이의 반대는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들 둘 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다고 제안한다. 그녀에 따르면, 그 반대는 플라톤이 경험했던 어떤 근본적이고 '불가결한' 직감에서 비롯된다. 즉, 신 아폴로가 원과 무한다이아드의 공통점이라는 것이다.[42] 따라서 이 이론은 또한 일원론적인 개념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연구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비록 이 두 원칙이 최종적인 일원론적 체제의 요소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또한 이원론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원론적 해석의 옹호자들에 의해 이의를 제기되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원론적 측면이 일원론적인 총성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원론적 성질은 원(元)뿐 아니라 무한다이아드도 근본원리로 취급되기 때문에 남아 있다. 지오바니 레알은 근본적 기원으로서 디아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원론의 개념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현실 양극 구조'를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이 두 '점'은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는 '다이아드보다 위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다.[43] 하인츠 합프,[44] 마리 도미니크 리처드,[45] 폴 윌퍼트는[46] 단결이라는 우월한 원리에서 다이아드가 파생되는 모든 것에 반대하며, 결과적으로 플라톤의 체계가 이원론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플라톤의 원래 이원론적 체계가 후에 일종의 일원론으로서 재해석되었다고 믿는다.
만약 두 원리가 사실적으로 플라톤의 원리와 단수론적 해석이 맞다면, 플라톤의 형이상학은 로마 제국 시대의 네오 플라토닉 계통을 강하게 닮았다. 이 경우 플라톤의 네오 플라토닉 독서는 적어도 이 중심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정당화된다. 이는 네오플라톤주의가 플라톤의 불문율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나타나는 것보다 혁신에 가깝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튀빙겐 학파의 옹호자들은 그들의 해석의 이러한 장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네오플라톤주의의 창시자인 플로티누스를 플라톤 자신이 시작한 사고의 전통을 발전시킨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적어도 넓은 윤곽으로 볼 때 플로티누스의 형이상학은 플라톤의 1세대 학생들에게 이미 익숙했다. 이것은 플라톤의 교리에 대한 충실한 해석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창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플로티누스 자신의 견해를 확인시켜 준다.[47]
불문율의 선인
중요한 연구 문제는 형이상학계 내에서 '형식론'과 '재건축의 두 원칙'의 결합에서 도출된 '선형'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많은 질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플라톤이 그의 형태론에서 선에게 주는 지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들은 플라톤의 공화국이 선과 보통의 형태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선에게 독특하게 높은 순위를 부여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다른 모든 양식들이 선의 형태에 힘입어서 존재론적으로 그것에 종속되어 있다는 그의 신념과 일치한다.[48]
학문적 논쟁의 출발점은 그리스어 개념의 논쟁적 의미인 ousia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리스어로 문자 그대로 '존재'를 의미한다. 철학적인 맥락에서 그것은 보통 'Being' 또는 'Essence'로 번역된다. 플라톤의 공화국은 굿은 '오우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오우시아를 넘어서'라고 말하며, 그것을 기원과[49] 권력으로 능가한다.[50] 만약 이 구절이 선의 본질이나 본질이 존재(그러나 선 그 자체는 그렇지 않다)를 넘어선다는 것만을 내포하고 있거나, 구절이 단지 느슨하게 해석되어진다면, 선의 형태는 형식, 즉 실제 존재와 함께 사물의 영역 안에서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선은 절대적으로 초월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를 초월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위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선은 실제 존재의 서열에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51] 이 해석에 따르면 굿은 불문율의 두 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형식론에만 해당된다. 반면 공화국의 구절이 문자 그대로 읽히고 '오우시아'가 '존재'를 의미한다면 '존재 너머'라는 구절은 실제로 선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52] 이 해석에 따르면 플라톤은 선을 절대적으로 초월하고 두 원리의 영역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이 선을 초월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과 원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불문율 교리의 진정성에 대한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선과 원은 플라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정체성은 절대 초월성의 본질에서 따온 것인데, 그것은 어떤 종류의 결정도 나타내지 않고 따라서 선과 선 사이의 구별도 두 개의 분리된 원리로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러한 정체성의 옹호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증거를 끌어낸다.[53] 그러나 반대의 견해는 라파엘 페르버에 의해 잡히는데, 라파엘 페르버는 불문율의 교리가 진실한 것이며, 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선과 선은 동일하다는 것을 부정한다.[54]
숫자의 형태
플라톤의 강연 '선(善)[55]에 대하여'에 대한 아리스톡세누스의 보고에서 숫자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플라톤의 주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주제는 불문율 교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수학이 아니라 숫자의 철학을 포함했다. 플라톤은 수학에서 사용되는 숫자와 숫자의 형이상학적 형태를 구분했다. 수학에서 사용되는 숫자와는 대조적으로, 숫자의 형태는 단위의 그룹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추가되거나 산술의 일반적인 연산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Twoness의 형태는 숫자 2에 의해 지정된 두 개의 단위가 아니라 Twoness의 진짜 본질로 구성되어 있다.[56]
불문율 교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플라톤은 숫자 형식에 두 가지 기본 원칙과 다른 일반 형식 사이의 중간 위치를 부여했다. 실제로, 이 숫자 형태는 One과 Unlimit Dyad에서 나온 최초의 실체다. 이러한 출현(모든 형이상학적 생산과 마찬가지로)은 시간적 과정의 결과로 이해되지 않고 존재론적 의존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One(결정적 요인)과 Dyad(다중성의 원천)의 상호작용은 Forms of Numbers의 영역에서 Twoness의 형태로 이어진다. 두 원리의 산물로서, 두 가지 원리의 형태는 두 가지 원리의 성격을 반영한다: 그것은 두 가지 원리의 결정이다. 그것의 고정적이고 결정적인 성질은 이중성의 형태(결정적 초과)와 반감 형태(결정적 결핍) 사이의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나타난다. Twoness의 형태는 수학에서 사용되는 숫자와 같은 단위의 집단이 아니라 두 개의 크기 사이의 연관성이며, 그 중 하나는 다른 하나의 두 배다.[57]
The One은 '위대한 자와 작은 자'라고 불리는 무기한 다이아드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생식력과 소량의 관계 또는 과잉과 결핍 사이의 모든 가능한 관계를 포괄하는 그것의 불연속성을 제거한다. 그러므로 그 하나는 무한대의 불변함을 결정짓게 함으로써 규모간의 결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내고, 단지 이러한 관계들만이 불문율 교리의 옹호자들에 의해 숫자의 형태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복의 형태'나 '반복의 형태'로 볼 수 있는 '중복의 형태'를 결정짓는 '투우네스'의 기원이기도 하다. 다른 형태의 숫자는 두 가지 기본 원칙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다. 공간의 구조는 숫자의 형태에 내포되어 있다: 공간의 치수는 어떻게든 그들의 관계에서 나온다. 이러한 임시적인 공간의 출현에 대한 핵심 세부 사항은 살아남은 고대 증언에서 빠져 있으며, 그 본질은 학술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다.[58]
인식론적 문제
플라톤은 '대화론'의 전문가, 즉 그의 논리적인 방법을 따르는 철학자들만이 가장 높은 원리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토론에서 두 원칙의 이론(진짜 그의 이론이라면)을 과감하게 전개하고 논거에 근거를 두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그의 체제에 대한 최고 원칙이 필요하며, 그 효과로부터 간접적으로 유추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두되었다. 플라톤이 추가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원(one)의 영역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지 혹은 실제로 그런 것을 주장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초월적 존재의 주장이 또한 그 높은 존재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을 수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장 높은 원리가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59]
만약 인간의 이해가 변증법적 또는 언어적 논쟁에 국한되었다면, 플라톤의 변증법적 논의는 기껏해야 그의 형이상학에 의해 가장 높은 원리가 요구되었지만 또한 인간의 이해는 결코 그 초월적 존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그리고 그것이 하나와 같다면 굿)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비언어적이고 '직관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통해서이다.[60] 플라톤이 실제로 이 길을 택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따라서 우리의 지식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단계를 말로써 비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철학적 주장으로 정당화할 가능성을 포기했다.
적어도 원과 관련하여, 마이클 얼러는 공화국의 한 성명에서 플라톤이 그것을 들고 있는 것은 직관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61] 이와는 대조적으로 피터 스템머,[62] 커트 폰 프리츠,[63] 위르겐 빌러스 [64]등은 비언어적 직관을 위한 어떤 독립적인 역할에도 반대한다. Jens Halfwassen은 양식 영역에 대한 지식이 직접적인 직관에 집중되어 있다고 믿는다. 직관은 그가 어떤 비감각적이고 '내적인 지각'에 의한 즉각적인 이해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플라톤의 가장 높은 원리가 지식을 초월하여 그러한 직관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플라톤에게 있어, 하나님은 지식을 가능하게 하고 사물을 아는 힘을 주겠지만, 그 자체도 알 수 없고 불가해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65]
크리스티나 셰퍼는 플라톤이 쓴 것과 쓰지 않은 것 모두 초월적 존재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부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다른 길을 따라 그러한 접근을 발견했다:[66] 아폴로 신이나 신 아폴로 신에 대한 불가침하고 종교적인 경험에서. 플라톤의 세계관의 중심에는 형태론이나 불문율의 원칙이 아니라 비언어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언어적 교리의 바탕이 될 수 없었던 아폴로의 경험이 서 있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플라톤의 원리에 대한 튜빙겐의 해석은 그녀가 계속하고 있으며, 올바르게 그것을 플라톤 철학의 중요한 요소로 만들지만, 풀 수 없는 퍼즐과 역설(Gk, aporiai)으로 이어져 결국 막다른 골목이다.[67] 플라톤의 진술에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구, 즉 형태론을 넘어서는 길을 찾았다는 것을 유추해야 한다. 이 해석에서 불문율의 원리조차도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수단일 뿐이다.[68]
플라톤이 불문율의 원리를 확실히 참된 것으로 여겼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문의 의견이 크게 갈린다. 튀빙겐 학파는 인식론적 낙관론을 플라톤 탓으로 돌린다. 이것은 특히 한스 크래머에 의해 강조된다. 그의 견해는 플라톤 자신이 그의 불문율의 진실에 대한 지식을 위해 가능한 한 가장 높은 확실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두 가지 원칙인 '도그마티스트'에 관해서는 플라톤을 '도그마티스트'라고 부른다. 다른 학자들과 특히 라파엘 페르베르는 플라톤에게는 불문율 교리가 잘못될 수 있는 가설로만 진전되었다는 반대 견해를 지지한다.[69] 콘라드 가이저는 플라톤이 불문율 교리를 조리 있고 완전한 철학적 체계로서 공식화하였지만 '고정적인 도그마들의 섬마'는 교조적인 방식으로 설파하고 권위적인 것으로 발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신에, 그는 계속하여, 그것들은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를 위한 것이었다:[70] 지속적이고 더 발전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
플라톤에게는 인식론과 윤리학을 결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는 학생이 구두로 전달되는 통찰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인격이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영혼들에게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구두 교육에 종사하는 철학자는 항상 학생이 필요한 성격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지식은 단순히 지성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영혼 전체가 하는 오랜 노력의 결실로서 성취된다. 의사소통되는 것과 의사소통을 받는 영혼 사이에는 내적 친화력이 있어야 한다.[71]
데이트와 역사발전의 문제
플라톤이 공개 강연 '선(善)에 대하여'[72]를 했을 때 논란이 된다.투빙겐 해석의 옹호자들에게 이것은 불문율이 플라톤의 후기 철학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의 경력에 비교적 일찍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플라톤 연구에서 '유니타리안'과 '개발주의자' 사이의 오랜 논쟁에 달려 있다. 단대주의자들은 플라톤이 그의 경력 내내 항상 하나의 일관성 있는 형이상학적 체계를 옹호했다고 주장한다; 발달학자들은 플라톤의 생각에서 몇 개의 다른 단계를 구별하고, 중요한 방법으로 그의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해 대화를 쓰는 동안 마주친 문제들에 의해 그가 강요당했다고 주장한다.
구 문학에서는 플라톤의 강연이 플라톤의 생애 말기에 이루어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그의 불문율 교리의 기원은 그의 철학적 활동의 마지막 단계에 배정되었다. 보다 최근의 문헌에서, 점점 더 많은 수의 연구자들이 불문학의 교리를 이전 시기로 연대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단대주의자들의 추측과 상충된다. 플라톤의 초기 대화가 불문율을 암시하는지 아닌지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73]
플라톤의 공개강연이 플라톤의 경력에 있어서 늦게 일어났다는 오래된 견해는 한스 크레이머에 의해 정력적으로 부정되었다. 그는 이 강의가 플라톤이 교사로서 활동하던 초기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그는 그 강의가 단 한 번 공개석상에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일련의 강의가 있었고 첫 번째 입문 강의만이 실험으로서 광범위하고 준비되지 않은 청중들에게 개방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한다. 이 공개적인 데뷔가 실패한 후 플라톤은 자신의 교리를 철학 학생들과만 공유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선에 대한 강의와 이어지는 토론은 진행 중인 일련의 회담의 일부를 구성했는데, 플라톤은 수십 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불문율의 교리를 숙지하게 했다. 그는 이 첫 번째 시칠리아 여행(389/388)이 있을 무렵에 이미 이러한 세션을 개최하고 있었고, 따라서 아카데미를 설립하기 전이었다.[74]
강연 날짜를 후기로 하는 철학사학자들은 359/355 (칼-헤인즈 일팅), [75]360/358 (헤르만 슈미츠),[76] 352 (데틀프 티엘),[77] 디온의 죽음과 플라톤의 죽음 사이의 시간 (348/347: 콘라드 가이저) 사이에 몇 가지 가능한 시기를 제안했다. 가이저는 강의 연한이 늦은 것은 불문율 교리가 후발이었다는 것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교리가 아마도 개교 초기부터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일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78]
플라톤이 철학을 아직 배우지 않은 대중에게 불문율과 같은 까다로운 자료를 왜 제시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렇지 않다면 달리 알 수 없겠지만 말이다. 가이저는 불문율 교리에 대한 왜곡된 보도와 맞서고 그에 따라 아카데미가 전복적 활동의 벌집이라는 떠도는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중에게 강연을 열었다고 추측한다.[79]
리셉션
근대 초기의 영향
플라톤의 제자 1세대 중에는 플라톤의 구술 교육에 대한 살아 있는 기억이 있었는데, 그 중 많은 이들이 글을 써서 그 시대의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이 중 상당수는 오늘날까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 그 불문율 교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강하게 비판되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과 '철학에 대하여'(이 중 우리는 몇 조각만 가지고 있다)라는 두 편의 논문과 그의 형이상학과 물리학 같은 다른 작품에서 그것들을 검토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테오프라스토스도 그의 형이상학에서 그것들을 논했다.[80]
아카데미의 교리가 학문적 회의론(Academic Consumption)으로 옮겨간 다음 헬레니즘 시대(기원전 323년–기원전 31년)에는 플라톤의 불문율 교리 유산이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 있었다(전혀 알려진다면). 철학적 회의론은 미들 플라톤주의 시대로 희미해졌지만, 이 시대의 철학자들은 현대 학자들보다 불문율적인 교리에 대해 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81]
(중세에 소실되었던) 플라톤의 대화 원문의 르네상스 시대에 재발견된 후, 초기 현대는 네오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불문율의 기초에 대한 보고가 결합되어 영향을 받은 플라톤의 형이상학의 이미지가 지배하게 되었다. 휴머니스트 마르실리오 피치노(1433–1499)와 그의 네오 플라토닉 해석은 그의 번역과 논평으로 결정적으로 지배적인 견해에 기여했다. 후에, 영향력 있는 대중음악가, 작가, 플라톤 번역가 토마스 테일러(1758–1835)는 플라톤 해석의 이러한 네오 플라토닉 전통을 강화시켰다. 18세기는 점점 네오 플라토닉 패러다임을 문제점으로 보았지만 일관된 대안으로는 대체할 수 없었다.[82] 불문율의 교리는 이 시대에 여전히 받아들여졌다. 독일의 철학자 빌헬름 고틀리브 테네만은 1792-95년 플라톤의 철학 체계에서 플라톤이 자신의 철학이 전적으로 문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의도한 적이 없다고 제안했다.
19세기
19세기에는 불문율의 교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그것들이 대화에 새로운 것을 더하는 철학적 유산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학문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플라톤에 대한 네오 플라토닉 해석은 1804년 프리드리히 슐리에르마허가 플라톤의 대화[83] 1804년 번역에 대한 서론을 발표하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결과가 느껴지는 급진적인 전환을 시작했던 19세기 초까지 우세했다. 슐레이어마허는 플라톤의 철학의 전체 내용이 그의 대화에 담겨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을 뛰어넘는 어떠한 구두 가르침도 없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의 관념에 따르면 대화의 장르는 플라톤의 철학을 문학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의 문학적 형태와 플라톤의 철학의 내용은 분리할 수 없이 결속되어 있다: 플라톤의 본질에 의한 철학화 방식은 문학적 대화로만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적인 대화로 묶이지 않는 어떤 철학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특별한 내용이 있는 불문율 교리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84]
슐레이어마허의 개념은 빠르고 널리 받아들여져 표준적인 관점이 되었다.[85] 그것의 많은 옹호자들은 19세기 철학의 대표적인 역사가인 에두아르 겔러를 포함한다. 그의 영향력 있는 핸드북 "그리스인의 철학"과 그것의 역사 발전은 '비밀 교리를 제공함'에 대항하여 무장했고 플라톤의 작품을 접하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슐레이어마허는 어떤 구술 교육에도 대해 극명하게 부인하는 것이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지만 그의 비판자들은 여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1808년 후에 그리스의 유명한 학자가 된 아우구스트 보에크는 슐레이어마허의 플라톤 번역판에 불문율 교리에 반대하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플라톤이 난해한 가르침은 결코 명백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단지 암암리에 암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가 (대화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수행하지 않은 것은, 그는 구두 지시로 가장 높은 곳에 캡스톤을 얹었다.'[86] 크리스티안 아우구스트 브랜디스는 불문율의 고대 자료를 수집하고 논평했다.[87] 프리드리히 아돌프 트렌델렌버그와 크리스티안 헤르만 위세도 그들의 조사에서 불문율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88] 심지어 칼 프리드리히 헤르만조차도 플라톤의 문학적 동기에 대한 1849년 조사에서 슐레이어마허의 논문들에 반대하여 플라톤이 자신의 글에서 자신의 철학의 더 깊은 핵심을 암시했을 뿐 직접 구두로만 전달했다고 제안했다.[89]
튀빙겐 학교 이전: 해럴드 체니스
20세기 후반까지는 플라톤 연구에서 '안티소테릭' 접근법이 분명히 우세했다. 그러나, 세기의 중반 이전에 일부 연구자들은 플라톤이 구술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존 버넷, 줄리어스 스텐젤, 알프레드 에드워드 테일러, 레온 로빈, 폴 윌퍼트, 하인리히 곰퍼즈 등이 포함됐다. 1959년 이후, 튀빙겐 학파의 완전한 해석은 항정신병적 접근에 대한 격렬한 경쟁을 계속해 왔다.[90]
20세기에, 가장 다작의 반항성적 접근을 옹호하는 사람은 해롤드 체르니스였다. 그는 이미 1942년, 즉 튀빙겐 학파의 조사와 출판 이전에 자신의 견해를 상세히 설명했다.[91] 그의 주된 관심사는 불문율 교리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증거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플라톤의 이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시무시한 적개심은 물론 특정한 오해 탓으로 돌렸다. 체르니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장대모사 과정에서 플라톤의 견해를 왜곡시켰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자신과 모순되기까지 했다고 믿었다. 체르니스는 플라톤에 대한 어떤 구두 가르침도 대화와 그 이상에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그는 아카데미에서 철학적인 가르침에 대한 현대의 가설은 근거 없는 추측이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대화에서 발견된 형태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보고서 사이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었다. 체르니스는 플라톤이 일관되게 형식론을 옹호해왔으며, 불문율의 원리에 따라 그것을 수정했다는 가정에는 그럴듯한 주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곱 번째 편지는 체르니스가 들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었다.[92]
플라톤의 철학에 대한 반체제적 해석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슐레이어마허의 대화적 접근방식이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수많은 학자들이 '대화론'으로도 알려진 플라톤의 '반체제' 해석을 촉구했다.[93] 이 접근법은 모든 종류의 '독단적인' 플라톤 해석과 특히 난해하고 불문명한 교리의 가능성을 비난한다. 플라톤이 확실하고 체계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진리를 주장한다는 명제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이 반체제적 접근법의 지지자들은 적어도 플라톤의 철학 수행방식의 본질은 개별적인 교리의 확립이 아니라 오히려 공유된 '대화적' 반영, 특히 다양한 조사방법의 시험이라는 데 동의한다. 슐레이어마허가 이미 강조했듯이 이러한 철학 스타일은 독자들의 더 깊고 깊은 생각을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결과보다는) 조사 과정이 특징적이다. 그것은 최종적인 독단의 진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일련의 질문과 대답을 장려한다. 슐레이어마허의 대화론의 광범위한 발전은 마침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도 했다. 그는 대화에서 체계적 철학을 잘못 추구했다는 비난을 받았다.[94]
이 반체제적 해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플라톤의 글쓰기에 대한 비판과 그가 자신의 철학을 대중에게 글로 전달했다는 관념 사이에 모순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비평이 독단과 교리를 표현하는 종류의 글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믿는다. 대화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허구적인 대화를 가장하여 그 내용을 제시하기 때문에 플라톤의 비판은 적용되지 않는다.[95]
튀빙겐 패러다임의 기원과 보급
1950년대까지만 해도 과연 고대 출처로부터 실제로 불문율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논의의 중심에 서 있었다. 튜빙겐 학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 후 격렬한 논란이 일었고, 쓰이지 않은 교리는 실제로 재구성될 수 있고 플라톤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튜빙겐 가설이 맞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으로 논쟁이 옮겨갔다.[96]
튀빙겐 패러다임은 한스 요아힘 크레이머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화되고 철저하게 방어되었다. 그는 1959년 한 모노그래프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볼프강 샤데발트의 감독하에 1957년 논문의 개정판이었다.[97] 1963년 샤데발트(Shadewaldt)의 학생이기도 한 콘라드 가이저는 불문율 교리에 관한 포괄적인 모노그래프로 교수 자격을 얻었다.[98]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두 학자들은 튀빙겐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일련의 출판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옹호했다.[99]
는 튀빙겐 패러다임의 또한 잘 알려 진 지지자들 토마스 알렉산더 Szlezák는 튀빙겐에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writing,[100]의 플라톤의 비판 철학 옌스 Halfwassen, 하이델베르크에서 특히 4'ce'플라톤의 2대 원칙의 역사를 가르쳐 준 역사가 특히 일을 가르쳤다를 포함한다.ntury 네오플라톤주의를 통한 BCE, 노트르담 대학교(미국)[101]에서 강의하는 비토리오 회슬.
플라톤에 Tübinger 접근법 지지자들은, 예를 들어, 마이클 Erler,[102]위르겐 Wippern,[103]칼 Albert,[104]하인츠 Happ,[105]윌리 Theiler,[106]클라우스 Oehler,[107]헤르만 Steinthal,[108]존 니마이어 Findlay,[109]Marie-Dominique Richard,[110]Herwig Görgemanns,[111]월터 Eder,[112]요제프 Seifert,[113]요아힘 Söder,[114]칼을 포함한다.프리드리히 폰 Weizsäcker,[115]Detlef Thiel,[116]고far-r 새로운 and—with.각각의 이론—크리스티나 쉐퍼.[117]
튀빙겐 접근법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코르넬리아 J. 드 보겔,[118] 라파엘 페르버,[119] 존 딜런,[120] 위르겐 빌러스,[121] 크리스토퍼 길,[122] 엔리코 베르티,[123] 한스 조르크 가다머 등이다.[124]
튀빙겐 패러다임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한 이탈리아의 철학사학자 조반니 레알의 중요한 연구결과로 오늘날에는 '튀빙겐과 밀라노의 학교'[125]라고도 불린다. 이탈리아에서도 마우리치오 밀리오리와[126] 지안카를로 모비아는[127] 불문율 교리의 진위성을 외쳐왔다. 최근에는 레알의 제자 파트리아 보나구라가 튀빙겐의 접근을 강하게 옹호하고 있다.[128]
튀빙겐 학파의 비판자
다양하고 회의적인 입장은 특히 영미 장학금뿐 아니라 독일어를 구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얻었다.[129] 이 비평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의 경우, 그레고리 블라스토스와 레지날드 E. 알렌;[130]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코 트라바토니와[131] 프란체스코 프론테로타,[132] 프랑스에서는 뤽 브리송,[133] 스웨덴에서는 E. N. Tigerstedt.[134] 독일어를 사용하는 비평가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테오도르 에베르트,[135] 에른스트 하이치,[136] 프리츠-피터 헤거[137], 귄터 패치히.[138]
급진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은 플라톤이 이미 대화에 나오지 않은 어떤 것도 구두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139]

온건한 회의론자들은 어떤 종류의 불문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튀빙겐 재건을 추측성, 증거에 근거한 불충분, 그리고 너무 멀리까지 도달했다고 비판한다.[140] 튀빙겐 학파의 많은 비평가들은 플라톤에 기인하는 원칙의 진위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플라톤 학파의 후기 개념으로 보는데 이는 결코 체계적으로 해결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개발한 철학과 통합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두 원칙 이론이 플라톤의 철학의 핵심이 아니라 그의 철학적 활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된 잠정적인 개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개념들을 가설로 소개했지만, 대화의 기초가 되는 형이상학과는 통합되지 않았다.
이러한 온건한 견해의 지지자들로는 도로테아 프레데,[141] 칼 하이네스 일팅,[142] 홀거 테슬레프가 있다.[143] 마찬가지로, 안드레아스 Graeser 토론에 학생 interns'[144]과 위르겐 Mittelstraß 그들이 'a 신중한 질문이 걸린다로 이 불문화된 원칙은 'contribution을 가상적인 반응은 suggested.'[145]라파엘 퍼버는 플라톤은 고정된 서면 양식에 다른기 때문에, 사이의 원리를 저지르지 않다고 믿는다 갈라hings, 그는 그들을 지식으로 여기지 않고 단순한 의견으로 여겼다.[146] 마르게리타 이나르디 파렌테는 불문율 교리의 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에 관한 보도의 전통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플라톤의 진정한 견해가 발견될 대화 철학과 함께 투빙겐 재구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보도는 플라톤 그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초기 아카데미 회원들에 의한 그의 사상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다.[147] 프랑코 페라리 역시 이러한 체계화는 플라톤에 기인해야 한다고 부인하고 있다.[148] 볼프강 쿨만은 두 원칙의 진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원칙과 대화의 철학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을 본다.[149] 볼프강 비엘란드는 불문율 대화 재구성을 받아들이지만 그 철학적 관련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며 플라톤 철학이 핵심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150] 프란츠 폰 쿠츠케라는 불문율 교리의 존재는 심각하게 문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보고의 전통이 너무나 저질의 것이기 때문에 재건 시도는 반드시 대화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151] 도메니코 페세스는 불문율 교리의 존재를 긍정하고 그들이 선한 것을 염려하지만 튀빙겐 재건과 특히 플라톤의 형이상학이 양극화였다는 주장을 비난한다.[152]
때때로 날카롭고 격렬한 튀빙겐 학파에 대한 논쟁에서 두드러진 2차적인 측면이 있다: 양측의 적대자들은 전제된 세계관 안에서 논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콘라드 가이저는 토론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이 논쟁에서, 그리고 아마도 양쪽 모두, 어떤 철학이 무의식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현대적 개념들은 거의 해결의 희망이 없다'[153]고 말했다.
참고 항목
- 플라톤의 우화적 해석, 플라톤의 대화 내에서 우화로 대표되는 교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주장에 대한 조사.
- 플라토닉 유니타리아리즘의 미국 챔피언이자 난해성 비평가인 해롤드 체르니스
- 튀빙겐 학교(독일어)의설립자인 한스 크래머 ]
- Tübingen School(독일어)의 설립자인Konrad Gaiser ]
참조
- ^ 아래 및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 209b13–15를 참조하십시오.
- ^ 고대 철학의 난해성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W. Burkert, 고대 피타고라스주의의 로레, 과학을 참조하라. 하버드 대학 출판부, 1972), 페이지 19, 179 ff 등.
- ^ 예를 들어, 콘라드 가이저에서: 플라톤 esoterische Lehre.
- ^ Reale의 연구에 대해서는 아래의 Fore Reading을 참조하십시오.
- ^ 드미트리 니쿨린, ed, The Other Plato: The Tübingen Interpretation of Plato's Inner-Academic Teachings (Albany: SUNY, 2012), and Hans Joachim Krämer and John R. Catan, Plato and the Foundations of Metaphysics: A Work on the Theory of the Principles and Unwritten Doctrines of Plato with a Collection of the Fundamental Documents (SUNY Press, 1990).
- ^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 209b13–15.
- ^ 아리스톡세노, 엘레멘타 하모니카 2,30–31.
- ^ 한스 요아힘 크래머와 존 R. 카탄, 플라톤과 형이상학의 기초: 기본 문서 모음집을 가지고 플라톤의 원리 이론과 불문헌 교리에 관한 연구(SUNY Press, 1990)의 1장을 참조하라.
- ^ 플라톤, 파드루스 274b–278e.
- ^ 한스 요아힘 크래머와 존 R. 카탄, 플라톤과 형이상학의 기초: 기본 문서 모음집을 가지고 플라톤의 원리 이론과 불문헌 교리에 관한 연구(SUNY Press, 1990)의 1장을 참조하라.
- ^ 플라톤, 7번째 편지, 341b–342a.
- ^ 한스 요아힘 크래머와 존 R. 카탄, 플라톤과 형이상학의 기초: 기본 문서 모음집을 가지고 플라톤의 원리 이론과 불문헌 교리에 관한 연구(SUNY Press, 1990)의 7장을 참조하라.
- ^ 한스 요아힘 크레이머: Die platonische Akademie와 Das 문제 einer systematischen der Philosicie Platons.
- ^ 한스 요아힘 크래머와 존 R. 카탄, 플라톤과 형이상학의 기초: 기본 문서 모음집을 가지고 플라톤의 원리 이론과 불문헌 교리에 관한 연구(SUNY Press, 1990)의 부록 3을 참조하라.
- ^ 마이클 얼러: 플라톤, 뮌헨 2006, 페이지 162–164; 데틀레프 티엘: 다이 철학자 임 콘텍스트 데어 알텐 아카데미, 뮌헨 2006 페이지 143–148.
- ^ See Michael Erler: Platon (=Hellmut Flashar, Ed.)
- ^ 마티아스 발테스, 하인리히 두리어의 텍스트 및 독일어 번역: 더 앤티크, 밴드 1, 슈투트가르트-배드 칸스타트 1987, 페이지 82–86, 해설 페이지 296–302.
- ^ 마티아스 발테스, 하인리히 두리어의 텍스트 및 독일어 번역: 더 앤티크, 밴드 1, 슈투트가르트-배드 칸스타트 1987, 페이지 86–89, 해설 페이지 303–305.
- ^ Sextus Empiricus, 물리학자 책 II편 263-275
- ^ HeinzHapp 참조: Hyle, 1971 페이지 140–142; Marie-Dominique Richard: L'enseign 구두 de Platon, 2.
- ^ 옌스 하프웨센: 데르 아우프스티그 줌 에이넨
- ^ 마이클 얼러(Michael Erler)에 개요가 있다: 플라톤(=Hellmut Flashar, ed.
- ^ 한스 요아힘 크래머와 존 R. 카탄, 플라톤과 형이상학의 기초: 기본 문서 모음집을 가지고 플라톤의 원리 이론과 불문헌 교리에 관한 연구(SUNY Press, 1990)의 6장을 참조하라.
- ^ 형식 이론에 대한 개요는 P를 참조하십시오. 프리드랜더, 플라톤: 소개(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 ^ 조반니 레알: 주 에이너 신경 해석 플라톤스, 2.
- ^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987b.
- ^ 플로리안 칼리안: 하나, 둘, 셋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에서의 숫자 생성에 대한 토론; 조반니 레알: 주 에이너 신경 해석 플라톤, 2.
- ^ 하인리히 두리, 마티아스 발테스: 데어 안티케, 밴드 4, 슈투트가르트-배드 칸스타트 1996, 페이지 154–162(텍스트 및 번역), 448–458(토론); 마이클 얼러: 플라톤 (=헬무트 Flashar, Ed.)
- ^ 한스 요아힘 크레이머: 아레테 베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하이델베르크 1959, 페이지 144 ff; 콘라드 가이저: 플라톤스 언게슈리베네 레레, 3
- ^ 개요는 한스 요아힘 크래머와 존 R. 카탄, 플라톤과 형이상학의 기초: 기초문서를 모은 플라톤의 원리 이론과 불문헌 교리에 관한 연구(SUNY Press, 1990)를 참조한다.
- ^ 콘라드 가이저: 플래턴즈 언게쉬리베네 레레, 3세
- ^ 개요는 한스 요아힘 크래머와 존 R. 카탄, 플라톤과 형이상학의 기초: 기초문서를 모은 플라톤의 원리 이론과 불문헌 교리에 관한 연구(SUNY Press, 1990)를 참조한다.
- ^ Christina Schfer: Platons unsagbare Erfahrung, Basel 2001, 페이지 186 ff.
- ^ 플라톤, 메노 81c–d.
- ^ 플라톤, 공화국 511b.
- ^ 마이클 얼러: 플라톤 (= 헬무트 플래시아, 에드.)에 문학평이 있다.
- ^ 옌스 하프웨센: 플라톤 프린지피엔레르의 모니스무스와 듀얼리스무스.
- ^ 존 N. 핀들레이: 플라톤.
- ^ 코넬리아 J. 드 보겔: 플라톤과 플라톤주의를 다시 생각해 보라, 레이든 1986, 페이지 83 ff, 190–206.
- ^ 한스 요아힘 크레이머: 데르 우르스프룽 데르 가이스트메타피식, 2세
- ^ 콘라드 가이저: 플래턴즈 언게쉬리베네 레레, 3세
- ^ Christina Schfer: Platons unsagbare Erfahrung, Basel 2001, 페이지 57–60.
- ^ 조반니 레알: 주 에이너 신경 해석 플라톤스, 2.
- ^ 하인즈 합프: 힐, 1971년 베를린 페이지 141-143.
- ^ 마리 도미니크 리차드: 랑세인트 구강 데 플라톤, 2세.
- ^ Paul Wilpert: Zwei 아리스토텔레스티슈 Fruhschriften über die Ideenlehre, Regensburg 1949, 페이지 173–174.
- ^ Detlef Thiel: Die Vhichie des Xenokrates im Kontext der Alten Akademie, München 2006, p. 197f. and note 64; Jens Halfwassen: 데르 아우프스티그 줌 에이넨
- ^ 토마스 알렉산더 스슬레자크 공화국의 관련 구절 모음집: 산크트 아우구스틴 2003, 페이지 111 ff. 연구논쟁에 대한 입장 개요는 라파엘 페르버를 참조하라. die die des Guten nicht transzendent oder isti es doch?
- ^ 그리스어로 '나이에 따른 계급'이라는 프리베아어 또한 '가치'로 번역된다.
- ^ 플래튼, 공화국 509b.
- ^ 굿 형태의 초월적 존재는 테오도르 에버트: Theodor Ebert: Meinung und Wissen in der Phorphicie Platons, 1974년 베를린, 169–173, Matthias Baltes에 의해 부인된다. 플라톤의 공화국에 있는 선인의 사상은 존재 이상의 것인가?
- ^ 이 직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모음은 Thomas Alexander Szlezák: Die Idee des Guten in Platons Politicalia, Sunkt Augustin 2003, 페이지 67 fff에 있다.
- ^ 옌스 하프웨센: 데르 아우프스티그 줌 에이넨
- ^ 라파엘 페르버: 플라토스 이데 데 구텐, 2, 에르웨이트 아우구스티지, 1989년 산크트 아우구스틴, 76-78페이지.
- ^ 아리스톡세노, 엘레멘타 하모니카 30호
- ^ 조반니 레알: 주 에이너 신경 해석 플라톤스, 2.
- ^ 조반니 레알: 주 에이너 신경 해석 플라톤스, 2.
- ^ 조반니 레알: 주 에이너 신경 해석 플라톤스, 2.
- ^ Michael Erler의 관련 학구적 논쟁 개요: Platon (=Hellmut Flashar, ed.)
- ^ 콘라드 가이저: 플래턴즈 언게쉬리베네 레레, 3세
- ^ 마이클 얼러: 플라톤 (=헬무트 Flashar, Ed.)
- ^ 피터 스템머: 플래턴스 다이얼렉틱.
- ^ 쿠르트 폰 프리츠: 베이트레게 주 아리스토텔레스, 1984년 베를린, 페이지 56f.
- ^ 위르겐 빌리어스: 다스 파라디그마 데 알파베츠.
- ^ 옌스 하프웨센: 데르 아우프스티그 줌 에이넨
- ^ Christina Schfer: Platons unsagbare Erfahrung, Basel 2001, 페이지 60 ff.
- ^ Christina Schfer: Platons unsagbare Erfahrung, Basel 2001, 페이지 5–62.
- ^ 다른 관점은 한스 요아힘 크래머를 참조하십시오. 아레테 베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하이델베르크 1959, 페이지 464 ff.
- ^ 라파엘 페르버: "Ungeschriebenenen Lehre"의 모자 플라톤은 "dogmatische Metheshik und Systematik" vertreten?
- ^ 콘라드 가이저: 프린지피엔테리 베이 플라톤.
- ^ Christina Schfer: Platons unsagbare Erfahrung, Basel 2001, 페이지 49–56.
- ^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개요는 마리 도미니크 리차드: 랑세니크 구술 드 플라톤, 2에 있다.
- ^ 장학금의 내역은 마이클 얼러: 플라톤(=헬무트 Flashar, ed.)을 참조한다.
- ^ 한스 요아힘 크레이머: 아레테 베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하이델베르크 1959, 페이지 20–24, 404–411, 444.
- ^ Karl-Hainz Ilting: Platons ‚Ungeschrieven Lehren': der Vortrag ‚ber das Gute'.
- ^ 헤르만 슈미츠: 아리스토텔레스 데스 아리스토텔레스, 밴드 2: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본 1985, 페이지 312–314, 339f.
- ^ Detlef Thiel: Die Philicie des Xenokrates im Kontext der Alten Akademie, München 2006, 페이지 180f.
- ^ 콘래드 가이저: Gesammelte Schriften, Sankt Augustin 2004, 페이지 280–282, 290, 304, 311.
- ^ Konrad Gaiser: 플라톤의 수수께끼 같은 강의.
- ^ 그러나 테오프라스토스의 마르게리타 이샤르디 파렌테의 해석에 대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테오프라스트, 은유시카 6 a 23 s.
- ^ 콘라드 가이저: 프린지피엔테리 베이 플라톤.
- ^ 조반니 레알: 주 에이너 신경 해석 플라톤스, 2.
- ^ 프리드리히 대니얼 에른스트 슐리에마허: 뷔르 다 철학자 플라톤스, 피터 M. Steiner, Hamburg 1996, 페이지 21–119.
- ^ 토마스 알렉산더 스즐레자크: 슐라이어마커스의 "아인라이퉁" 주르 플라톤-위베르세츠웅 본 1804를 참조하라.
- ^ Gyburg Radke: Das Lécheln des Parmenides, 2006년 베를린, 페이지 1-5.
- ^ 아우구스트 보에크: 크리틱 데르 우에베르셋중 데 플라톤 폰 슐레이에르마허.
- ^ 크리스티안 아우구스트 브랜디스: 아리스토텔레스 성당 아리스토텔레스 성당(聖堂)을 1823년 본(本)의 성리학(聖理學)을 인용한다.
- ^ 프리드리히 아돌프 트렌델렌버그: 플라토니스 데 이데리스 et 숫자 교조리나 e 아리스토텔레 일러스트라타, 라이프치히 1826; 크리스티안 헤르만 웨이세: 유권자의 드 플라토니스 외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이 다른 라이프치히 1828년이다.
- ^ 칼 프리드리히 헤르만: 위버 플라토스 슈리프트스텔러리스체 모티브.
- ^ 경쟁은 얼리 아카데미의 수수께끼인 해롤드 체르니스)와 함께 시작되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출판부, 1945) 및 그레고리 블라스토스, H. J. 크레이머, 아레테 베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리뷰, Gnomon, v. 35, 1963, 페이지 641-655. 플라토닉 스터디(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2차 개정), 페이지 379-403에 추가 부록으로 인쇄.
- ^ 그의 견해에 대한 간단한 요약은 얼리 아카데미의 수수께끼 해롤드 체르니스(Berkelear Academy)를 참조하라. 캘리포니아 대학교 출판부, 1945).
- ^ 체르니스는 자신의 견해를 디 알테레 아카데미에 발표했다.
- ^ C에 플라톤 연구의 이 단계를 나타내는 몇몇 논문들이 있다. 그리즈월드 주니어, '플라토닉 글쓰기, 플라토닉 리딩' (런던: Routrege, 1988)
- ^ Schleiermacher의 관점에 대한 영향은 Gyburg Radke: Das Lécheln des Parmenides, 2006년 베를린, 페이지 1–62를 참조한다.
- ^ 프랑코 페라리: 레즈 교리 논 에크리트.
- ^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한스 요아힘 크래머와 존 R. 카탄, 플라톤과 형이상학의 기초: 기본 문서 모음집을 가지고 플라톤의 원리 이론과 불문헌 교리에 관한 연구(SUNY Press, 1990)를 참조하라.
- ^ 한스 요아힘 크레이머: 아레테 베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하이델베르크 1959, 페이지 380-486.
- ^ 콘라드 가이저: 플래턴즈 언게쉬리베네 레레, 슈투트가르트 1963, 2
- ^ 크래머의 가장 중요한 작품들은 옌스 하프웨센에 실려 있다. 플라톤 프린지피엔레르의 모니스무스와 듀얼리스무스.
- ^ 토마스 알렉산더 스즐레자크: 플라톤과 다 죽어 슈리플리히케이트 데르 철학, 1985년 베를린, 페이지 327–410; 토마스 알렉산더 스즐레자크: 수르 ü블리첸 압네이궁 게겐은 아그라프라파 도그마타로 죽는다.
- ^ 비토리오 호슬레: 와헤이트와 게시히테, 슈투트가르트-배드 칸스타트 1984, 페이지 374–392.
- ^ 마이클 얼러: 플라톤, 뮌헨 2006, 페이지 162–171.
- ^ 위르겐 위페른: 에인레이퉁.
- ^ Karl Albert: Platon und die Attertums, Teil 1, Dettelbach 1998, 페이지 380–398.
- ^ 하인즈 합프: 힐, 1971년 베를린 페이지 85-94, 136-143.
- ^ 윌리 테일러: Untersuchungen sur Antiken Literatur, 1970년 베를린, 페이지 460–483, esp. 462f.
- ^ 클라우스 외흘러: 플라톤포르스충은 죽는다.
- ^ 헤르만 스타인탈: 운게슈리베네 레레.
- ^ 존 N. 핀들레이: 플라톤.
- ^ 마리 도미니크 리차드: 랑세인트 구강 데 플라톤, 2세.
- ^ 헤르비히 괴게만: 플라톤, 하이델베르크 1994, 페이지 113–119.
- ^ 월터 에더: Die ungeschriebene Lehre Platons: Jur Datierung des Platonischen Vortrags "über das Gute".
- ^ 지오반니 레알의 지헤 세이퍼츠 나흐워트: 주 에이너 신경 해석 플라톤스, 2.
- ^ 요아힘 소더: 주 플라톤스 베르켄.
- ^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제커: 더 가텐 데 멘슐리헨, 2세.
- ^ Detlef Thiel: Die Philicie des Xenokrates im Kontext der Alten Akademie, München 2006, 페이지 137–225.
- ^ Christina Schfer: Platons unsagbare Erfahrung, Basel 2001, 페이지 2–4, 10–14, 225.
- ^ 코넬리아 J. 드 보겔: 플라톤과 플라톤주의를 다시 생각해 보라, 레이든 1986, 페이지 190–206.
- ^ 라파엘 페르버: 와룸모자 플라톤은 '언게슈리베네 레흐레' 니콜트 게슈리벤?, 2
- ^ 존 딜런: 플라톤의 상속인, 옥스포드 2003, 페이지 VII, 1, 16–22.
- ^ 위르겐 빌리어스: 다스 파라디그마 데 알파베츠.
- ^ 크리스토퍼 길: 플라토닉 변증법과 불문교의 진실-상태.
- ^ 엔리코 베르티: 뷔르 다스 베르하틀트니스 폰 문학가리스켐 베르크 운트 ungeschriebener Lehre Bei Platon in 데르 시흐트 데르 네에렌 포르스청.
- ^ 한스-조르그 가다머: 투메크틱과 소피스트릭은 시벤텐 플라토니스첸 브리프.
- ^ 라파엘 페르버: 와룸모자 플라톤은 '언게슈리베네 레흐레' 니콜트 게슈리벤?, 2
- ^ Maurizio Milliori: Dialetica e Verita, Milano 1990, 페이지 69–90.
- ^ 지안카를로 모비아: 아파렌즈, essere e verita, 밀라노 1991, 페이지 43, 60 ff.
- ^ 파트리아지아 보나구라: 아웃사이더다드 e 인테리어다드.
- ^ 이러한 입장들 중 일부는 마리 도미니크 리차드에서 검토되고 있다: 랑세그먼트 구술 드 플라톤, 2.
- ^ 그레고리 블라스토스: 플라토닉 스터디, 2.
- ^ 프랑코 트라바토니: 크리비어 넬 애니마, 피렌체 1994.
- ^ 프란체스코 프론테로타: une énigme plantonicienne: la question des non ecrites.
- ^ Luc Brisson: 플라톤에 대한 난해한 해석의 전제, 결과, 그리고 유산.
- ^ 외젠 나폴레온 타이거스테트: 플라톤, 스톡홀름 1977, 페이지 63–91.
- ^ 테오도어 에버트: 1974년 베를린 필로코니 플래튼스의 메이룽과 위센. 2-4페이지.
- ^ 에른스트 하이치: τι μιΩττα.
- ^ 프리츠-피터 헤거: 수르 철학 문제아티크 데르 소게난닝 언게슈히베넨 레흐레 플라토스.
- ^ 귄터 패치히: 플라톤스 정치 에딕.
- ^ '극단적' 견해에 대한 논의는 한스 요아힘 크레이머와 존 R. 카탄, 플라톤과 형이상학의 기초: 기본문서 모음집을 통한 플라톤의 원리 이론과 불문율론에 관한 연구(SUNY Press, 1990)를 참조한다.
- ^ 예를 들어, 마이클 보르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마이클 보르드: 플라톤, 프라이부르크 1999, 페이지 51-53을 참조하라.
- ^ 도로테아 프레드: 플라톤: 필레보스. 위베르세츠궁과 코멘타르, 괴팅겐 1997, S. 403–417. 그녀는 특히 플라톤이 현실의 전체는 두 가지 원칙에서 파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한다.
- ^ Karl-Hainz Ilting: Platons ‚Ungeschrieven Lehren': der Vortrag ‚ber das Gute'.
- ^ Holger Thesleff: Platonic Patternes, 라스베이거스 2009, 페이지 486–488.
- ^ 안드레아스 그레서: Die Philicie der Antike 2: 소피스트릭 und Sokratik, 플라톤 und Atresteles, 2.
- ^ 위르겐 미텔스트라시: 온톨로지아 더 기하학적 표현.
- ^ 라파엘 페르버: 와룸모자 플라톤은 '언게슈리베네 레흐레' 니콜트 게슈리벤?, 2
- ^ 마르게리타 이나르디 파렌테: Il problema della "dotttrina non Scritta" di Platone.
- ^ 프랑코 페라리: 레즈 교리 논 에크리트.
- ^ 볼프강 쿨만: 플라톤스 슈리프트크리틱.
- ^ 볼프강 위엘랜드: 플라톤과 다이 포멘 데 위센스, 2.
- ^ 프란츠 폰 쿠츠케라: 플라톤스 철학, 밴드 3, 파더본 2002, 페이지 149–171, 202–206.
- ^ 도메니코 페체: Il Platone di Tubinga, Brescia 1990, 페이지 20, 46–49.
- ^ 콘라드 가이저: 프린지피엔테리 베이 플라톤.
원천
영어 자원
- 드미트리 니쿨린, 에드 다른 플라톤: 플라톤의 내부-학술적 가르침에 대한 튜빙겐 해석 (Albany: SUNY, 2012) 소개와 개요가 수록된 최근의 문집.
- 한스 요아힘 크레이머와 존 R. 카탄, 플라톤과 형이상학의 근간: 기본문서 모음집과 함께 플라톤의 원리 이론과 불문헌 교리에 관한 연구 (SUNY Press, 1990) 튀빙겐 학교 설립자의 작품 번역.
- 존 딜런, 플라톤의 후계자: 구 아카데미 연구, 347 -- 274 BCE (Oxford: Clarendon Press, 2003), esp. 페이지 16 – 29. 선도적인 학자의 불문율의 온건한 견해.
- 해롤드 체니스, 얼리 아카데미 수수께끼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출판부, 1945). 미국의 저명한 불문율 비평가.
- Gregory Blastos, H. J. Kraemer, Arete Bei Platon und Aresteles, Gnomon, v. 35, 1963, 페이지 641–655. 플라토닉 스터디(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2차 개정), 페이지 379–403에 추가 부록으로 인쇄. 체르니스의 리들과 함께, 많은 영미 학자들이 튀빙겐 학파에 반대하도록 만들었던 유명한 비평 평론.
- 존 니메이어 핀들레이, 플라톤: 성문 및 불문교(London: Routrege, 2013) 1974년에 처음 출판된 오래된 작품으로, 튀빙겐 학파와는 독립적으로 불문율의 중요성을 표방하고 있다.
- K. Sayre, 플라톤의 후기 온톨로지: 수수께끼 해결됨(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플라톤의 정치가로서의 형이상학과 방법(Cambridge: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2011). Sayre는 불문율 교리에 대한 암시는 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간 입장을 추구한다.
고대 증거 수집
- Margherita Isnardi Parrente(에드): 추천서 플라토니카(=Atti deella Academia Nazionale dei Lincei, Classe di scienze morali, storich e filologich, Memberie, Reihe 9, 밴드 8 Heft 4 und 밴드 10 Heft 1) Rom 1997-1998(이탈리아어 번역 및 논평이 포함된 비평판)
- 헤프트 1: Le responsonze di Aristotele, 1997
- 헤프트 2: 레포도니아체 디 에타 엘렌리스티카 에 디 에타 제국주의, 1998년
- Giovanni Reale (ed.): Autotestimonianze e rimandi dei dialoghi di Platone alle "dottrine non scritte". 봄피아니, 밀라노 2008, ISBN978-88-452-6027-8(이탈리아어 번역본과 상당한 서론이 수록된 관련 서적의 모음으로, 레알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비판에 응한다.)
추가 읽기
개요
- 마이클 얼러: 플라톤 (=Hellmut Flashar (ed.): 그룬드리스 데르 게시히테 데르 철학. Die Philhonie der Antike, 밴드 2/2), 바젤 2007, 페이지 406–429, 703–707
- 프랑코 페라리: 레즈 교리 논 에크리트. 인: 리차드 굴레(edd.): 철학자의 골동품, 밴드 5, 테일 1 (= V a), CNRS 에디션스, 파리 2012, ISBN 978-2-271-07335-8, 페이지 648–661
- 콘라드 가이저: 플라톤 에소테리스체 레레. 인: 콘라드 가이저: 제삼멜테 슈리프텐 2004년 산크트 아우구스트, ISBN 3-89665-188-9, 페이지 317–340
- 옌스 하프와센: 플라톤 메타피쉬크 데 아이넨. 인: 마르셀 판 애크렌(ed.): 플라톤 베르스테헨. 테멘과 페르스페크티븐.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2004, ISBN 3-534-17442-9, 페이지 263–278
조사
- 라파엘 페르버: 와룸모자 플라톤이 죽다 "언게슈리베네 레흐레" 니치 게슈리벤? 2. 아우플라주, 벡, 뮌헨 2007, ISBN 978-3-406-55824-5
- 콘라드 가이저: 플래턴즈 언게쉬리베네 레레 Studien jur systematischen und Geschichlichen Begrndung der Wissenschaften in Der Platonischen Schule. 3. Auflage, Klett-Cotta, Stuttgart 1998, ISBN 3-608-91911-2 (pp. 441–557의 고대 문헌 수집)
- 옌스 하프웨센: 데르 아우프스티그 줌 에이넨 운터수충겐즈 플라톤 und Plotin. 2. 에르웨테 아우플라주, 사우르, 뮌헨 und 라이프치히 2006, ISBN 3-598-73055-1
- 한스 요아힘 크레이머: 아레테 베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Zum Wesen und Jur Geschicte der Platonischen Ontologie. 윈터, 하이델베르크 1959년(근본적인 조사, 그러나 일부 입장은 후기 연구에 의해 대체되었다)
- 한스 요아힘 크레이머: 플라톤 이 폰다멘티 델라 메타피시카. Saggio sula teoria dei principle e sulle dottrine non scritte di Platone. 6. 아우플라주, 비타 이 펜시에로, 밀라노 2001, ISBN 88-343-0731-3 (이것은 잘못된 영어 번역보다 낫다: 플라톤과 형이상학의 기초. 기초문서를 모아 플라톤의 원리와 불문교론에 관한 연구 뉴욕 주립대 언론대학, 알바니 1990, ISBN 0-7914-0434-X)
- 조반니 레알: 주 에이너 신경 해석 플라톤스. Eine Auslegung der Metaphysik der Growen Dialoge im Lichte der "ungeschrieebenenen Lehren" 2. 에르베테 아우플라주, Shöningh, 2000, ISBN 3-506-77052-7 (주제의 소개로 적합한 개요)
- 마리 도미니크 리차드: 플라톤을 분할하다. Unnouvel interprétation du Platonism. 2. 뷔르바바테 아우플라주, 레 에데스 뒤 세르프, ISBN 2-204-07999-5 (pp. 243–381은 프랑스어 번역이 있지만 비판적 장치가 없는 원본 텍스트 모음)
외부 링크
- 강의 폰 토마스 알렉산더 쉴레자크: 프리드리히 슐레이어마허와 다스 플라톤빌드 데스 19. 20. 자룬더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