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진리의 원칙
Two truths doctrine| 시리즈의 일부 |
| 불교 |
|---|
 |
두 진리에 대한 불교 교리는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에서 두 단계의 사티야(산스크리트어: dvasatya, wilie: bden pa gnyis)를 구별한다.
정확한 의미는 다양한 불교 학교와 전통에 따라 다르다.가장 잘 알려진 해석은 인도 불교 승려이자 철학자 [1]나가르주나가 창시자인 마하야나 불교의 마디아마카 학파에서 나온 것이다.나가르주나에게 두 가지 진실은 인식론적 [2]진실이다.경이로운 세계에는 [2]잠정적인 존재가 부여되어 있다.경이로운 세계의 특징은 현실도 현실도 아닌 논리적으로도 결정 불가능한 [2]것으로 선언된다.궁극적으로, 모든 현상은 자아(아나타)의 비존재로 인해 내재된 자아 또는 본질의 공허함(ūnyā)이지만, 다른 현상(프라테티야사무트파다)[1][2]에 따라 존재한다.
중국 불교에서는 마드하마카의 입장을 받아들여 두 가지 진리는 두 가지 존재론적 진리를 말한다.현실은 상대적인 레벨과 절대적인 [3]레벨의 두 가지 레벨로 존재한다.중국의 승려와 철학자들은 대승법(大,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의 자연에 대한 가르침은 경전에 언급된 대로 최종적인 불교 가르침이며, 대승법(大ny法)과 두 가지 [4]진리 위에 본질적인 진실이 있다고 추정했다.운야타 이론은 어떠한 형이상학적 체계도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고 엄격히 정당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이다.그것은 허무주의로 이어지지 않고 지나친 순진함과 지나친 회의주의 [1]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다.
어원과 의미
Satya는 보통 "진실"을 의미하지만 "현실", "진정한 실재"[5]를 의미하기도 한다.Satya는 [6]Sat와 ya에서 유래했다.Sat은 존재, 현실을 의미하며, 어근의 현재 분사형인 be이다(PIE *h-es-; 영어에 동치).[6]Ya와 Yam은 "진보, 지지, 버티기, 지속, 움직이는 [7][8]것"을 의미합니다.사티야와 사티얌은 합성어로서 "현실을 지지, 유지, 발전시키는 존재"를 의미하며, 문자 그대로 "진실, 실제, 진실, 신뢰할 수 있는, 유효한 [6]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진리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한다.
- 잠정적 또는 관습적 진리(산스크리트어 savvtiti-satya, Parli sammuti sacca, 티베트어 kun-rdzob bden-pa)는 구체적인 세계의 일상 경험을 기술한다.
- 궁극의 진리(산스크리트어, 파라마르타사티야, 팔리 파라마타 사카, 티베트어: don-dam bden-pa)는 궁극의 현실을 선야타로 묘사하고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특징이 없다.
Chandrakrrti는 sa'vtiti의 세 가지 의미를 제시합니다.
- 완전한 은폐 또는 진실을 숨기는 무지의 '스크린'
- 의존관계, 상호조건화를 통한 존재 또는 발생
- 지정과 디자인, 인지 및 인지(cognitum)를 포함한 세속적 행동 또는 언어 행동.
통념의 진실은 결과적으로 "참견적 진실" 또는 "진실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그것은 잘못된 인식의 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통념의 진실은 이해와 이해, 그리고 그 안에서 인식되는 사물의 이중성을 포함하는 외관일 것이다.궁극의 진실은 이해의 이중성이 없고 [9]이해되는 현상이다.
배경
부처의 달마 가르침은 고통이나 덕하로부터 해방되는 길(마르가)로 볼 수 있다.첫 번째 고귀한 진리는 삶의 경험을 고통과 고통과 동일시한다.부처님의 언어는 단순하고 구어적이었습니다.자연히 부처의 다양한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이후 불교 교사들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문제에 직면했다.나가르주나와 다른 교사들은 통념과 [1]궁극의 두 가지 수준의 진실을 구별하는 해석기법을 도입했다.
비슷한 방법은 베다 성경의 브라만학적 해석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브라만의 의식적인 명령과 우파니샤드의 사색적인 철학적 질문을 하나의 '발견'된 작품으로서 결합함으로써 냐나 카와 카르마카를 [1]대비시킨다.
기원 및 개발
| 시리즈의 일부 |
| 불교 철학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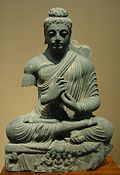 |
| |
이 두 가지 진리의 개념은 마드야마카 종파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 역사는 불교의 초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인도 불교
팔리 캐논
팔리교전에서는 낮은 진리와 높은 진리의 구별이 아니라 같은 진리의 두 가지 표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따라서 구절이나 구절, 또는 전체 수타는 neyattha, samuti, vohara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는 다른 수준의 진실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냐르타(팔리; 산스크리트어: nttartha), "명백한 의미"[10] 및 "네야르타"(팔리; 산스크리트어: neyartha), "추측할 수 있는 단어 또는 문장"입니다.[10]이 용어들은 추가 해석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텍스트나 진술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n'tattha 텍스트는 설명이 필요 없는 반면 neyattha 텍스트는 적절하게 [11]설명하지 않으면 일부 사용자를 오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타가타를 잘못 표현하고 있다.어떤 두 개?직접적 의미의 수타로서 간접적 의미의 수타를 나타내는 자, 간접적 [12]의미의 수타를 나타내는 자.
사무티(Pari; 산스크리트어: savvtiti)는 "공통의 동의, 일반의견, 관습"[13]을 의미하며, 파라마타(Paramatta; 산스크리트어: paramartha)는 "최종"을 의미하며, 은유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관습적 또는 상식적인 언어와 직접적으로 더 높은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vohara(팔리; 산스크리트어: vyavahara, 관습, 관습)라는 용어는 사무티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테라바다
테라바딘 논객들은 이러한 범주를 확장하여 표현뿐만 아니라 표현된 진실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최고의 스승인 '깨어난 자'는 두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관습과 더 높은 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습 때문에 틀에 박힌 진술은 사실이고 더 높은 진술은 [14]사건의 진정한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프라즈나프티바다
프라자프티바다 학파는 전통적인 (saṛv)ti)와 궁극적인 (paramartha) 진실의 구별을 취했고, 그 개념을 형이상학적-현상학적 구성 요소(dharma)로 확장하여 순수 개념적, 즉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prajapti)과 구별했다.
인도 대승 불교
마디아마카
두 진실 사이의 구별(satyadvayavibhaga)은 마디마카 [15]학파의 나가르주나(Nagarjuna, 150년경–c. 250 CE)에 의해 완전히 개발되었습니다.마디아미카는 로카-삼브리티-사티야, "세계 언어 진실" c.q. "상대적 [web 1]진실" c.q. "최후의 진실을 은폐하는 진실"[16]과 궁극의 [web 1]진실인 파라마르티카 사티야를 구별한다.
로카-삼브리티-사티야는 타티야-삼브리티 또는 로카-삼브리티, 미쓰야-삼브리티 또는 알로카-삼브리티,[17][18][19][20] "진짜 삼브리티" 및 "거짓 삼브리티"[20][web 1][note 1]로 더 나눌 수 있다.Tathya-samvrti 또는 "true samvrti"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며 감각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mithya-samvrti 또는 "false samvrti"[19][20][16][note 2][note 3]는 인식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한다.
나가르주나의 '물라마디아마카리카'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자기 [15]본성의 공허함(순야타)이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옹호한다.그러나 수냐타는 또한 "비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나가르주나의 "비어 있다"라는 주장은 수냐타가 더 높고 궁극적인 [25][26][note 4][note 5]현실을 구성하는 것을 방해한다.나가르주나의 견해는 "궁극적인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26]이다.Siderits에 따르면, 나가르주나는 전통적인 [26]진실만이 있다고 가정하는 "의미적 반 이중주의자"이다.Jay L. Garfield의 설명:
테이블과 같은 일반적인 엔티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우리는 그것을 분석하여 그것의 공허함을 증명하고, 그것의 부분들 외에 다른 테이블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공허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그러나 이제 그 공허함을 분석해보겠습니다.뭘 찾았지?테이블 고유의 존재[...]가 없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테이블을 빈 것으로 보는 것은 테이블을 일반적인 것으로,[25] 의존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가르주나의 물라마디아마카리가에서 두 가지 진리 원칙은 의존적 기원(프라테티아사무트파다)을 공허함(ūnyāā)으로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부처의 달마 가르침은 두 가지 진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속세의 진리와 궁극의 진리다.이 두 가지 진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처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전통적인 진리의 기초 없이는 궁극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없다.궁극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28]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가르주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8. 부처의 가르침은 두 가지 진리에 호소한다.
세상에서 굳어진 진실과 가장 높은 의미인 진실.
(9) 두 종류의 진리의 분포를 모르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의 심오한 "요점"을 모른다.
10. 가장 높은 진실의 감각은 실천적인 행동과 분리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최고의 감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열반을 [29]이해할 수 없다.
나가르주나는 카카야나고타 수타에 근거해 두 진실을 진술했다.'카카야나고타 수타'에서 부처는 카카야나 고타 승려에게 올바른 관점을 주제로 말하고 있으며, 허무주의와 영원주의 사이의 중간 길을 설명하고 있다.
대체로, 카카야나, 이 세계는 극성과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탱된다.그러나 세상의 기원을 올바른 안목으로 볼 때 세상에 대한 '부존재'는 일어나지 않는다.세상의 종말을 올바른 안목으로 볼 때,[30] 세계를 가리키는 「존재」는 일어나지 않는다.
차토파디아야에 따르면, 나가르주나는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해명으로 두 가지 진리에 대한 그의 이해를 제시하지만, 두 가지 진리의 원칙은 초기 불교 [31]전통의 일부가 아니다.
불교 관념론
요가카라
요가카라 불교는 삼성과 삼성을 구별한다.3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32][33]
- 파라마르티카(초월적 현실), 요가카라 문학에서는 Parinispanna라고도 합니다.외부 사물의 세계 외관을 담당하는 의식의 창고 수준. 그것은 유일한 궁극적인 현실이다.
- 파라탄트리카(의존적 또는 경험적 현실):일상 생활에서 경험적인 세계의 수준.예를 들어 snake-see-in-the-snake.
- Parikalpita(상상).예를 들면, 꿈속에서 뱀을 보는 것.
란카바타라 수트라
란카바타라경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상주의적인 방향을 틀었다.D. T. 스즈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스리랑카는 두 가지 형태의 지식을 갖는 데 있어 매우 명료하다. 하나는 절대적인 것을 파악하거나 마음만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논리가 우세하고 비지나나가 활동적인 이중적인 측면에서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후자는 스리랑카에서 차별(vikalpa)으로, 전자는 초월적 지혜 또는 지식(prajna)으로 불린다.이 두 가지 형태의 지식을 구별하는 것은 불교 철학에서 가장 필수적이다.
동아시아 불교
불교가 서기 1, 2세기에 간다라(현재의 아프가니스탄)와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중국의 문화와 이해에 적응했다.불교는 유교와 도교의[35][36][37] 영향을 받았다[34].중국 [38]불교에서는 신도교 개념이 계승되었다.자영(essung)과 이석(李石) 등의 개념이 화연([38]華 buddhism) 불교에 의해 계승되어 장(án)에 [39]깊은 영향을 미쳤다.
두 가지 진실의 원칙은 또 다른 혼란의 지점이었다.중국인의 사고방식은 이를 두 가지 존재론적 진실, 즉 상대적인 수준과 [3]절대적인 수준의 현실이 존재한다고 본다.처음에 도교인들은 선야타를 도교의 [40]비존재와 비슷하다고 오해했다.마디아마카에서 두 가지 진실은 두 가지 인식론적 진실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방식입니다.중국인들은 대하야나 대하파리나르바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의 가르침이 그 경전처럼 마지막 불교 가르침이며 선야타와 두 가지 [4]진리 위에 본질적인 진실이 있다고 추정했다.
화옌 불교
화양파는 당나라 때 중국에서 번성했던 대승불교 철학의 전통이다.그것은 산스크리트 꽃 갈랜드 수트라(S. Avatassaka Sutra, C.)에 바탕을 두고 있다.화얀징)과 그에 대한 긴 중국 해석에 대한 화얀룬.플라워 가랜드라는 이름은 깊은 이해의 최고의 영광을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얀파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공헌은 형이상학 분야였다.그것은 인드라의 그물에서 표현된 것처럼 모든 현상의 상호 억제와 상호 침투의 교리를 가르쳤다.하나는 기존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은 하나의 것을 포함합니다.
불교 철학에 대한 이 접근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실(또는 현실)은 거짓(또는 환상)을 포괄하고 상호 침투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 선은 악을 포괄하고 상호 침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마찬가지로, 공허에 대한 깨달은 이해(불교 철학자 나가르주나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에서 모든 마음먹은 구별은 "충돌"로 이해된다.
Huayan은 4대 다르마드하투에게 현실을 보는 4가지 방법을 가르친다.
- 모든 다르마는 특정 개별 이벤트로 간주된다.
- 모든 사건은 절대자의 표현이다.
- 이벤트와 본질은 상호 침투한다.
- 모든 이벤트는 [41]상호 침투합니다.
Zen의 절대적 상대적
선의 가르침은 일련의 극성으로 표현됩니다.부처의 본성 - 선야타,[42][43] 절대 상대적인,[44] 갑작스럽고 점진적인 깨달음.[45]
Prajnaparamita Sutras와 Madhyamaka는 형태와 공허의 비이중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장경에서 [44]말하는 것처럼 형태는 공허함, 공허함은 형식입니다.현실의 궁극은 상대적인 현실의 일상에 존재한다는 사상은 속세와 사회를 중시하는 중국 문화에 들어맞는다.그러나 이것은 절대자가 상대 세계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토산[46] 오계나 소목화 같은 도식이다.
한국불교의 본질적 기능
절대 및 상대 극성은 "에센스 함수"로도 표현됩니다.절대적인 것은 본질이고 상대적인 것은 기능이다.서로 다른 현실로 볼 수는 없지만 서로 관통하는 거죠이 구별은 "neng-so"나 "주체-object" 구조 같은 다른 프레임워크는 제외하지 않지만,[47] 두 개의 개념은 "사고 방식에서 완전히 다르다".
한국 불교에서 본질적 기능은 "신체"와 "신체의 기능"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리고 한국 대중이 더 잘 알고 있는) 더 정확한 정의는 "신체"와 "신체의 기능"이다."진지/기능"과 "본문/기능"의 의미는 유사하다. 즉, 두 패러다임은 두 [48]개념 사이의 이중적이지 않은 관계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에센스 기능의 은유로는 「램프와 그 빛」이 있습니다.이것은 플랫폼 수트(Platform Sutra)의 한 구절입니다.에센스는 램프, 기능은 [49]라이트입니다.
티베트 불교
닝마
닝마족의 전통은 티베트 불교의 4대 종파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그것은 8세기에 불교 경전을 산스크리트어에서 티베트어로 번역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Ju Mipham (1846–1912)은 샨타락시타의 마디아말라카라에 대한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50]
오랜 시간 두 진리의 결합을 통해 수련하면 태초의 지혜에 부합하는 수용의 단계(가입의 길)가 올 것이다.이렇게 지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어떤 확신을 얻고, 그 안에서 훈련함으로써 결국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이것이 바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말하는 [51][note 6]해방의 길입니다.
샨타락시타의 마디아마라 카라의 미팜 주석의 다음 문장은 네 극단(mtha'-bzhi)의 부재와 비이중 또는 불가분의 두 진실(bden-pa dbyer-med)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초기 번역의 학식과 달인들은 이 4극 이상의 단순함, 즉 두 진리가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방식을 그들만의 완벽한 [52][note 7]방법으로 여겼다.
조첸
조겐은 두 가지 진실이 결국 살아있는 경험으로서 비이중성으로 해결되고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른 전통에 대한 이해
자이나교
아네칸타바다(산스크리트어: ने् " " " " " ", "다면성")는 고대 인도에서 나타난 형이상학적 진리에 대한 자인 교리를 말한다.[1] 궁극의 진실과 현실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2] 아네칸타바다는 또한 테러 공격과 집단 폭력으로 이어지는 광신도 배척뿐만 아니라 비압축주의, "지적 아힘사", [3] 종교적 다원주의, [4]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어 왔다.
아네칸타바다의 기원은 제24대 자인 트르탕카라인 마하보라 (기원전 599–527년)의 가르침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10] 샤다다 "조건부 시점"과 나야바다 "부분적 시점"의 변증법적 개념은 중세 아네칸타바다에서 생겨났으며, 자이나교에 보다 상세한 논리적 구조와 표현을 제공했다.
자인 철학자 쿤다쿤다는 진리의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합니다.
- vyavaharanaya 또는 '비교적 관점'
- 니치카야나야 또는 '원근법'으로, '원근법'과 '순근법'[54]이라고도 불린다.
쿤다쿤다에게 있어서, 진리의 세속적인 영역은, 업보가 작용하고, 사물이 출현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소멸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대적인 관점이기도 하다.한편, 궁극적인 관점은 "불쾌하고, 활기차고, 통찰력 있고, 전지적"[55]인 해방된 지바의 관점이다.
어드바이타 베단타
Advaita는 Madhyamika로부터 [56]현실의 수준을 이어받았다.보통 두 가지 수준이 [57]언급되지만, 샹카라는 서브플레이션을 3가지 [58][web 3][note 8]수준의 존재론적 계층을 가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 파라마르타(Paramarthika, absolute)는 절대 수준이며, "절대 현실이며 다른 두 가지 현실 수준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web 3]이다.이 경험은 다른 어떤 [58]경험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 Vyavaharika (vyavahara) 또는 samvriti-satya[57] (경험적 또는 실용적), "우리의 경험의 세계, 우리가 [web 3]깨어있을 때 매일 다루는 경이로운 세계"지바(생물과 개인의 영혼)와 이스와라(Iswara)가 모두 참인 수준이며, 여기서 물질세계도 참이다.
- 프라티바시카(프라티바시카, 명백한 현실, 비현실), "상상만으로 이루어진 [web 3]현실"그것은 뱀이 밧줄에 걸려 넘어가는 듯한 착각이나 꿈과 같이 겉모습이 실제로 거짓인 수준이다.
무마사 두 가지 진실의 반박
챗토파디아야는 8세기 무샤 철학자 쿠마릴라 바샤가 그의 Shlokavartika에서 [60]두 가지 진실 원칙을 거부했다고 지적한다.Bha wasa는 이러한 의식에 대한 중세 불교계의 거부로부터 베다 의식에 대한 그의 방어에 큰 영향을 끼쳤다.어떤 사람들은 그의 생전부터 [62]불교가 쇠퇴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기 때문에 그의 영향이 인도[61] 불교의 쇠퇴에 기여했다고 믿는다.쿠마릴라에 따르면, 두 가지 진리 원칙은 "객관 세계의 무(無) 이론"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숨기는 이상주의 원칙이다.
[O]ne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후자만 진실이고 전자는 거짓이다.그러나 이상주의자는 이것을 할 여유가 없다.하지만 그는 '두 가지 진실'에 대해 말할 의무가 있다.[60][note 9]
피로니즘과의 대응
| 시리즈의 일부 |
| 피로니즘 |
|---|
 |
| |
맥데블리는 그리스 피로니즘과 마디아미카 교리의 대응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Sextus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 [T] 현실과 현실을 판단하는 모자
- [T] 일상생활에서 가이드로 사용하는 것.
첫 번째 기준에 따르면, 어떠한 것도 참이거나 거짓이 아니다. [I]현상의 직접적인 관찰에 기초한 비전도적 진술은 일상적인 실제적인 결정을 내릴 목적으로 참 또는 거짓으로 취급될 수 있다.
콩제가[64]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구별은 "절대적 진실" (파라마르타사티아), "어떤 [65]왜곡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지식" 그리고 "진실" (사비티 사티아), "통상적으로 [65][66]통용어로 믿어지는 진실" (사비티 사티아) 사이의 마디아미카의 구별과 같다.
따라서 필로니즘에서 "절대적 진실"은 신개념에 해당하고 "관습적 진실"은 환상에 해당된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메모들
- ^ Lal Mani Joshi에 따르면, 마디아마카의 Svattantrikasub school의 설립자인 바비베카(6세기)는 삼브르티를 타티아-삼브르티와 미티아-삼브르티로 [17]분류했다.마디아마카의 프라사지카 서브스쿨의 주요 지지자 중 하나인 칸드라쿠르티(7세기)는 삼브르티를 로카-삼브르티와 알로카-삼브르티로 [17][18]나누었다.샨티데바 (8세기)와 그의 해설가 프라즈냐카라마티 (950-1030[web 2])는 둘 다 타티야-삼브르티와 [19][20]미티야-삼브르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8세기의 영향력 있는 미맘사 철학자인 쿠마릴라 바샤는 마디아마카 철학을 언급할 때 로카-삼브르티와 알로카-삼브르티라는 용어를 [16]사용하기도 한다.무르티는 그의 불교 중앙철학에서 알로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미쓰야 삼브르티라는 동의어를 [21]언급한다.
Murti: "이것을 '로카 삼브르티'라고 부르는 것은, "알로카"라는 어떤 외모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 비경험적,[21] 즉, 심지어 엠프리컬한 의식에도 잘못된 것입니다."
David Seyfort Rueg는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세계적인 용법에서의 samvrti는 lokasamvrti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알로카삼vrti를 구별하는 실질적인 목적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인 현실의 관점에서 둘 다 비현실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로카삼브르티를 디스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ct '세상이 아니다'(alokah)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고려할 때, 그들은 감각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따라서 일반적인 세속적 [22]합의에 속하지 않는다) 거짓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 마디마카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설명은 뱀에 대한 인식이다.실제 뱀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타티아-삼브르티입니다.반면 뱀으로 잘못 인식된 밧줄은 미쓰야삼보르티다.궁극적으로 둘 다 거짓이지만, "뱀이 본 줄"은 "뱀이 본 줄"보다 덜 진실하다.이것은 타티아-삼브르티가 미티아-삼브르티 위에 [web 1][16]있는 인식론적 위계를 제공한다.타티야-삼브르티와 미티야-삼브르티를 구별하기 위해 마디마카 문헌에 제시된 또 다른 예는 "수영장에서 본 물"(loka samvriti)이다. "미라지에서 본 물"(aloka samvriti)이다.
- ^ Mithya-samvrti 또는 "false samvrti" 캠은 또한 "untruth"[web 1]인 아사티아로 주어진다.찬도야 우파니샤드 6.15.3에서 브라흐만은 사티아이고, 리처드 곰브리치는 부처에 따르면 "[23]존재하지 않는 것"인 소우주 및 거시세계의 우파니샤드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피터 하비를 비교하세요.또, Atiaa씨도, 「이 모든 것이 애초에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것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안팎의 모든 현상이 [24]다 그렇다.
- ^ Susan Kahn, 불교의 두 가지 진리와 공허함을 참조하십시오.
- ^ 어떤 사람들은 파라마르티카 사티야 또는 "궁극적 진실"을 형이상학적 "절대적" 또는 "산만한 [26]이성의 능력을 초월하는 피할 수 없는 궁극적"으로 해석했다.예를 들어 신간교적 해석을 [27]한 T.R.V. 무르티(1955)는 불교 중심철학이다.
- ^ "원시의 지혜"는 "지적 지식을 능가하는 것"은 (다르마타)의 직접적인 인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확신"은 믿음의 윤기(raddha)로 이해될 수 있다.두 가지 진실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의 렌더링인 "연합"의 효과적인 유사점은 상호 침투이다.
- ^ Padmakara Translation Group의 Blankleder와 Fletcher는 약간 다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번역학파의 학식과 숙달된 거장들은 4극단의 모든 개념적 구성으로부터의 자유, 즉 분리할 수 없는 [53]두 진리의 궁극적인 현실을 스테인리스로 받아들인다." - ^ Chattopadhya에 따르면 Advaita Vedantist는 궁극적인 진실을 위해 paramarta-satya 또는 parmarthika-satya라는 용어를 유지하고 있으며, Madhyamakas의 loka samvriti는 vyahvarika saty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aloka samvriti는 [59]pratibhasik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 Kumarila Bhaṭa: "이상주의자는 '명백한 진실' 또는 '실용 생활의 잠정적 진실'을 그의 용어로 삼브리티 사티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하지만, 그의 견해로는, 이 명백한 진실에는 정말로 진실이 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어떤 특별한 진실의 브랜드로 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거기에 진실이 있는데 왜 거짓이라고 하겠어?그리고 그것이 정말 거짓이라면, 왜 그것을 진실이라고 부를까요?진실과 거짓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불리는 요소는 둘 다에 공통으로 속할 수 없다. 나무와 사자 모두에게 속할 수 있는 '트림리스'라고 불리는 공통 요소만큼 서로 배타적이다.이상주의자 자신의 가정에 따르면, 이 '명백한 진실'은 '거짓'의 동의어에 불과하다.그럼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요?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그것은 말장난의 목적이다.그것은 거짓을 의미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뭔가 다른 것을 암시할 정도로 현학적인 태도를 띠고 있다.이것은 사실 잘 알려진 속임수이다.따라서 현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타액을 의미하는 단순한 단어 lala 대신 vaktrasava(말 그대로 입술을 핥는 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그런데 왜 이런 현학적인 분위기일까요?왜 단순히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진실'이나 '삼브리티'에 대한 말장난일까?이 samvriti를 구상하는 목적은 단지 객관적인 세계의 무(無) 이론의 부조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사물이 그렇지 않을 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상상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그러므로, 그런 말 장난을 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즉,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존재하는 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후자만 진실이고 전자는 거짓이다.그러나 이상주의자는 이것을 할 여유가 없다.그는 무의미하지만 두 가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60]
레퍼런스
- ^ a b c d e f g Matilal 2002, 페이지 203-208.
- ^ a b c d e Thakchoe, Sonam (Summer 2022). "The Theory of Two Truths in Tibet". In Zalta, Edward N. (ed.).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The Metaphysics Research Lab,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anford University. ISSN 1095-5054. OCLC 643092515.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8 May 2022. Retrieved 5 July 2022.
- ^ a b 라이 2003, 페이지 11
- ^ a b Lai 2003.
- ^ 하비 2012, 50페이지
- ^ a b c A. A. Macdonell, 산스크리트 영어사전, 아시아교육서비스, ISBN 978-8120617797, 페이지 330-331
- ^ 산스크리트 영어사전
- ^ 독일 쾰른 대학교 야마에 모니에 윌리엄스의 산스크리트 영어 사전
- ^ Levinson, Jules (2006년 8월) Lotsawa Times Volume II 2008년7월 24일 Wayback Machine에서 아카이브 완료
- ^ a b 모니어 윌리엄스
- ^ McCagney: 82
- ^ 앙구타라 니카야 I:60 (야티유케:361, 매캐그니:82)
- ^ PED
- ^ 카타바투 아하 카스(Jayatilleke: 363, McCagney: 84)
- ^ a b 가필드 2002, 페이지 91
- ^ a b c d 챗토파디아야 2001, 페이지 103~106.
- ^ a b c 조시 1977, 페이지 174
- ^ a b 나카무레 1980, 페이지 285
- ^ a b c 1930년 듀트
- ^ a b c d 슈처바츠키 1989, 페이지 54
- ^ a b 머티 2013, 페이지 245
- ^ 세이포트 루그 1981, 74-75페이지
- ^ 곰브리치 1990, 페이지 15
- ^ Brunholzl 2004, 페이지 295
- ^ a b 가필드 2002, 페이지 38-39
- ^ a b c d 2003년 사이들릿.
- ^ 웨스터호프 2009, 페이지 9
- ^ 나가르주나, 물라마디아마카리카 24:8~10. 제이 L. 가필드 중도의 기본 지혜: 페이지 296, 298
- ^ 2005년 2월 8일 Wayback Machine에 보관된 Mulamadhyamakarrika Version 24
- ^ 출처 : Kachayanagotta Sutta on Access to Insight (접근처: 2008년 1월 2일)2006년 5월 11일 Wayback Machine에서 아카이브 완료
- ^ 챗토파디아야 2001, 페이지 21-3,94,104.
- ^ S.R. Bhatt & Anu Meherotra (1967). Buddhist Epistemology. p. 7.
- ^ Debiprasad Chattopadhyaya (2001).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Indian Philosophy 5th edition. p. 107.
- ^ 1995년 브라운 홀트.
- ^ Goddard 2007, 페이지 10
- ^ Verstappen 2004, 페이지 5
- ^ 파울러 2005, 페이지 79
- ^ a b 2000년.
- ^ Dumoulin 2005a, 페이지 45-49.
- ^ 라이 2003, 8페이지
- ^ Garfield & Edelglass 2011, 76페이지
- ^ Kasulis 2003, 페이지 26-29.
- ^ McRae 2003, 페이지 138–142.
- ^ a b 량제 1986, 페이지 9
- ^ McRae 2003, 페이지 123–138.
- ^ 카술리스 2003, 페이지 29
- ^ 박성배(1983년).불교 신앙과 갑작스런 계몽.종교학계의 SUNY 시리즈.SUNY 프레스ISBN 0-87395-673-7, ISBN 978-0-87395-673-4.출처 : [1] (접근처:2010년 4월 9일 금요일) 페이지 147
- ^ 박성배(2009).불교에 대한 한국인의 접근법 중 하나는 엄마/맘짓 패러다임이다.한국학에서의 SUNY 시리즈: SUNY 프레스.ISBN 0-7914-7697-9, ISBN 978-0-7914-7697-0.출처 : [2] (접근처: 2010년 5월 8일 토요일), 페이지 11
- ^ 라이, 와렌(1979년)."잔 은유: 파도, 물, 거울, 램프"동서철학; 권29, 제3호, 1979년 7월, 245~253페이지.출처 : [3] (출처 : 2010년 5월 8일 (토)
- ^ 루트 텍스트의 쿼트레인/로카 72의 첫 번째 짝에 대한 주석(725–788) - 블루멘탈, 제임스(2008)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2008년 겨울판), 에드워드 N. 잘타(ed.출처: [4] (접근처:Padmakara 번역 그룹에 의해 영어로 번역된 2009년 2월 28일(2005년: 페이지 304)
- ^ Shantarakshita (저자), Ju Mipham (코멘테이터), Padmakara Translation Group (번역자) (2005)중도의 장식: 샨타라크시타의 마디아마칼란카라와 잠곤 미팜의 해설.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샴발라 출판사ISBN 1-59030-241-9 (토크 페이퍼), 페이지 304
- ^ 닥터, 토마스 H. (트랜스)Mipham, Jamgon Ju. (저자) (2004) 기쁨의 연설: 미팜의 샨타락시타의 중도의 장식 해설.이타카: 스노우 라이온 출판물.ISBN 1-55939-217-7, 127페이지
- ^ Shantarakshita (저자), Mipham (코멘테이터), Padmakara Translation Group (번역자) (2005)중도의 장식: 샨타라크시타의 마디아마칼란카라와 잠곤 미팜의 해설.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샴발라 출판사ISBN 1-59030-241-9 (토크 페이퍼), 137페이지
- ^ 길어요, 제프리; 자이나교:소개, 126페이지.
- ^ 길어요, 제프리; 자이나교:소개, 126페이지.
- ^ Renard 2004, 페이지 130
- ^ a b Renard 2004, 페이지 131
- ^ a b Puligandla 1997, 232페이지
- ^ Debiprasad Chattopadhyaya (2001).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Indian Philosophy 5th edition. pp. 107, 104.
- ^ a b c Debiprasad Chattopadhyaya (2001).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Indian Philosophy 5th edition. pp. 370–1.
- ^ 쉐리단 1995, 198-201페이지
- ^ 샤르마 1980, 페이지 5~6
- ^ Sextus Empericus, Phyrhonism의 개요, II.14-18; Anthologia Palatina(Palatine Anthology), VII. 29-35 및 기타
- ^ Conze 1959, 140-141페이지)
- ^ a b Conze (1959: 페이지 244)
- ^ McEvilley, Thomas (2002). The Shape of Ancient Thought. Allworth Communications. ISBN 1-58115-203-5., 페이지 474
원천
공개된 소스
- Brown Holt, Linda (1995), "From India to China: Transformations in Buddhist Philosophy", Qi: The Journal of Traditional Eastern Health & Fitness
- Brunholzl, Karl (2004), Center of the Sunlit Sky, Snowlion
- Chattopadhyaya, Debiprasad (2001),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Indian Philosophy (5th ed.), People's Publishing House
- Conze, Edward(1959)불교: 그 본질과 발전.뉴욕, 미국: 하퍼 앤 로우.
- Dumoulin, Heinrich (2005a), Zen Buddhism: A History. Volume 1: India and China, World Wisdom Books, ISBN 978-0-941532-89-1
- Dutt, Nalinaksha (1930), "The Place of the Aryasatyas and Pratitya Sam Utpada in Hinayana and Mahayana", Annals of the Bhandarkar Oriental Research Institute, 6 (2): 101–127
- Fowler, Merv (2005), Zen Buddhism: Beliefs and Practices, Sussex Academic Press
- Garfield, Jay (2002), Empty Words: Buddhist Philosophy and Cross-cultural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Garfield, Jay L.; Priest, Graham (2003), "Nagarjuna and the Limits of Thought" (PDF), Philosophy East & West, 53 (1): 1–21, doi:10.1353/pew.2003.0004, hdl:11343/25880, S2CID 16724176
- Garfield, Jay L.; Edelglass, William (2011), The Oxford Handbook of World Philosophy, ISBN 9780195328998
- 겟힌, 루퍼트.불교의 기초. 페이지 207, 235~245
- Goddard, Dwight (2007), History of Ch'an Buddhism previous to the times of Hui-neng (Wie-lang). In: A Buddhist Bible, Forgotten Books
- Gombrich, Richard (1990), "recovering the Buddha's Message" (PDF), in Ruegg, D.; Schmithausen, L. (eds.), Earliest Buddhism and Madhyamaka, BRILL[영구 데드링크]
- Harvey, Peter (2012), An Introduction to Buddhism: Teachings, History and Practi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yatilleke, K.N. 초기 불교 지식 이론조지 앨런 앤 언윈, 1963년
- Joshi, Lal Mani (1977), Studies in the Buddhistic Culture of India During the Seventh and Eighth Centuries A.D., Motilal Banarsidass Publ.
- Kasulis, Thomas P. (2003), Ch'an Spirituality. In: Buddhist Spirituality. Later China, Korea, Japan and the Modern World; edited by Takeuchi Yoshinori, Delhi: Motilal Banarsidass
- Keown, Damien.불교 사전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2003
- Liang-Chieh (1986), The Record of Tung-shan, William F. Powell (translator), Kuroda Institute
- Lai, Whalen (2003), Buddhism in China: A Historical Survey (PDF)
- Matilal, Bimal Krishna (2002). Ganeri, Jonardon (ed.). The Collected Essays of Bimal Krishna Matilal, Volume 1.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Reprint). ISBN 0-19-946094-9.
- 로페즈, 도널드 S., "스바탄트리카의 연구", 스노우 라이온 출판사, 1987, 192–217페이지.
- 맥캐그니, 낸시개방의 철학Rowman and Littlefield, 1997년
- McRae, John (2003), Seeing Through Zen, The University Press Group Ltd, ISBN 9780520237988
- 모니에르-윌리엄스, 모니에르, 로이만, 에른스트, 카펠러, 칼(1899).어원 및 언어학적으로 동족 인도유럽어족 언어인 옥스퍼드어:클라렌던 프레스
- Murti, T R V (2013).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 A Study of the Madhyamika System. Routledge. ISBN 978-1-135-02946-3.
- Nakamure, Hajime (1980), Indian Buddhism: A Survey with Bibliographical Notes, Motilal Banarsidass Publ.
- Newland, Guy(1992)두 가지 진리: 티베트 불교의 게룩바 종단의 마디아미카 철학에서.이타카, 뉴욕, 미국: 스노우 라이온 출판물.ISBN 0-937938-79-3
- Oh, Kang-nam (2000), "The Taoist Influence on Hua-yen Buddhism: A Case of the Scinicization of Buddhism in China", Chung-Hwa Buddhist Journal, 13
- Puligandla, Ramakrishna (1997), Fundamentals of Indian Philosophy, New Delhi: D.K. Printworld (P) Ltd.
- Renard, Gary (2004), The Disappearance of the Universe, Carlsbad, CA, US: Hay House
- Seyfort Ruegg, David (1981), The Literature of the Madhyamaka School of Philosophy in India, Otto Harrassowitz Verlag
- Sharma, Peri Sarveswara (1980), Anthology of Kumārilabhaṭṭa's Works, Delhi, Motilal Banarsidass
- Sheridan, Daniel P. (1995), "Kumarila Bhatta", in McGready, Ian (ed.), Great Thinkers of the Eastern World, New York: Harper Collins, ISBN 0-06-270085-5
- Siderits, Mark (2003), "On the Soteriological Significance of Emptiness", Contemporary Buddhism, 4 (1): 9–23, doi:10.1080/1463994032000140158, S2CID 144783831
- Stcherbatsky, Theodore (1989), Madhyamakakārikā, Motilal Banarsidass Publ.
- Suzuki, Daisetz Teitaro (1932), The Lankavatara Sutra, A Mahayana Text, Routledge Kegan Paul
- Verstappen, Stefan H. (2004), Blind Zen, ISBN 9781891688034
- Westerhoff, Jan (2009), Nagarjuna's Madhyamaka: A Philosophical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Wilber, Ken (2000), Integral Psychology, Shambhala Publi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