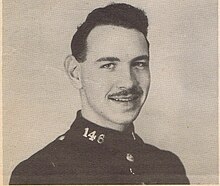유도 문제
Problem of induction| 다음에 대한 시리즈 일부 |
| 인식론 |
|---|
| 핵심개념 |
| 구분 |
| 사상의 학교 |
| 주제 및 보기 |
| 전문조회영역 |
| 저명한 인식론자 |
| 관련분야 |
유도의 문제는 고전적인 철학적 의미에서 이해되는 지식의 성장, 즉 단순한[1] 관찰의 집합 이상의 지식, 특히 다음에 대한 명백한 정당성의 결여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것이 정당화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다.
- 특정 클래스의 특정 인스턴스(instance)에 대한 일부 관측치를 기반으로 개체 클래스의 속성에 대해 일반화(예: 검은색 백조가 발견되기 전 "우리가 본 백조는 모두 흰색이며, 따라서 백조는 모두 흰색"이라는 추론) 또는
- 미래에 일련의 사건들이 항상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한다(예를 들어 물리 법칙이 항상 지켜왔던 것처럼 유지될 것이다). 흄은 이것을 자연의 균일성의 원리라고 불렀다.[2]
전통적인 유도론적 견해는 일상 생활에서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주장된 경험적 법칙이 어떤 형태의 추론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철학자들이 그러한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제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C. D. Broad는 유도론적 견해를 과학적인 견해로 파악하면서 "유도는 과학의 영광이며 철학의 추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는 귀납적 정당화는 결코 과학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신 과학은 가설을 추측하고, 연역적으로 결과를 계산한 다음, 실증적으로 그것들을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절차에 기초한다고 제안했다.
비록 귀납적 정당화가 이미 헬레니즘 철학의 피루니스트 학파와 고대 인도 철학의 카르바카 학파에 의해 유도의 문제를 조명하는 방식으로 반론되었지만 오늘날 문제로 알려진 것의 원천은 18세기 중반 데이비드 흄에 의해 제안되었다.
문제의 공식화
귀납적 추리에서는 일련의 관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장을 주입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 8시에 한 여성이 그녀의 개를 데리고 시장 옆을 지나갔다는 일련의 관찰로부터, 다음 주 월요일에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추론, 또는 일반적으로 그 여자는 매주 월요일마다 그녀의 개를 데리고 시장 옆을 지나다닌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옆을 지나는 여성은 단지 일련의 관찰을 더했을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매주 월요일 시장 옆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우선 관찰 횟수와 관계없이 여성이 월요일 오전 8시에 항상 시장 옆을 지나다니는 것은 확실치 않다. 사실, 데이비드 흄은 심지어 우리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전히 과거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가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관찰 자체는 귀납적 추론의 타당성을 확립하지 않는다. 베르트랑 러셀은 <철학의 문제들>에서 이 점을 예시했다.
가축들은 보통 먹이를 주는 사람을 보면 먹이를 기대한다. 우리는 획일성에 대한 다소 조잡한 이 모든 기대는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생을 통하여 매일 닭에게 먹이를 준 사람이 마침내 목을 비틀어, 자연의 균일성에 관한 보다 세련된 시각이 닭에게 유용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고대 및 초기 근대적 기원
피러니즘
| 다음에 대한 시리즈 일부 |
| 피러니즘 |
|---|
 |
| |
피루니스트 철학자 젝투스 엠피리쿠스의 작품에는 귀납 추론의 타당성에 대한 가장 오래된 생존 의문점이 담겨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3]
나는 또한 유도 방법을 따로 두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도를 통해 세부사항으로부터 보편성을 확립할 것을 제안할 때, 그들은 전체 또는 일부 특정 사례의 검토에 의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것을 검토한다면, 유도는 불안할 것이다. 유도에 누락된 몇몇 세부사항들은 보편적인 것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들이 모든 것을 검토한다면, 그들은 불가능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세부사항들은 무한하고 무기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생각에, 그 결과는 유도가 무효화된 것이다.
위의 구절에서 존재하는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간격에 초점을 맞춘 것은 흄이 유도의 순환 추론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와인트라우브는 《철학적 분기[4]》에서 젝투스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다르게 보이지만 흄의 접근방식은 사실 [5]젝투스가 제기한 또 다른 주장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스로 진실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실의 기준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판사의 승인이 없거나 승인이 난 것이다. 하지만 승인 없이 있다면, 언제 그것이 진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승인하는 것은, 차례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되지 않았다, 광고 infinitum 등.
기준 논거는 추론과 유도에 모두 적용되지만, 웨인트라우브는 젝투스의 주장이 "정확히 흄이 유도에 대해 제기하는 전략이다. 귀납적 정당성은 순환적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녀는 "Hume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유도의 정당성이 추론의 정당성과 유사하지 않다는 가정"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녀는 흄이 추론의 타당성에 대한 묵시적 제재에 대한 논의로 끝을 맺는데, 흄은 이를 현대의 근본주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인도 철학
인도 철학의 물질주의적이고 회의적인 학파인 카르바카는 추론을 유효한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의 결함을 지적하기 위해 유도 문제를 이용했다. 그들은 추론이 중기와 술어사이의 불변적 연결고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불변적 연결고리를 확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효한 지식의 수단으로서 추론의 효력은 결코 명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6][7]
9세기 인도의 회의론자인 자야라시 바타 역시 모든 지식의 수단과 함께 추론에 대한 공격을 가했고, 특정한 경우를 관찰하여 보편적인 관계를 맺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일종의 환원론적 논법으로 보여주었다.[8][9]
중세 철학
알-가잘리, 오캄의 윌리엄 같은 중세 작가들은 이 문제를 신의 절대 권력과 연결시켜, 신이 기적적으로 그 반대를 야기할 수 있을 때 세계가 예상대로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10] 그러나 Duns Scotus는 한정된 수의 세부사항에서 보편적인 일반화에 이르는 귀납적 추론은 "영혼 속에 놓여 있는 명제, 자유롭지 못한 대의에 의해 아주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것은 그 원인의 자연적인 영향"이라고 주장했다.''[11] 17세기 일부 예수교 신자들은 비록 신이 세상의 종말을 어느 순간에도 창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드문 사건이며, 따라서 그러한 일이 곧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자신감은 대체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12]
데이비드 흄
계몽주의 시대의 스코틀랜드 사상가인 데이비드 흄은 유도와 관련된 철학자다. 유도 문제의 그의 공식화는 인간 이해에 관한 조사, §4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흄은 '사상관계'와 '사실관계'의 유명한 구별을 소개한다. 사상관계는 연역논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 명제로서 기하학이나 대수학 등의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사실의 문제는 연역논리의 작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검증된다. 구체적으로는 반복적으로 관찰된 경험에 의한 원인과 영향에 대해 추론을 함으로써 사실의 문제를 확립한다. 관념의 관계는 이성만으로 뒷받침되지만, 사실의 문제는 경험을 통한 인과관계의 연결에 의존해야 한다. 효과의 원인은 선험적 추론을 통해 연결될 수 없고, '자연 균일성'에 의존하는 '필요한 연관성'을 내세움으로써 연결될 수 있다.
흄은 원인과 결과의 본질에 대한 그의 더 큰 논의 안에 인간 본성의 논문에서 유도 문제에 대한 그의 소개를 배치한다(Book I, Part III, Section VI). 그는 추리만으로는 인과관계의 근거를 확립할 수 없다고 쓰고 있다. 대신 인간의 정신은 두 물체 사이의 연관성을 반복적으로 관찰한 후 현상에 인과관계를 귀속시킨다. 흄에게 있어서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확립하는 것은 추리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 경험 전반에 걸쳐 "일관적인 접속사"를 관찰하는 것에 의존한다. 이 토론에서 흄은 "인간의 자연에 관한 논문"에서 유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공식화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예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예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실증적 논쟁도 있을 수 없다"고 썼다.
즉, 유도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틀에 박힐 수 있다:우리는 보다 일반적인 관측 집합에 대해 특정 관측 집합에 대한 결론을 적용할 수 없다. 연역논리는 결론에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반면 귀납논리는 아마도 사실일 수 있는 결론만을 제공할 수 있다.[non-primary source needed] 연역적 논리와 귀납적 논리의 차이를 일반적 논리와 특정적 논리의 차이와 일반적 추리에 특유한 논리로 프레임을 짜는 것으로 오인된다. 이것은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의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오인이다. 논리학의 문자적 기준에 따르면, 연역적 추론은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반면 귀납적 추론은 가능한 결론에 도달한다. 유도의[non-primary 공급원이 필요하]흄의 치료제로 그는 A인성론은( 서 나는, PartIII, 섹션 VI)"사이에 우리가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우리가 누린 개체 되는 none 확률은 유사성의 추정에 따른 것이다"에 쓰여 있어요 확률에 근거를 확립하는 것을 돕는다.[non-primary 공급원이 필요하]
따라서 흄은 인과관계를 귀속시키는 바로 그 근거로서 유도를 확립한다. 한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특정 효과 집합이 특정 원인 집합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과 과거에 관찰된 연결과의 미래 유사성은 유도에 따라 달라진다. 유도는 과거 '효과 A1'과 '원인 A1'의 연관성이 반복적으로 관찰돼 '원인 A2'에 의해 '효과 A2'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이성만으로는 유도의 근거를 확립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흄은 유도는 반드시 상상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사람은 선험적 추론을 통해 귀납적 참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동으로 취하는 상상적 단계를 통해 귀납적 참조를 하는 것이다.
흄은 유도가 인간의 정신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에 도전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추론이 얼마나 선험적인 것이 아닌 귀납에 의존하는지를 좀더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는 향후 유도의 사용을 부정하지 않고 연역적 추론과 구별되며 인과관계의 근거에 도움이 되며, 그 타당성에 대해 보다 깊이 탐구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흄은 유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상가들과 논리학자들이 철학의 계속되는 딜레마로서 유도의 타당성을 주장하도록 촉구한다. 유도의 타당성을 확립할 때 핵심 쟁점은 귀납 추론을 명분 그 자체의 형태로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도가 정확하다고 증명된 과거의 많은 예를 지적함으로써 유도의 타당성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유형의 추론은 과거에 정확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미래에 귀납 추론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유도 자체에 의존한다. 즉, 유도에 대한 과거 관찰이 유효하다는 것은 유도에 대한 미래 관찰도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유도 문제에 대한 많은 해결책은 순환적인 경향이 있다.
넬슨 굿맨의 새로운 유도 수수께끼
넬슨 굿맨의 팩트, 픽션, 그리고 예측은 "유도의 새로운 수수께끼"라는 장에서 유도 문제에 대한 다른 설명을 제시했다. Goodman은 새로운 술어 "grue"를 제안했다. 어떤 것은 만약 그것이 특정한 시간 이전에 녹색으로 관찰되었다면(또는 과학적인 일반 가설에[13][14] 따르면, 그렇게 될 경우)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관찰된다면 파란색이다. 유도의 "새로운" 문제는, 우리가 본 모든 에메랄드는 녹색과 연색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녹색은 찾을 수 있지만 연색 에메랄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같은 조건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인도가 진실과 거짓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다음과 같다.
- 많은 녹색 에메랄드들의 관찰에 비추어 볼 때,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누군가는 모든 에메랄드가 녹색이라는 것을 귀납적으로 유추할 것이다(따라서, 그는 시간 t가 지나도 그가 발견하게 될 어떤 에메랄드도 녹색일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 녹색 에메랄드에 대한 동일한 일련의 관찰을 감안할 때, 누군가가 "grue"라는 술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녹색 에메랄드만을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t 이후에 관측될 모든 에메랄드는 파란색일 것이라는 것을 귀납적으로 유추할 것이다.
오캄의 레이저를 이용하면, 그뤼함의 개념이 녹성의 개념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뤼도보다 녹색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굿맨은 "그루"라는 술어가 "녹색"이라는 술어보다 더 복잡하게 보일 뿐인데, 이는 우리가 푸른색과 녹색으로 그루를 정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우리가 항상 "회색"과 "블렌" (시간 t 전에 푸른색을 띠는 곳, 그리고 그 후에 초록색을 띠는 곳)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길러졌다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녹색"을 미쳤고 복잡한 술어로 생각할 것이다. 굿맨은 우리가 선호하는 과학적 가설은 어떤 술어가 우리 언어에 "진정한"가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W. V. O. Quine은 과학적인 가설에서 "자연적인 종류"(즉, 실제 사물의 실제 속성)를 식별하는 술어만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형이상학적 주장을 함으로써 이 문제에[15]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R. Bhaskar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그는 유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의 영원한 본성에 위치한 술어에 대한 이유의 가능성을 부정할 때에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16] 예를 들어, 우리는 모든 에메랄드가 초록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녹색 에메랄드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에메랄드의 화학적 구성이 반드시 초록색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그 구조를 바꾼다면, 그들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에메랄드는 녹색 베릴의 일종으로, 크롬의 미량이나 바나듐에 의해 녹색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미량 원소가 없다면, 그 보석들은 무색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해석
흄
비록 유도는 이성에 의해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고 그것으로부터 개선한다고 관찰한다. 그는 "이러한 의심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의 조사 제5조에 유도의 성격에 대한 서술적 설명을 제안한다. 위에서 설명한 귀납적 연결을 그리는 것은 관습이나 습관에 의한 것이며, "관습의 영향이 없다면 우리는 기억과 감각에 즉시 존재하는 것을 넘어 사실의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게 될 것이다."[17] 관습의 결과는 믿음인데, 그것은 본능적이고 상상력 자체보다 훨씬 강하다.[18]
데이비드 스토브와 도널드 윌리엄스
데이비드 스토브의 유도에 대한 주장은 통계적 삼단논법에 근거하여 '유도의 합리성'에 제시되었고, 스토브의 영웅 중 한 명인 고 도널드 캐리 윌리엄스(전 하버드 교수)가 저서 '유도의 근거'에서 제기한 주장에서 발전되었다.[19] 스토브는 (이 크기가 너무 작지 않은 한) 특정 크기의 가능한 하위 집합의 대다수가 그들이 속한 더 큰 인구와 유사하다는 것은 통계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까마귀 개체로부터 형성할 수 있는 3000마리의 까마귀가 포함된 하위 집합의 대부분은 개체 그 자체와 유사하다(그리고 이것은 까마귀 개체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무한하지 않은 한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스토브는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발견한다면, 이 부분집합이 인구와 유사한 부분집합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이 부분집합이 모집단을 합리적으로 가깝게 "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상황은 99%가 빨간색인 공 통에서 공을 끌어내는 것과 유사할 것이다. 이런 경우 당신은 빨간 공을 그릴 확률은 99%이다. 이와 유사하게, 까마귀의 샘플을 얻을 때, 그 샘플이 일치하거나 "대표적인" 샘플 중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표본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한, 아마도 (확실히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다.[20]
총알 깨물기: 키스 캠벨과 클라우디오 코스타
흄에 대한 직관적인 대답은 어떤 귀납적 절차에 접근할 수 없는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직관은 구축되려면 개념의 적용 대상의 일정한 연속성과 결과적으로 유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요구하는 개념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Keith Campbell에 의해 고려되었다.[21] 최근, 클라우디오 코스타는 미래가 그것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들 자신의 과거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미래는 그것의 과거와의 연결점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관련된 유사성이 더 크다. 따라서 – 흄 – 미래와 과거 사이의 동질성의 원칙(자주 또는 구조)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은 어떤 귀납적 절차를 항상 가능하게 할 것이다.[22]
카를 포퍼
과학철학자 칼 포퍼는 유도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23][24] 그는 과학은 유도를 사용하지 않으며, 유도는 사실 신화라고 주장했다.[25] 대신에 지식은 추측과 비판에 의해 만들어진다.[26] 그는 과학에서 관찰과 실험의 주된 역할은 기존 이론을 비판하고 반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27]
포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유도의 문제는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론이 유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포퍼는 명분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권위적인 답변에 대한 근거"를 찾고 있다. 대신, 포퍼는 해야 할 일은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8] 포퍼는 비판에서 살아남은 이론들이 비판의 양과 끈기에 비례하여 더 잘 확증된다고 여겼지만, 유도주의적인 지식 이론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clarification needed][29] 포퍼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이론을 추구하는 것은 지식 탐색과 상충되는 잘못된 목표라고 주장했다. 과학은 한편으로는 아마도 가장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이론들을 모색해야 하지만(그 이론들이 매우 위선적이어서 잘못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위선하려는 모든 실제적인 시도들은 지금까지 실패하였다(그 이론들은 매우 확증적이다).
웨슬리 C 연어는 실용적 목적과 이론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예측이 모두 필요하다는 이유로 포퍼를 비판한다. 이는 포페르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확정 이론의 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이론이다. 팝페리아인들은 확증이라는 의미에서 잘 꾸며진 이론을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딜레마에 직면한다: 그들은 과거에 비판에서 살아남은 이론이 미래에 믿을 만한 예측 변수가 될 것이라는 본질적인 귀납적 주장을 하고 있다. 아니면 팝페리아의 확증은 예측력의 지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선호하는 선택 원칙에는 합리적인 동기가 없다.[30]
데이비드 밀러는 연어 등의 이런 비판을 비판해 왔는데, 이는 유도주의적 가정을 하기 때문이다.[31] Popper는 확증이 예측력의 지표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측력은[according to whom?] 이론 자체에 있는 것이지 확증에는 있는 것이 아니다. 잘 짜여진 이론을 선택하는 이성적인 동기는 다음과 같이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꾸며진 실험은 적어도 한 종류의 실험(이미 한 번 이상 시행된 실험)이 하나의 이론을 조작(그러나 실제로 조작한 것은 아님)할 수 있는 반면, 동일한 종류의 실험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다른 하나의 이론을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잘 짜여진 이론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거짓이라면 결국 밝혀질 상반된 증거에 직면했을 때 제거하기가 더 쉽다. 따라서 확증을 이유, 즉 이론을 믿는 명분이나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이론에 찬성하는 주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32]
참고 항목
메모들
- ^ 비커스, 존 "유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 (Fall 2011 Edition), 에드워드 N. 잘타 (edd)
- ^ Hume, David (January 2006).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Gutenberg Press.#9662: 2007년 10월 16일 가장 최근 업데이트
- ^ 젝투스 엠피리쿠스 피루니즘의 개요, 제2권, 제15장 제204절 트랜스. 로버트 그레그 베리 (Loeb Ed.) (런던: W) 하인만, 1933), 페이지 283.
- ^ 와인트라우브, R.(1995) 흄이 유도 문제에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철학적 분기별 45(181):460–470
- ^ 젝투스 엠피리쿠스 로지컬과 맞서라, 트랜스. 로버트 그레그 베리 (Loeb Ed.) (런던: W) 하인만, 1935), 페이지 179
- ^ S. 라다크리쉬난 박사, 인도 철학 제 1권, 페이지 279
- ^ S. 다스굽타, 인도 철학의 역사, Vol III. 페이지 533
- ^ 피오트르 발세로비치, "자야라시"
- ^ Franco, Eli, 1987, 지각, 지식 및 불신: 자야라지의 회의론에 관한 연구
- ^ 프랭클린, J. (2001) 추측의 과학: 파스칼 이전의 증거와 가능성(볼티모어: 존스 홉킨스 대학 출판부), 232–233, 241.
- ^ 던스 스코투스: 철학적 글, 트랜스. A. 월터(Edinburg: 1962), 109–110; 프랭클린, 추측 과학, 206.
- ^ 프랭클린, 추측의 과학 223–224.
- ^ 굿맨, 넬슨. 팩트, 픽션, 예측 (제4판) 하버드 대학 출판부, 1983, p.74 "각각 모든 에메랄드는 그뤼라는 일반적인 가설을 확인할 것"
- ^ 굿맨의 원래 정의 그뤼
- ^ Willard Van Orman Quine (1970). "Natural Kinds" (PDF). In Nicholas Rescher; et al. (eds.). Essays in Honor of Carl G. Hempel. Dordrecht: D. Reidel. pp. 41–56. 재인쇄: Quine(1969),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5장.
- ^ Bhaskar, Roy (2008). A Realist Theory of Science. New York: Routledge. pp. 215–228. ISBN 978-0-415-45494-0.
- ^ 문의, 제5.1조.
- ^ 문의, 제5.2조.
- ^ Donald Cary Williams (1947). The Ground of Induction.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Donald Cary William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5. Retrieved 4 March 2017.
- ^ D. 스토브, 인덕션의 합리성, 클라렌던 프레스, 옥스포드, 1986, ch. 6.
- ^ 리처드 스윈번(ed)의 "유도에 대한 회의론" 한 가지 형태 인덕션의 정당성. 옥스퍼드, 1974년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 ^ 클라우디오 코스타: 철학적 의미론: 이론철학, 부록 V, CSP, 2018.
- ^ Karl Popper (1959).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pp. Ch. 1. ISBN 978-84-309-0711-3.
... the theory to be developed in the following pages stands directly opposed to all attempts to operate with the ideas of inductive logic.
- ^ Alan Saunders (15 January 2000). "A Portrait of Sir Karl Popper". The Science Show. Radio National. Retrieved 27 December 2007.
- ^ Karl Popper (1963). Conjectures and Refutations. p. 53. ISBN 978-0-06-131376-9.
Induction, i.e. inference based on many observations, is a myth. It is neither a psychological fact, nor a fact of ordinary life, nor one of scientific procedure.
- ^ Karl Popper (1963). Conjectures and Refutations. p. 53. ISBN 978-0-06-131376-9.
The actual procedure of science is to operate with conjectures: to jump to conclusions – often after one single observation
- ^ Karl Popper (1963). Conjectures and Refutations. p. 128. ISBN 978-0-06-131376-9.
Tests proceed partly by way of observation, and observation is thus very important; but its function is not that of producing theories. It plays its role in rejecting, eliminating, and criticizing theories
- ^ Karl Popper (1963). Conjectures and Refutations. p. 25. ISBN 978-0-06-131376-9.
I propose to replace ... the question of the sources of our knowledge by the entirely different question: 'How can we hope to detect and eliminate error?'
- ^ 과학 발견의 논리, 섹션 43
- ^ Wesley C. Salmon (1967). The Foundations of Scientific Inference. pp. 26.
- ^ Miller, David (1994). Critical rationalism: A restatement and defense. Chicago: Open Court.
- ^ 토머스 불레모어 "유도의 실용적 문제에 대한 일부 발언" Academia.edu
참조
- David Hume (1910) [1748].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P.F. Collier & Son. ISBN 978-0-19-825060-9.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31 December 2007. Retrieved 27 December 2007.
- Wolpert, David (1996). "The Lack of A Priori Distinctions between Learning Algorithms". Neural Computation. 8 (7): 1341–1390. doi:10.1162/neco.1996.8.7.1341. S2CID 207609360.
- Colin Howson (2000). Hume's Problem: Induction and the Justification of Belief.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19-825038-8. Retrieved 7 January 2008.
외부 링크
| Wikiquote는 다음과 관련된 인용구를 가지고 있다: 유도 문제 |
- Zalta, Edward N. (ed.). "The Problem of Inductio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Zalta, Edward N. (ed.). "David Hume: Causation and Inductive Inferenc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인디애나 철학 온톨로지 프로젝트의 도입 문제
- 데이비드 스토브의 웨이백 머신에서의 확률과 흄의 귀납적 회의론(2009년 10월 27일 기록) (1973년)
- 피터 싱어의 칼 포퍼 발견
- D의 유도영장. H. 멜러
- 흄과 유도의 문제
- 제임스 N의 유도 문제에 대한 세속적 대응 앤더슨
- 토머스 불레모어의 실용주의 문제
- 니콜라스 맥스웰의 과학적 진보에 대한 이해. 이 책은 과학 진보와 관련된 유도 문제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다.
- 니콜라스 맥스웰에 의한 우주의 이해와 지식성에 관한 유도와 형이상학적 가정들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