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조물주
Creator in Buddhism
| 시리즈의 일부 |
| 불교 |
|---|
 |
불교는 창조신이나 영원한 신적 [1][2][3]존재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지 않는 종교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사사라, 즉 순환적 부활의 교리에 데바라고 불리는 신성한 존재와 다른 불교 신들, 하늘, 그리고 재신들이 있다고 말한다.불교에서는 비록 그들이 매우 오래 [1][4]살 수 있지만, 이러한 신들 중 누구도 창조자나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친다.불교에서, 신자들은 또한 부활의 순환에 갇혀서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불교는 여러 신을 포함하지만, 주된 초점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Peter Harvey는 이것을 "트랜스 다신교"[1]
불교 문헌은 또한 마하브라마와 같은 평범한 신들이 [5]창조자로 오해받고 있다고 가정한다.불교 존재론은 모든 현상이 다른 현상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의존적 기원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원초적인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자는 인정되거나 식별될 수 없다.초기 불교 문헌에서, 고타마 부처는 또한 [1]그가 우주의 시작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세 동안, Vasubandhu와 같은 불교 철학자들은 창조론과 힌두교 신학에 대한 광범위한 반론을 발전시켰다.이것 때문에, 매튜 캅스타인과 같은 몇몇 현대 학자들은 이 불교의 후기 단계를 [4]반신교적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불교에서 주류인 비신론적인 전통에도 불구하고, B와 같은 몇몇 작가들이 있다. Alan Wallace는 Vajrayana 불교에서 어떤 교리는 창조의 [6]일부 유신론적 교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초기 불교 경전
데미안 키언은 사이유타 니카야에서 부처는 재주기의 주기를 "구별할 [7]수 없는 수십만 년 전"으로 본다고 말한다.Sayyutta Nikaya 15:1 및 15:2는 다음과 같습니다."이 삼사라는 찾을 수 없는 시작이다.첫 번째 포인트는 무지에 의해 방해받고 [8]욕망에 사로잡혀 배회하고 방황하는 존재를 식별하지 못한다.
불교학자 리처드 헤이스에 따르면, 초기 불교 문헌은 창조주의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주로 인식론적 관점 또는 도덕적 관점"에서 다룬다.이 문서들에서 부처는 창조자를 거부하는 무신론자로 묘사되지 않고, 그러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의 초점은 그들의 가르침이 최고의 [9]선으로 이어진다는 다른 스승들의 주장에 맞춰져 있다.
Hayes에 따르면, Tevija Sutta (DN 13)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른 누구도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보는 가장 높은 신으로 여겨지는 브라흐마(브라흐마사하비야타)와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두 브라만 사이의 논쟁에 대한 설명이 있다.그러나 부처의 심문을 받은 결과, 그들은 이 브라흐마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부처는 그들의 종교적 목표를 웃기고, 허무하고,[10] 공허하다고 말한다.
헤이스는 또한 초기 문헌에서 부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창조주 신에 대한 추측을 포함한 종교적 추측에 반대하는 회의론자로 묘사된다고 지적한다.헤이스는 데바다하 수타(마지마 니카야101)를 인용, "우리의 슬픔 경험을 책임지는 것은 신이 아닌 애착, 전생에서의 행동, 운명, 출생의 종류, 노력이라고 독자가 결론내리게 되어 있지만,[11]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어떠한 체계적 주장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나라다 테라는 또한 부처가 아구타라 니카야에서 비판하기 위해 최고신(이시바라)에 의한 창조의 교리를 구체적으로 외친다고 말한다.최고 영주에 의한 이 창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 사람이 경험하는 행복, 고통 또는 중립적인 느낌은 모두 최고 신(이사라만마샤헤투)[12]의 창조에 기인한다."부처는 이 견해가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이어질 운명론적인 가르침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비판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 신의 창조로 인해 인간은 살인자, 도둑, 불성실, 거짓말쟁이, 비방자, 욕설쟁이, 욕설쟁이, 탐욕스럽고 악의적이고 비뚤어진 시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신의 창조를 본질적인 이유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할 욕망도 노력도 필요도, 하지 않을 필요도 없습니다.[12]
또 다른 초기 수타(Devadahasutta, Majjjhima Nikaya 101)에서 부처는 특정 개인이 경험하는 고통과 고통을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이것이 사악한 신일 가능성이 [13]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만약 존재들이 느끼는 기쁨과 고통이 최고 신의 창조적인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면, 니가신은 분명 사악한 최고 신에 의해 창조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고, 날카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자로 오인된 높은 신들

Peter Harvey에 따르면 불교는 우주가 궁극적인 시작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따라서 창조자의 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초기 문헌에서 이 개념에 가장 가까운 용어는 Digha Nikaya [5]1.18과 같은 "위대한 브라흐마"(Maha Brahma)이다.하지만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브라흐마는 세상을 [14]창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팔리 경전에서 불교는 다시 태어난 [15]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이 이론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물리적인 세계 시스템이 종료되고 그 세계 시스템의 존재가 낮은 하늘에서 신으로 재탄생한다.불교 우주론에 따르면 이 역시 끝이 나고, 그 후 홀로 있는 마하브라마가 태어난다.그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갈망하고, 다른 신들은 그의 목사이자 [15]동료로 다시 태어난다.DN 1과 같은 불교 수타에서 마하브라마는 그의 전생을 잊고 자신을 창조자, 창조자, 만능자, 주님이라고 잘못 믿는다.불교 경전에 따르면 이 믿음은 다른 신들에 의해 공유된다.하지만 결국 신들 중 하나가 죽고 전생을 [5]기억하는 힘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그는 낮은 하늘에서의 전생에서 기억나는 것을 가르친다. 마하브라흐마가 창조주라는 것이다.Pali [5]Canon에 따르면, 이것이 창조자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이끈다.

자신을 전능하신 창조자로 착각하는 높은 신(브라흐마)의 비슷한 이야기는 브라흐마니만타니카 수타(MN49)에서 볼 수 있다.이 수타에서 부처는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믿는 바카 브라흐마라는 높은 신이 어떤 영적인 영역을 알지 못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그의 우월한 지식을 보여준다.부처는 또한 바카 브라흐마의 시야에서 그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사라짐으로써 그의 우월한 심령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도 같은 일을 하도록 도전한다.바카 브라흐마는 부처의 [16]우월성을 보여주며 실패한다.이 글은 또한 사악한 사기꾼인 마라가 자신에 대한 브라흐마의 오해를 지지하려는 시도를 묘사하고 있다.마이클 D가 지적한 바와 같이.니콜스, MN49는 영원한 창조자상에 대한 믿음은 악마가 인류를 오도하기 위해 내놓은 교활한 책략이며, 그 의미는 브라흐마의 힘과 영속성을 믿는 브라만들이 그것에 [16]속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타카 악마의 문제
불교 자타카 모음집에는 '악의 [17]문제'와 유사한 창조주의 신에 대한 비판의 윤곽이 나와 있다.
자타카 이야기(VI.208)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만약 브라흐마가 전 세계의 군주이자 다수의 창조주라면, 왜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세상의 불행을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세상을 불의, 거짓, 자만심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정의가 [18]있을 수 있었을 때 불의로 규정했을 때, 만물의 영주가 악으로 규정했을까요?
팔리 부리다타 자타카(제543호)는 보살(미래의 부처) 상태를 가지고 있다.
- "눈을 가진 자는 역겨운 광경을 볼 수 있다.
- 왜 브라흐마는 그의 피조물을 바로잡지 않는거지?
- 만약 그의 넓은 힘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 그의 손은 왜 이렇게 잘 펴지지 않는 걸까요?
- 왜 그의 피조물들은 모두 고통에 처하게 되었을까?
- 왜 그는 모두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까?
- 왜 사기, 거짓말, 무지가 만연할까?
- 왜 거짓을 이기는가? 진실과 정의는 실패한다.
- 브라흐마도 그 중 한 명일 거야
- 누가 잘못된 [12]곳을 피해야 할 세상을 만들었는가?
팔리 마하보디 자타카(528호)에서 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만일 모든 힘을 가진 신이 존재한다면"
- 모든 생명체 행복이나 슬픔을, 연기든 나쁘든 좋은;.
- 그것은 주님 죄 물들여 있다.
- M지만 그의 의지 하죠."[19]
중세 철학자
반면 초기 불교는 하나님의 비평하는 것 개념을 또는 Īśvara 걱정하지 않었다(이후 유신론 인도의 탁월한는 중세 시대의 일이었다)[표창 필요한]중세 인도 불교 신자들은 훨씬 더 철저하게 부상하고 있는 힌두교 theisms(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시도에 의해) 것과 더불어.매튜 Kapstein에 따르면, 중세 불교 철학자들의 논쟁은 "최고 신의 개념에서 공식적인 문제 강조했다 악과 다른 원칙에서 그 주장을 포함한 배치했다."[4]Kapstein 윤곽 논쟁의 이 두번째 라인으로:[4] 따른다.
하나님, theists, 단언하고 영원한 실체 완전히 부패와 변화에서 자유로워 지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영원한야 한다.같은 영원한 지자체의 부패와 변화의 이 세상의, 인과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면 열린다.것은 그것으로 야기된 일의 변화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향상된 그 곳의 인과 기준에서 변화는 변치 않는 원인에 대해 결과에 변경 설명할 수 없다.창조자 신의 가설, 따라서도, 또는 다른 하나님 자신과 부패를 바꿀 수 있으며, 따라서 영원할 수 없는 받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변화하는 세상을 설명하는데 실패했습니다.창조, 즉, 작성자의 덧없음을 수반한다.유신론, 불교 철학자들 마무리하고 있는 사상 체계를 같은 모순을 면할 수 없었다.
Kapstein은 또한 이 시기에 "불교에서 일찍이 유신론을 거부했던 것이 실제로 잘 형성된 반교리주의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지적한다.하지만, 캅스타인은 불교 반신론이 "개인 신의 개념이 비인격적, 도덕적, 인과적 [4]질서의 합리적인 요구를 위반하는 불교 철학적 시스템의 논리적 요구 측면에서 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들은 대부분 철학적인 것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마디아마카 철학자
불교 철학자 나가르주나(1-2세기경)는 '세계의 [20]창조자, 지배자, 파괴자'라는 신에 대한 인도의 비불교 신자들의 믿음을 반박하는 일을 한다.나가르주나는 창조주 신에 대해 다음과 [21]같은 몇 가지 주장을 펼친다.
- 모든 생명체가 신의 아들이라면 고통을 감추기 위해 행복을 이용해야 하며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그리고 그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지 말고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해선 안 된다.아무것도 필요없다면 왜 게임을 하는 어린 소년처럼 모든 생명체를 만들었을까?
- 신이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다면 누가 창조했는가?신이 자신을 창조했다는 것은 진실일 수 없다. 그 무엇도 스스로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만약 그가 다른 창조자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그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 "만약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어떤 이는 신을 증오하고 어떤 이는 신을 사랑한다.
- "다시 말하지만,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면, 왜 인간을 모두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왜 그는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우리는 그가 증오와 사랑으로 행동하고,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그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가르주나는 그의 '상상할 수 없는 찬가'(Acintyastava)에서 이 믿음을 두 [22]구절에서 공격한다.
33. 마술사의 일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다른 모든 세상은 창조주 신을 포함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여러분에 의해 이야기되었습니다.34.만약 창조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 창조된다면, 그는 창조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영구적이지 않다.혹은, 만약 그가 자신을 창조한다면, 그것은 창조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것은 터무니 없다.
나가르주나는 또한 그의 Bodhicittavaraaa에서 [13]창조주에게 반대한다.게다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가르주나는 창조주의 [23]신에 대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집합체(영구적)가 아니라 소망(영구적)의 승리, (영구적)의 승리, (영구적)의 승리, (영구적)으로부터의 승리, (파워풀한) 창조주 이쉬바라로부터의 승리, (파워풀한) 창조주 이쉬바라로부터의 승리, (파워풀한)의 승리, (파워풀)의 승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바비베카(Bhaviveka, c. 500–c. 578)는 또한 그의 Madhyamakhdaydaya(중도의 심장, ch. III)[24]에서 이 아이디어를 비판한다.
후에 마드라카 철학자인 칸드라쿠르티는 그의 중도론 (6.114)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물은 창조신(이스바라)으로부터, 또는 자신으로부터, 또는 그들 자신으로부터, 또는 둘 다로부터 이유 없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항상[조건에 따라] 생산된다."[25]
샨티데바(8세기경)는 그의 보디카리야바타라의 9장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신은 세상의 원인이다말해봐요, 신이 누구죠?요소?그렇다면 왜 말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가? (119) 게다가, 요소들은 다양하며, 영속적이고, 지성이나 활동도 없고, 신성하거나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불순하다.또한 지구와 같은 요소들은 신이 아닙니다.(120) 우주신도 아니고, 공간도 활동성이 없고, 인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배제했습니다.신이 너무 위대해서 임신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생각할 수 없는 창조자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26]말할 수 없다.
바수 반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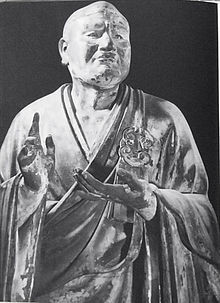
5세기 불교 철학자 바수반두는 창조자의 독특한 정체성은 그의 압하르마코샤에서 [27]세계를 창조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Vasubandhu는 그의 Abhidharmakosha(AKB, 2장)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우주는 신(神)/최고주(最高主) 또는 자기(Puru),a), 원시 근원(Pradhanna) 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는 단일 원인(ekara kara)am)에서 유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Vasubandhu는 창조주 신 또는 단일 대의의 존재에 대한 찬반 다양한 주장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이어지는 논쟁에서 불교 비이론자는 만약 우주가 하나의 원인에 의해 생겨난다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것들이 연속적으로 [28]생겨난다고 본다.유신론자는 하느님의 바람의 힘 때문에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대답한다. 따라서 그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불교는 "그러면 (신의) 욕망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한다.게다가, 이러한 욕망은 동시에 일어나야 하지만, 신은 다중이 아니기 때문에,[28]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유신론자는 이제 신의 욕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신은 그의 욕망을 생산하기 위해 다른 원인을 고려하기 때문이다.불교는 만약 그렇다면, 신은 모든 것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며, 게다가 그는 또한 다른 원인에 의존하는 원인에 의존한다고 응답한다.[29]
또 다른 유신론 논법은 신의 욕망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그러나 신은 하나의 단일 원인이기 때문에, 불교는 이러한 다른 욕망들이 연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특이점이 양립할 [29]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왜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유신론자는 그것이 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이 경우 신은 외적 수단 없이는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기쁨에 군림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기쁨에 대해 군주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에 대해 군주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불교계의 반응이다.[29]또한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게다가, 신은 지옥의 고문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고통의 먹잇감에서 창조한 창조물을 보는 데서 기쁨을 찾는다고 말하는가?이런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불경한 구절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타버리기 때문에 그를 루드라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는 날카롭고, 격렬하고, 배가 될 수 있고, 살과 피와 [30]골수의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교에서는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의 원인으로 관찰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를 부정한다고 말한다.만약 그들이 그들의 신의 보조자로서 관찰 가능한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위치를 수정한다면, "우리는 [30]2차라고 불리는 원인의 활동 옆에 있는 (신성한) 원인의 활동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건한 확언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는 또한 신이 시작이 없기 때문에, 신에 의한 세상의 창조 또한 시작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Vasubandhu의 설명:"유신론자는 신의 일은 [세계의 첫] 창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에게만 의존한 창조물을 따를 것이다. 신 자신처럼 시작은 결코 없을 것이다.이것은 유신론자가 [30]거부한 결과이다.
Vasubandhu는 그의 논평의 이 부분을 끝맺으며 지각 있는 존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 다양한 행동을 하고 그들의 업보의 효과를 경험하며 "이 효과의 원인이 신이라고 잘못 생각한다"고 말한다.우리는 이 잘못된 [31]생각을 없애기 위해 진실을 설명해야 한다.
다른 요가카라 철학자
중국의 승려 현장(fl江, 602~664년)은 7세기 동안 나란다에 머물며 인도에서 불교를 공부했다.그곳에서 그는 아상가와 바수반두에서 전해 내려오는 요가카라 가르침을 연구하여 수도원장 ī라브하드라에 의해 가르쳤다.Xuanzang은 그의 작품인 Chung Weisi Lun(Vijnyptimatratadhi āstra)에서 "위대한 군주" 또는 "위대한 브라흐마"[32] 교리를 반박합니다.
한 교리에 따르면, 실체가 실재하고 만능하고 영원하며 모든 현상을 만들어 내는 위대하고 자기 존재적인 신이 있다.이 교리는 불합리하다.어떤 것이 무언가를 생산한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비영원적이지 않은 것은 퍼지지 않으며, 퍼지지 않는 것은 실재하지 않는다.만약 신의 실체가 만능이고 영원하다면, 그것은 모든 힘을 포함해야 하며 모든 곳에서, 항상, 그리고 동시에 모든 달마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만약 그가 욕망이 생겼을 때 또는 조건에 따라 달마를 생산한다면, 이것은 단일 원인에 대한 원칙과 모순된다.그렇지 않으면, 원인은 영원하기 때문에 욕망과 조건이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다른 교리는 위대한 브라흐마, 시간, 공간, 출발점, 자연, 에테르, 자아 등이 존재하며 영원하고 실제로 존재하며 모든 힘을 부여받고 모든 다르마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위대한 [33]신의 개념과 같은 방식으로 반박한다.
7세기 불교 학자인 다르마쿠르티는 [34]바수반두의 전철을 밟아 그의 프라마아바티카에 창조주의 신이 존재하는 것에 반대하는 많은 주장을 펼친다.
Later Mahayana scholars, such as Śāntarakṣita, Kamalaśīla, Śaṅkaranandana (fl. c. 9th or 10th century), and Jñānaśrīmitra (fl. 975-1025), also continued to write and develop the Buddhist anti-theistic arguments.[35][4][36]
11세기 불교 철학자 라트나키르티는 비크라마실라 대학(현재의 비하르 바갈푸르)에서 힌두교의 나비야-냐야 하위학파에서 나타난 '이스바라'라는 신과 같은 존재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이 주장들은 힌두교와 자이나교의 다른 하위 학파들이 이원론적 [37]창조자의 나비야-냐야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들과 유사하다.
테라바다 불교도
영향력 있는 테라바다 해설가 부처도 창조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부정했다.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브라흐마 신은 없습니다.조건화된 재규격의 세계를 만든 사람.현상만 계속됩니다.원인의 집합으로 조건화된다.(Visuddhimagga 603)[1]
아디부다교리
다른 불교 작가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 작가들은 "아디-불다"에 대한 불교 사상을 어떤 면에서 유신론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아디-불다 이론과 유신론의 유사성
B. Alan Wallace는 일부 경전에서 타타가가르바와 하나로 간주되는 원시 부처(Adi-Buddha)의 Vajrayana 개념이 때때로 삼사라와 열반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 쓰고 있다.월리스에 따르면, 이러한 견해는 "전체 우주가 이 무한하고, 빛나며, 공허한 [38]자각의 전시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Wallace는 이러한 Vajrayana 교리와 신성한 창조적 "존재의 기반"의 개념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한다.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특히 모든 불교 가르침의 정점으로 나타나는 인도-티베타 불교의 아티요가 전통에서 제시된 바자야나 불교 우주론에 대한 신중한 분석은 베다나에서 제시된 견해와 현저한 유사성을 지닌 존재의 초월적 근거와 창조의 과정을 드러낸다.'타'와 '신플라토닉 서양 기독교 [39]창조론'이 그것이다.그는 이 세 가지 관점이 "단일 [39]이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간주될 정도로 공통점이 많다"고 덧붙인다.에바 K. 달가이는 또한 쿤제드 갸얄포라고 불리는 조첸 탄트라가 아디-부다 사만타브하드라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26]유신론을 연상시킨다.
알렉산더 스투드홀메는 또한 카라샤브유하수트라가 어떻게 위대한 보살 관음보살을 우주의 최고 영주로, 다양한 천체와 신의 조상(해와 달, 시바와 비슈누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지적한다.[40]관음보살은 경전의 정석본에서 첫 번째 부처인 아디불다(Svayambhu)와 "원초적 주군(Adinatha)"[41]의 산물로 보인다.
비신론적인 아디부다
짐 발비는 조첸의 "만물의 왕"과 그 동반신들은 "신이 아니라, 우리의 원시적인 계몽의 다른 측면의 상징"이라고 지적한다.쿤제드 귤포는 인과관계를 초월한 영원한 완벽한 존재입니다.Sattvavajra는 원인과 [42]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 안에 우리의 평범하고 분석적이며 판단적인 존재입니다."
남카이 노르부는 또한 이 형상이 창조주 신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이자 조첸 사상의 [43]지반이나 근거의 의인화(ghzi)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제14대 달라이 라마도 마찬가지로 이 신(사만타바드라)을 "베이스"[44] 개념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남카이 노르부는 아디-부다-사만타바드라에 대한 조첸 사상이 "우리의 실제 상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은유로서 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만약 우리가 사만타바드라를 개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현실에서, 그는 비록 우리가 현재 삼사라에 있지만, 결코 이원론에 의해 조건화 된 적이 없다는 우리의 가능성을 나타낸다.처음부터 개인의 상태는 순수했고 항상 순수했다: 이것이 바로 사만타바드라가 나타내는 것이다.하지만 우리가 조건화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만타바드라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이다.그래서 원시 부처라 불리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상태에 대한 [45]은유일 뿐입니다.
탄탈릭 칼라차크라 전통에서 사용되는 아디 붓다라는 용어에 대해 베스나 월리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칼라카크라의 전통이 아디부다를 시작 없는 끝없는 부처의 의미로 말할 때, 그것은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삼사라와 열반의 기초로서 서 있는 선천적인 영지를 언급하고 있다.반면 아디부다를 불멸의 행복에 의해 처음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할 때, 그리고 완벽한 불도를 얻기 위해 공덕과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것은 자신의 타고난 영리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칼라카크라 전통에서 아디부다는 자신의 정신의 궁극적인 본성과 순결의 [46]실천을 통해 자신의 마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 불교 반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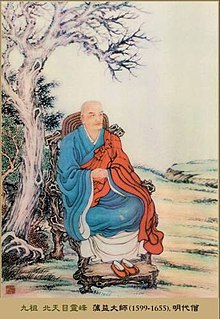
현대는 불교 신자들이 아브라함 종교, 특히 기독교와 접촉하게 했다.선교 활동을 통해 불교 국가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시도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불교의 반론 시도로 반격되었고 불교 모더니즘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불교를 반박하고 그것의 가르침을 비판하려는 최초의 기독교 시도는 알레산드로 발리냐노, 미켈레 루지에리, 그리고 마테오 [47][48]리치와 같은 예수회의 시도였다.
이러한 공격들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서를 쓴 아시아 불교 신자들에 의해 답변되었다. 그들은 종종 기독교 신설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아마도 가장 초기의 시도는 중국 승려 주홍(周紅, 1535–1615)의 시도였을 것이다.기독교에 대한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중국 불교 비평가는 중국의 세 전통(공리, 불교, 도교)[47]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반박하려는 주피(九 (, 반박을 돕는 것)라는 제목의 길고 체계적인 기독교 논평을 쓴 쉬다수(徐大 ()였다.
승려 오우이즈후(五 zh 15, 1599–1655)는 고전 유교 윤리에 의존하면서 신정론을 근거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빅시에(collect ("collect)를 썼다.베벌리 폴크스에 따르면, 그의 수필에서, Zhu는 "예수들이 사랑, 증오, 그리고 벌할 힘을 가지고 신을 투자하는 방식에 반대한다.그는 신이 인간을 선과 악으로 창조할 것이라는 생각을 비판하고, 마지막으로 왜 신이 인간을 [48]악으로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현대의 일본 불교신자들도 기독교의 유신론을 반박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작품을 썼다.푸칸사이 하비안 (1565–1621)은 아마도 이러한 비평가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다, 특히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 변절자가 되어 1620년에 [49]Deus Dailed (하 다이우스)라는 제목의 반 기독교 논쟁서를 썼기 때문이다.선승 세소 소사이는 또한 기독교 신은 베다 브라흐마일 뿐이며 기독교는 불교의 이단적 형태라고 주장한 중요한 반기독교 저작인 '이단 소멸론'을 썼다.그의 비판은 특히 도쿠가와 [50]막부의 지도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일본 불교 신자들은 기독교에 초점을 맞춘 반신론 비판서를 계속 썼다.이러한 인물에는 키유 도진(Kiyu Dojin, 일명 K.a.우가이 테츠조 1814~91년, '기독교에 웃음'(1869년)을 쓴 조도슈의 수장 우가이 테츠조 1814~91년 이노우에 엔료.[51]기리 파라모레에 따르면, 19세기 일본의 기독교 공격은 도쿠가와 시대의 비판보다 더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52]비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대의 테라바다 불교 신자들은 또한 기독교와 현대 신의 이론을 언급하는 창조주 신의 다양한 비판들을 썼다.이 작품들은 A.L. De Silva의 Beyond Believe, Nyanaponika Thera의 불교와 신의 생각, 그리고 Gunapala Dharmasiri의 기독교적 개념에 대한 불교 비평 (1988)을 포함한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 ^ a b c d e 하비, 피터(2019)."불교와 일신교", 페이지 1.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 ^ 탈리아페로 2013, 페이지 35
- ^ Blackburn, Anne M.; Samuels, Jeffrey (2003). "II. Denial of God in Buddhism and the Reasons Behind It". Approaching the Dhamma: Buddhist Texts and Practices in South and Southeast Asia. Pariyatti. pp. 128–146. ISBN 978-1-928706-19-9.
- ^ a b c d e f 캅스타인, 매튜 T.유신론의 불교적 거부 2005; 52; 61.
- ^ a b c d 하비 2013, 36-8페이지
- ^ B. 앨런 월러스, "불교는 정말 비신교적인가?"스노우 라이온 뉴스레터, 제15권, 제1호, 2000년 겨울.ISSN 1059-3691
- ^ Keown, Damien (2013)."불교 백과사전" 페이지 162.루트리지
- ^ 비후 보디(2005)."부처님의 말씀으로: 팔리 캐논의 담론집" 37페이지.사이먼과 슈스터.
- ^ Hayes, Richard P., "불교 스콜라 전통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무신론", 인도 철학 저널, 16:1 (1988: Mar) pgs 5-6, 8
- ^ 헤이스, 리처드 P., "불교 스콜라 전통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무신론", 인도 철학 저널, 16:1(1988년 3월) 페이지 2.
- ^ 헤이스, 리처드 P., "불교 스콜라 전통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무신론", 인도 철학 저널, 16:1(1988년 3월) 9-10페이지
- ^ a b c 나라다 테라(2006) "부처와 그의 가르침", 268-269페이지, 자이코 출판사.
- ^ a b 웨스터호프, 1월 올리버, 사이먼의 "불교에서의 창조"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옥스퍼드 창조 핸드북, 곧 출간될 예정
- ^ 하비 2013, 37페이지
- ^ a b 하비 2013, 36-37페이지
- ^ a b 니콜스, 마이클 D. (2019)."유연성 마라: 불교의 악의 상징의 변형" 페이지 70. SUNY 프레스.
- ^ Harold Netland, Keith Yandell(2009)."불교: "기독교의 탐구와 감정", 184-186페이지.InterVarsity Press.
- ^ Harold Netland, Keith Yandell(2009)."불교: "기독교의 탐구와 감정", 페이지 185-186.InterVarsity Press.
- ^ 나라다 테라(2006) 「부처와 그 가르침」, 271쪽, 자이코 출판사.
- ^ 셰리청종교학, 제12권, 제2호(1976년 6월), 207-216페이지(10페이지),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 ^ 셰리청(1982년).나가르주나의 12문 논문, 93-99페이지.D. 레이델 출판사
- ^ 린트너, 크리스찬(1986년).지혜의 달인: 나가르주나 스님의 글, 26-27페이지.달마주점.
- ^ "bShes-pai-spring-yig." Skt. Sulllekha (나가르주나), Alexander Berzin 옮김, studybuddhism.com
- ^ 슈미트 루켈, 페리(2016).불교, 기독교, 창조의 문제: 카르믹인가 신인가? 25페이지.루트리지
- ^ 페너, 피터(2012).'중도의 존재론', 85페이지Springer 과학 및 비즈니스 미디어
- ^ a b 달가이, 에바 K. "탄트릭 불교에서 창조자의 신의 개념"국제불교학회지 제8권 제1호
- ^ 헤이스, 리처드 P., "불교 스콜라 전통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무신론", 인도 철학 저널, 16:1(1988년: 3월) 11-15.
- ^ a b De La Vallee Poussin & Sangpo (2012), 페이지 675
- ^ a b c De La Vallee Poussin & Sangpo (2012), 페이지 676.
- ^ a b c De La Vallee Poussin & Sangpo (2012), 페이지 677.
- ^ De La Vallee Poussin & Sangpo (2012), 페이지 678.
- ^ Cook, Francis, Chung Wei Shih Lun (의식에 관한 세 가지 텍스트만), 버클리 누마타 센터, 1999, ISBN 978-1886439047, 페이지 20-21.
- ^ Numata Center for Buddhist Translation and Research (January 1999). Chʿeng Wei Shih Lun. 仏教伝道協会. pp. 20–22. ISBN 978-1-886439-04-7.
- ^ 헤이스, 리처드 P. "불교 스콜라 전통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무신론", 인도 철학 저널, 16:1(1988년: 3월) 12페이지 12
- ^ 헤이스, 리처드 P., "불교 스콜라 전통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무신론", 인도 철학 저널, 16:1 (1988년 3월) 14페이지
- ^ 실크어로 "śaanakaranandana", 조나단 A(편집장).브릴의 불교 백과사전 2권: 삶.
- ^ Parimal G. Patil.힌두교 신에 대항하다: 인도의 불교 종교 철학.뉴욕: 콜롬비아 대학 출판부, 2009. 페이지 3-4, 61-66 (각주 포함), ISBN 978-0-231-14222-9.
- ^ B. 앨런 월러스, "불교는 정말 비신교적인가?"1999년 11월 8일자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미국종교아카데미 전국회의 강연.
- ^ a b B. Alan Wallace, "불교는 정말 비신앙인가?" 눈사자 뉴스레터, ISSN 1059-3691, 제15권, 제1호, https://www.shambhala.com/snowlion_articles/is-buddhism-really-nontheistic/
- ^ 알렉산더 스터드홀메, 옴 마니파드메 험의 기원: 카란다브유하경 연구, SUNY, 2002, 페이지 40
- ^ 알렉산더 스터드홀메, 옴 마니파드메 험의 기원: 카란다브유하경 연구, SUNY, 2002, 페이지 12
- ^ Valby, Jim (2016).사만타바드라 국가의 장식 - 만물을 창조하는 왕에 대한 해설 - 완전한 존재 - 모든 현상의 위대한 완벽함.제1권, 제2판, 3페이지
- ^ Norbu & Clemente, 1999, 94페이지
- ^ 달라이 라마(2020년).조첸: '위대한 완벽함의 심장 에센스' 188쪽샴발라 출판사
- ^ Norbu & Clemente, 1999, 페이지 233.
- ^ Wallace, Vesna(2001년).내부 칼라카크라탄트라: 개인의 불교 탄트릭 견해, 18페이지.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 ^ a b 마이나르, 티에리(2017).종교적 배타주의를 넘어서: 예수회는 불교와 쉬다소의 1623년 반박에 맞섰다.예수회 연구 저널
- ^ a b 파울크스, 베벌리이중 절도범: 중국 후기의 예수회 선교사 오우이쯔슈의 비평. 중화불교저널 (2008년, 21:55-75)타이베이:Chung-Hwa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中華佛學學報第二十一期 頁55-75 (民國九十七年),臺北:中華佛學研究所 ISSN:1017-7132
- ^ 엘리슨, 조지(1988)데우스 파괴케임브리지:하버드 대학 동아시아학 평의회. 페이지 154~155.ISBN 0-674-1962-6.
- ^ 아난다, 제이슨, 스톰, 조지프슨(2012).일본 종교의 발명, 50페이지시카고 대학 출판부
- ^ 파라모어키리(2010년).일본의 이념과 기독교, 페이지 8. 참패
- ^ 파라모어, 키리반 기독교 사상과 국가 이념: 이노우에 엔료와 이노우에 테츠지로의 메이지 종파사 동원.성균 동아시아학회지2009년 동아시아학술원 제9권 제1호. 페이지 107-144
참고 문헌
- Harvey, Peter (2013), An Introduction to Buddhism: Teachings, History and Practices (2nd ed.),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 9780521676748
- Taliaferro, Charles, ed. (2013), The Routledge Companion to Theism, New York: Routledge, ISBN 978-0-415-88164-7
- La Vallee Poussin, Louis (예전 트랜스); Sangpo, Gelong Lodro (eng. 트랜스) (2012) 바수반두 1권 Abhidharmakoaa-Bhayaya.모틸랄 바나르시다스 펍스ISBN 978-81-208-3608-2
- Norbu, Namkhai; 클레멘테, Adriano(1999).주요 출처: 쿤제드 귤포, 조첸 셈데의 근본적인 탄트라.스노우 라이온 출판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