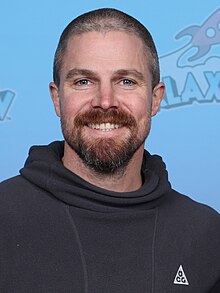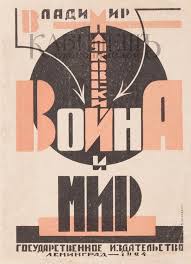전력 거리
Power distance권력 거리는 후자가 전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층부와 하층부의 관계를 말한다.[1] 다양한 힘을 가진 개인과 그 영향, 그리고 인식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 연구에 사용되는 인류학 개념이다. 전력 거리 지수(PDI)를 가장 큰 힘을 가진 개인과 가장 적은 힘을 가진 개인 사이에 설정된 힘의 수용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한다.[1] 이러한 사회에서 권력 거리는 문화의 권력지수를 닮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권력거리가 높은 사회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리를 잡고 더 이상의 명분을 요구하지 않는 위계질서를 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고위층 개인은 존중받고 우러러보게 된다. 전력 간격이 낮은 사회에서는 개인이 권력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출력 거리 문화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존중과 무관하게, 저출력 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추가적인 정당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연구 결과, 기업 내 다른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먼저 문화간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2]
기원
Geert Hofstede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심리학자 겸 교수였다.[3] 그의 직업 이전에, 그는 바다를 여행했고, 그것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그의 견해와 세계적인 규모의 그것의 함의에 영향을 주었다. 그는 50개국과 수천 명의 대기업 직원을 아우르는 전력 거리에 대한 주요 크로스컨트리 연구를 최초로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 호프스테데는 여러 나라의 IBM 직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상사와의 의견 불일치가 두려운지 물었다.[4] 그는 연구 과정에서 관찰된 서로 다른 힘의 거리 수준과 관리 스타일을 관찰했고, 그의 연구 결과를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힘의 거리, 불확실성 회피 등 4가지 문화적 차원을 제안하는 데 활용했다.[5] 이러한 차원은 그의 작품인 "문화의 결과"에서 설명되었다. 그는 전력 거리 지수(PDI)를 만들어 전력 거리가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를 측정했다.
이론의 전개와 연구
호프스테데
문화 차원 이론
호프스테데는 문화 차원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문화 간 의사소통의 중요한 틀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계량화할 수 있는 가장 초기 이론이며 문화간의 인식된 차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특히 문화간 심리학, 국제 사업, 문화간 의사소통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1967년과 1973년 사이에 실시한 IBM 직원의 가치에 대한 글로벌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개발을 위한 통계적 절차("인자 분석"이라고도 한다)에 의해 추진되었다. 호프스테데의 이론은 문화의 6가지 차원을 확인했다: 권력 거리,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불확실성 회피, 남성성 대 여성성, 단기 대 장기적 지향, 그리고 면죄부 대 자기 억제.[6]
연구에 따르면 전력 거리는 문화마다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국제 기업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샤오슈앙 린 등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은 겸손하다고 여겨지는 지도자들 밑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겸손은 종종 저전력 거리 문화와 관련된 특성이다.[citation needed] 이 연구는 직원의 자기 개념의 권력화가 직장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상사의 겸손도 결정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환경은 호프스테데가 제안한 집단주의 차원과도 유사할 것이다.
전력 거리 지수(PDI)
PDI는 사회, 조직, 기관 내에서 권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덜 힘 있는 구성원들이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8] 이 지수는 전력 거리 수준과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점수를 각 국가에 할당한다. PDI는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정의되는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기도 한다. PDI는 상대적 가치를 사용한다. 이것은 국가를 비교할 때만 유용하다.[9]
Hofstede는 동일한 유형의 위치에 있는 IBM 직원이 제공한 답변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한 3개 지역과 50개국의 전력 거리 점수를 도출했다. PDI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1. 세 가지 설문 질문 준비:
- 직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얼마나 자주 그들의 매니저와 의견 차이를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했는가? ("매우 자주"에서 "아주 드물게"까지 1-5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10]
- 상사의 실제 의사결정 스타일에 대한 부하 직원의 인식(독재적 또는 온정주의적 스타일의 설명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백분율, 가능한 4가지 스타일 + "이 대안 중 하나 없음")[10]
- 부하 직원의 상사 의사결정 스타일 선호(백분율, 독재적 또는 온정주의적 스타일을 선호하거나 다수결에 근거한 유형으로서 협의 방식이 아님)[10]
2. 숫자로 나타낼 답을 미리 코딩(예: 1, 2, 3, 4...)
3. 각 국가 또는 특정 답변을 선택한 비율의 동일한 표본에 대한 평균 점수 계산
4. 통계적 절차를 이용하여 질문을 집단(클러스터 또는 요인)으로 분류
5.정수로 각 점수를 곱한 후 3점 추가 또는 빼기
6. 다른 고정 번호 추가
Hofstede는 낮은 PDI 문화에서 정서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발견했다. 권력을 기대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더 많은 민주적 또는 협의적 관계가 있다. 국민은 권력자와 상대적으로 상호의존적이며, 국민 사이에 분배되는 권력의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상황에서 분권적 권한과 평면적 경영구조는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관리자와 부하직원이 평균적으로 지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며, 의사결정 책임의 분포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열린 문' 정책과 같은 정책이 더 자주 시행되는데, 이는 상위 개인은 하위 개인을 더 수용하고, 하위개인은 상급자에게 도전하거나 건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영향을 미친다. PDI가 낮은 국가의 예로는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북유럽 국가들이 있다.[11]
더 높은 PDI 문화에서, 권력 관계는 온정주의적이고 독재적이며, 중앙집권적인 권위가 존재한다; 계층의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넓은 격차나 감정적 거리가 있다. 권력을 쥔 개인에 대한 의존도(일명 역의존도)가 상당하다. 직장에서는 부하직원이 자신의 열등한 직책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상급자는 의사결정 과정에 폭넓은 참여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더 높은 PDI 문화는 대개 독재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채택하는데, 이는 부하직원들이 그들의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반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10] 전력 거리 문화가 높은 나라들은 대개 불평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 벨기에, 프랑스, 말레이시아, 아랍 세계는 PDI 문화가 높은 국가나 지역의 예로 간주된다.[11]
호프스테데의 연구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제한된다: 중화와 서구식 방법론으로 비서구 국가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과정의 각 단계는 중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 설문지는 큰 힘의 거리를 반영한다. 그 질문은 연구자들의 규범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고안되었다. 이 설문지는 주로 비교 분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에 부응했고 다양한 직원들에게 "문화적으로 뚜렷한 비교 축을 강요"함으로써 그것을 만들었다.[12] 또한 이 설문지는 비서구 국가를 분석하기 위해 서구의 방법론을 채택했으며, 서구 국가 내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비교적 선택적이었다. 예를 들어 PDI는 다른 형태의 서구 불평등을 무시한 채 편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사와 부하 관계에 집중했다. 명백히, 이 질문들은 전력 거리를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인종, 식민지, 광범위한 계급 불평등을 측정하지 못했다.[citation needed]
하이레, 기셀리, 포터
지난 세기[when?] 중반, 메이슨 하이레, 에드윈 지젤리, 리만 포터는 전력 거리 개념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로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권력 선호의 차이를 탐구하였다.[13] 그들은 설문지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것은 매슬로우의 니즈 계층의 수정된 버전에 기초하였다. 설문지의 목적은 14개국의 관리자들이 현재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의 필요에 대해 어떻게 만족하는지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앙케이트에서 문화간의 권력 거리와 연계된 차원은 자율성과 자기실현화였다.
In accordance with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s in their questionnaire, the 14 countries were clustered into five main groups, which Haire et al. labeled Nordic-European (Denmark, Germany, Norway, and Sweden), Latin-European (Belgium, France, Italy, and Spain), Anglo-America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Developing (Argentina, Chile, and India)와 일본. 이 분석은 5개 그룹이 자율성과 자기실현화와 관련하여 제시한 다양한 평균 표준화된 점수를 사용했다. 긍정적인 수치는 14개국의 평균 관리자보다 필요의 더 큰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부정적인 수치는 덜 만족함을 나타냈다.
| 하이레 1966 | 자율성 | 자기실현화 |
| 북유럽어 | .36 | .25 |
| 라틴 유럽어 | -.16 | .23 |
| 앵글로 아메리칸 | -.14 | -.09 |
| 개발 중인 | -.25 | -.11 |
| 일본. | -.25 | -.11 |
멀더.
전력 거리에 대한 또 다른 주요한 연구는 마우크 멀더에 의해 수행되었다.[14] 사회가 권력거리에서 약해짐에 따라 소외계층이 권력 의존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제를 깔았다. 저전력 거리 문화인 네덜란드의 사회·조직적 맥락에서 멀더가 실험한 결과, 사람들이 '전력 거리 감소'[14]를 꾀하려 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 특권층일수록 부하직원과의 권력 거리를 유지하거나 넓히려는 경향이 있다.
- 부하로부터의 전력 거리가 클수록 전력 보유자는 그 거리를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 덜 힘센 사람들은 자신과 윗사람 사이의 권력 거리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 전력 간격이 작을수록 전력 소비량이 적은 개인이 그 거리를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Hofstede 이후 – GLOBE 스터디
호프스테데에 이어 글로벌리더십 및 조직행동효과(GLOBE) 프로젝트는 '전력 거리'를 '조직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권력을 동등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동의하는 정도'로 정의했다.[15] 전력 거리는 로버트 J가 1990년에 구상한 글로브 연구 프로그램에서 설명한 9가지 문화 차원 중 하나로 더욱 분석되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의 하우스.[16]
지도자의 실효성이 문맥상이라는 전제를 전제로, 주도되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조직적 가치와 규범, 신념이 지도자의 효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했다.[17] 글로브는 산업 수준(금융서비스, 식품가공, 통신), 조직(각 산업의 여러 분야), 사회(62개 문화)에서 존재하는 관행과 가치를 측정한다.[18] 결과는 전 세계 62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951개 조직에서 약 1만7000명의 관리자(manager)가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량적 데이터 형태로 제시되며, 이는 62개 각 사회가 파워 디스턴스 등 문화의 9대 속성, 6대 글로벌 리더 행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준다.[19]
GLOB는 전력거리와 관련하여 '전력거리의 뿌리', '심리적인 흐름과 힘', '문화간 흐름과 전력거리' 등 전력거리 가치, 관행, 기타 측면에 대한 문화적 영향을 연구한다. 또한 가족력 값이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조사하고, 높은 전력 거리 사회와 낮은 전력 거리 사회를 비교한다.[20]
언제"그 Cross-Cultural천, 파워 거리"논의하고, 네개의 기본 요인 권력 거리의 사회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별도로:지배적인 종교나 철학, 정부의 민주적인 원칙, 강한 중산층의 존재, 이민자들이 사회의 인구 비율이 전통이 설명되어 있다.[21] 네 가지 기본 현상 가운데 연계가 존재하지만, 이 연구는 한 사회의 주요 신념, 가치, 종교가 권력 거리에 가장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민주적인 전통과 어느 정도 강한 중산층의 존재에 의해 완화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두 가지 요인 모두 전력 거리를 좁힐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회에서 이민자의 큰 비율은 위에서 제시된 모든 상황에서 저전력 거리 추세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연구는 또한 종교와 관계없이 민주주의의 전통이나 중요한 중산층이 아닌 사회는 실질적으로 높은 권력 거리 수준을 가질 것이라고 결론짓는다.[22]
응용 프로그램 및 효과
권력 거리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차 문화 환경에서 중요한 차원으로, 이는 어느 정도 권력 불평등을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형성되는 이른바 '문화 규범'에 기여한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은 같은 상황에 직면하거나 같은 환경에 있을 때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조직과 사회의 불평등, 특히 고출력 거리 국가의 경우 이를 묵인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도 있다.[23]
일터
관리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
전력 비거리가 높은 조직에서는 직원들이 서열이 낮음을 인정하고, 상사에 대한 존경과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상사는 결정을 내릴 때 직원들과 상의하기보다는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상태 기호는 종종 표시되고 과시된다. 고용주나 관리자는 부하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방, 주차장, 엘리베이터와 같은 개인 시설을 가질 수도 있다. 기업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조직의 고위직은 전력거리가 적은 기업에 비해 부하직원보다 월급을 훨씬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24]
저전력 거리 조직에서 상급자는 지위 상징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고 직원 토론과 참여에 더 개방적일 것이다. 직원들은 윗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거나 경영진에 도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24]
리더쉽과 목소리 행동의 관계
직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은 목소리 행동과 표현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권력 거리뿐만 아니라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좌우된다.[25] 류성민과 지안차오랴오는 495명의 부하(엔지니어)와 164명의 리더(기술자,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부하 음성 행동의 결과를 결정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개발했는데, 이는 이들 문화의 근접성과 구조상 힘의 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연구는 낮은 전력 거리 지도자들이 부하들이 그들의 생각과 우려를 토론할 수 있도록 변화 지향적인 환경을 촉진하고 이것이 그들의 감탄을 초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높은 전력 거리 사업에서 부하직원은 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 사이의 격차에 복종하고, 그들의 윗사람과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26] 이 연구는 더 나아가 이 권력지수의 사상과 해결책이 지도자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므로, 권력거리의 사람들이 방향성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우려나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27] 고출력지수의 모순은 그것이 리더-종속관계를 약화시켜 표현력 부족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목소리 행동과 표현은 저전력 거리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 스타일에 의존한다.[28] 이 연구는 전력 거리 문화에 기반을 둔 리더십 스타일은 직원들이 자신의 환경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어진 도구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직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업에서 전력 거리는 조직 내 최고위층과 최저위층 구성원 간의 관계를 (직원에 의한) 수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29] 저전력 거리 사업장의 직원들이 사무실 전력의 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고용인이 고출력 거리 설정보다 더 많은 힘을 (따라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더 많은 자유)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상사의 직급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고출력 거리 환경에 있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그 반대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높은 전력 거리 문화에서 하위직 근로자들이 직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높은 전력 거리 지역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도전하지 않고 많은 권력을 쥐고 있다. 위계질서와 권한은 고용주와 감독자에게 더 많은 자원배분, 보상, 처벌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그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이 부하를 독재적으로 이끌고 지도할 수 있게 한다. 상하의 계층적 차별화로 점차 직장 내 보이지 않는 간극이 생기는데, 부하직원은 상사와 소통할 때 더 큰 감수성과 신중함을 쌓는 경향이 있다.[30][31]
후배 직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면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citation needed]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최근 고출력 거리 국가의 직원들과 하급 직원들이 상사에게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낮다고 증명했다.[23] 그 이유 중 하나는 하위직 직원들은 대개 직속 상사에게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직 직원들은 상위직 관리자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적고 시간도 적기 때문이다.[32] 도움을 청하는 부하직원이 무능이나 능력 부족을 의미한다는 설도 지배적이다.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일부 감독관들은 부하 직원들을 의심하게 되고, 그 문제를 그들의 지위와 능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하위직 직원들의 굴욕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33] 이런 기후는 점차 직원들이 경영자와 대화하기보다는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도록 강화시켜 왔다.
높은 전력 거리 환경에서는 낮은 전력 거리 환경에서는 감리자의 주안점인 직원 대신 감리자가 업무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34] 업무지향성은 일상업무의 완성도와 업무능률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업무를 넘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하급자 관계가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해, 결국 부하직원이 상사의 도움을 구하려는 의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35] 낮은 전력 거리 국가들에 비해 권위와 위계질서가 부각되지 않고 감독관 접근이 용이하고 부하직원과 친밀한 관계를 쌓을 의지가 있는 권력은 상당 부분 최소화된다는 사회가 평등을 포용하고 있다.[23]
절차적 정의(조직의 상급자가 종업원에 대해 공정하게 대우하는 수준으로 누적적으로 정의되는)와 관련하여 종업원이 갖는 신념은 권위와 관계의 성격을 나타낸다.[36] 직장에서의 공정한 처우는 세 가지 확립된 기준 즉, 성별, 권위간의 신뢰, 그리고 심리적 계약 이행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의무화된다. 흔히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clarification needed] 정의를 닮았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개인의 인식과 문화에 미치는 힘의 거리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절차적 정의에 대한 직원의 인식은 권력 거리와 성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낮은 전력 거리 문화에서 직원들은 강한 개인적 연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다루고 있는 권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권위에 앞서 겸허하게 제출하는 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전력 거리 문화에서의 부정적 행동은 조직이 이들을 나쁘게 대할 때 증가한다.[37] 따라서 저전력 거리 문화에서 절차적 정의와 권위에 대한 신뢰에 의해 직원과 상급자의 관계가 윤곽을 드러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높은 전력 거리 문화권의 직원들은 권위에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 또 모욕적인 언사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정한 대우(절차적 정의)를 고려하지 않고 권위의 잘못된 행동을 받아들이기 쉽다.[38] 저전력 및 고전력 거리 문화 모두에 대해, 그들은 공정한 처우가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심리적 계약의 이행이라고 인식했다.
자비로운 행동으로
연구에 따르면, 높은 전력 거리 국가 출신의 사람들은 낮은 전력 거리 국가 출신의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자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덜하다고 한다.[39]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불평등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과 수용이 어떤 불공평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어떻게든 축축하게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 환경으로 간주하고 변화를 만들기보다는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40][41] 누적적으로 불평등을 받아들일수록 비편식성을 덜 느끼게 되고 결국 책임을 덜게 된다. 그 결과는 높은 힘의 거리가 인간간의 관계와 부 조건의 차이를 넓히는 것이다. 반대로, 저전력 거리 국가의 사람들은 불평등 현상에 더 민감하고, 그들의 불협화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직접 문제를 조정하거나 수정해야 할 더 큰 책임감을 부여한다.[40][41]
통제 가능/통제 불가능 니즈의 영향
수요의 종류는 전력 거리 배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자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발생되는 니즈는 통제 가능한 범주와 통제 불가능한 범주로 분류되는데, 전자의 발생은 노력 부족에 기인하는 반면 후자는 자연재해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서 기인한다. 개인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은 그들이 증가하는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영향을 미친다.[42][43][44]
전력 거리 수준은 통제 가능한 요구에 대한 사회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권력 거리 배경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정당한 불평등이라고 인식하고, '문제'에 말려드는 것을 꺼리며, 대개는 무시한다. 반대로, 저전력 거리 사회는 불공정에 대해 편협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서 불협화음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39]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통 받을 때 더 잘 반응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한 원조가 사회적 정당한 불평등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전력 거리 배경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대한 지원과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추측된다.[42][45][46][47] 이런 상황에서는 자선을 베푸는 경향이 있는 의무감이 더 높아진다.[39]
공동/교류 관계 규범의 영향
니즈의 이면에 있는 관계규범도 책임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관계의 종류는 주로 사람들이 원조를 제공하는 대가로 합리적인 특권이나 이익을 기대하는 교환관계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상호의식 없이 진심으로 그리고 너그럽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관계로 분류된다.[48][49]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공동체의 관계보다는 교류 관계와 관련된 필요를 만났을 때 도움을 거절할 가능성이 더 높다.[39][49][50][51] 이와 같이, 카렌 페이지 윈터니치와 인롱 장은 높은 권력 거리 국가의 자선 단체들은 대중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다 쉽게 동기부여가 되는 통제할 수 없는 필요나 두드러진 공동 관계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39]
높은 전력 및 낮은 전력 거리 문화 및 그 영향의 예
힘의 거리는 전 세계의 문화와 다른 문화가 서로 가지고 있는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말레이시아는 PDI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나라다.[52] 권력 거리가 높아 지배인이나 교수, 공무원 등 권력자에게 권위가 중시되고 권력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다. 전력 거리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52] 적당한 힘의 거리를 가진 미국은 어떤 사람이 교수에게 질문하거나 상사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53]
오늘날 세계의 많은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 일부 단체들은 전세계적으로 인수를 하고, 노동자들을 파견하여 각국에서 해외로 학생들을 보내왔다.[53] 만약 미국인 매니저가 저쪽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간다면, 그들은 그들에게 놀랄 만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인 매니저는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말레이시아인들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앉아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52]
이집트는 전력 거리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또 다른 나라다.[54] 이 나라의 학생들은 그들의 교수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질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나라는 또한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험을 치른다; 이렇게 함으로써,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의 권위가 만들어진다.[54] 전력 거리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캐나다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이 나라의 학생들은 어떤 학년에 대한 교수에게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이 기대되는지에 대한 매우 명확한 지침을 갖고 싶어할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학생들은 왜 그들이 학점을 받았는지에 대해 그들의 교수들에게 질문하고 도전할 수 있다.[citation needed]
개인주의/집단주의 및 권력거리
문화마다 전력 거리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권력 거리와 관련되고 중복되는 것이 개인주의 vs 집단주의다.[55] 호프스테데는 권력거리와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면에 있는 학자다. 호프스테데는 집단주의를 "...의문의 여지 없는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개인들이 친족이나 씨족 또는 다른 집단이 자신을 돌볼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틀에 대한 선호"라고 정의하고, 개인주의는 "...개인이 ca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에서 느슨하게 짜여진 사회적 틀에 대한 선호"라고 정의한다.자신들과 직계 가족들만의"[52] 개인주의 국가의 예로는 미국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전체 집단의 이익보다 그들 자신의 복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중국과 대조적이다, 집산주의 국가 사람들은 집단의 전반적인 복지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요구나 필요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사회에서 문화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력 거리와 관련이 있다.[55]
개인주의, 집단주의, 권력 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함께 연구된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한 나라의 PDI 점수는 그 나라의 집단주의 정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주의 국가들이 전형적으로 권력의 지위가 덜 중요한 개인과 그들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집단적 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집산주의 국가들로 설명된다.[55] 호프스테데는 개인주의, 집단주의, 권력 거리는 한 나라의 부와 크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56] 부유한 나라들은 보통 개인주의로 높은 점수를 받고 전력 거리 지수로 낮은 점수를 받는 반면, 가난한 나라들은 집단주의와 PDI로 높은 점수를 받는다.[56]
위안페이룽과 징저우의 연구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개념적 모델에서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권력 거리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57] 모델은 대면 또는 원격 회의에서 발생하는 그룹 구성원 상호 작용과 그룹에 대한 개별 직원 기여도를 바탕으로 그룹의 창의성을 검토한다. PDI에 높은 문화는 결정과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 그룹 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룹 구성원들에게 상호작용하고 말을 적게 한다. 그러므로, 높은 권력 문화는 "항상 창의성을 육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훼손할 수도 있다. 실제 팀에서는 제구실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저전력 거리 문화의 경우, 각 개인이 창의성을 높이고 위대한 혁신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입증된 그룹 전체의 기능에서 발언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그룹 내에서의 창의성은 "그룹 구성원 인지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한다"[57]고 한다. 전력 거리는 집단의 창의성과 상호작용을 위한 다른 환경을 만드는 지수에 기반한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연계요인자
기후
기후와 전력 거리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으며, 온난한 기후의 사회는 추운 기후의 사회보다 전력 거리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제기되어 왔다. 따뜻하고 안락한 기후에서 음식 등 생필품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이 그만큼 어렵지 않고, 엄격한 규율이나 준비, 고난이 필요 없다. 이러한 조건들은 비록 일부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상급자로부터 엄격한 조직과 방향이 오는 것이 이로운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다.[24]
반면에, 더 춥고 더 가혹한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규율과 신중함이 필수적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음식을 찾는 대신 게으름을 피우고 하루만 쉬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후에서는 자기 수양과 억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자질이 국민에게 배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질서는 대외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24]
민주주의
민주주의 정부는 저전력 거리 사회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데,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고출력 거리 사회에서는 '노동과 보수 사이의 이념적 균열'이 양극화되는 반면, 저전력 거리 문화에서는 갈등의 손상과 고갈을 피하기 위해 양극단 간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참고 항목
참조
- ^ Jump up to: a b Mcray, Jenni, ed. (2015). Power Distance. Leadership Glossary: Essential Terms for the 21st Century. 1st edition. Santa Barbara, CA: Mission Bell Media. ISBN 9780990730002.
- ^ 오어바흐, 마이클 P. "교차 문화 관계" 세일럼 프레스 백과사전, 2019. 2020년 2월 25일에 접속.
- ^ "Hofstede, Geert Dutch educator (b. 1928)". In Capstone Press, Capstone Encyclopaedia of Business. Hoboken, NJ: Wiley. May 2003. p. 224. ISBN 9780857085559.
- ^ 그로프, 아담. 「전력 거리 지수(PDI). 살렘 프레스 백과사전, 2018.
- ^ "호프스테디, 게르트." The New Penguin Business Dictionary, Graham Bannock, Penguin, 2003년 1월호. Credo Reference, 2020년 2월 25일에 액세스.
- ^ Hoppe, Michael (February 2004). "An Interview with Geert Hofstede". Th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993–2005). 18 (1): 75–79.
- ^ Lin, Xiaoshuang; Chen, Zhen Xiong; Tse, Herman H. M.; Wei, Wu; Ma, Chao (September 2019). "Why and When Employees Like to Speak up More Under Humble Leaders? The Roles of Personal Sense of Power and Power Dista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8 (4): 937–950. doi:10.1007/s10551-017-3704-2. S2CID 148630892.
- ^ Hofstede, Geert H. (1997).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second ed.). New York: McGraw-Hill. p. 27. ISBN 978-0-07-707474-6. 원래 1991년에 문화와 단체: 마음의 소프트웨어: 문화간 협력과 생존을 위한 그것의 중요성으로 출판되었다.
- ^ 벨로 2011, 페이지 26
- ^ Jump up to: a b c d 호프스테데 1997, 페이지 25
- ^ Jump up to: a b Smit, Chris (26 April 2012). "Power Distance or PDI". culturematters.com. Retrieved 14 September 2015. (자체 감지)
- ^ Ailon, Galit (2008). "Mirror, Mirror on the Wall: Culture's consequences in a value test of its own desig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 (4): 885–904. doi:10.2307/20159451. JSTOR 20159451.
- ^ Haire, Mason; Ghiselli, Edwin E.; Porter, Lyman W. Managerial Thinking: An international study. Research program of the Institute of Industrial Rela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New York: Wiley. OCLC 925871372.
- ^ Jump up to: a b Mulder, Mauk (1977). The Daily Power Game. International series on the quality of working life. Leiden, the Netherlands: Martinus Nihoff Social Sciences Division. doi:10.1007/978-1-4684-6951-6. ISBN 978-1-4684-6953-0.
- ^ 이는 다른 저자들이 사용하는 "전원 거리"의 정의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Mulder 1977을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의 상대적인 힘의 차이로 본다.
- ^ House, Robert J.; Hanges, Paul J.; Javidan, Mansour; Dorfman, Peter W.; Gupta, Vipin (2004). Cultu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The GLOBE Study of 62 Societie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ISBN 978-0-7619-2401-2.
- ^ Hoppe, Michael H. (2007). "Culture and Leader Effectiveness: The GLOBE Study" (PDF). Inspire!Image!Innovate!. Retrieved 16 September 2015.
- ^ 2004, 페이지 xv 오류:
- ^ House 2004, 페이지 3 없음:
- ^ House 2004, 페이지 513
- ^ House 2004, 페이지 518
- ^ House 2004, 페이지 526 (
- ^ Jump up to: a b c Ji, Yang; Zhou, Erhua; Li, Caiyun & Yan, Yanling (2015). "Power Distance Orientation and Employee Help Seeking: Trust in Supervisor as a Mediator".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43 (6): 1043–1054. doi:10.2224/sbp.2015.43.6.1043.
- ^ Jump up to: a b c d e Velo, Veronica (2011). Cross-Cultural Management. New York: Business Expert Press. ISBN 978-1-60649-350-2.
- ^ Liu, Sheng-min; Liao, Jian-qiao (1 November 2013).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Speaking Up: Power Distance and Structural Distance as Moderator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1 (10): 1747–1756. doi:10.2224/sbp.2013.41.10.1747.
- ^ Farh, Jiing-Lih; Hackett, Rick D.; Liang, Jian (June 2007). "Individual-Level Cultural Values as Moderator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Employee Outcome Relationships in China: Comparing the Effects of Power Distance and Traditional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0 (3): 715–729. doi:10.5465/amj.2007.25530866.
- ^ Kirkman, Bradley L.; Chen, Gilad; Farh, Jiing-Lih; Chen, Zhen Xiong; Lowe, Kevin B. (August 2009). "Individual Power Distance Orientation and Follower Reactions to Transformational Leaders: A Cross-Level, Cross-Cultural Examin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2 (4): 744–764. doi:10.5465/amj.2009.43669971.
- ^ Walumbwa, Fred Ochieng; Lawler, John J. (1 November 2003). "Building effective organization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ollectivist orientation, work-related attitudes and withdrawal behaviours in three emerging econom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4 (7): 1083–1101. doi:10.1080/0958519032000114219. S2CID 154065859.
- ^ "전력 거리." AMA 비즈니스 및 관리 사전, 조지 토마스 쿠리안, AMACOM, 미국경영협회 출판부, 2013년 1월호 Credo Reference, 2020년 2월 25일에 액세스.
- ^ Kirkman B. L.; Chen G.; Farh J.-L.; Chen Z. X.; Lowe K. B. (2009). "Individual power distance orientation and follower reactions to transformational leaders: A cross-level, cross-cultural examin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2 (4): 744–764. doi:10.5465/amj.2009.43669971.
- ^ Lee F (1997). "When the going gets tough, do the tough ask for help? Help seeking and power motivation in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2 (3): 336–363. doi:10.1006/obhd.1997.2746. PMID 9606170.
- ^ Lonner, Walter J.; Berry, John W.; Hofstede, Geert H.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Cross 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SRN 1496209.
- ^ Lee, Fiona (2002). "The Social Costs of Seeking Help".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8 (1): 17–35. doi:10.1177/0021886302381002. S2CID 144730667.
- ^ Bochner S.; Hesketh B. (1994). "Power distance,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job-related attitudes in a culturally diverse work group".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5 (2): 233–257. doi:10.1177/0022022194252005. S2CID 146254586.
- ^ Madlock P. E. (2012). "The influence of power distance and communication on Mexican wor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49 (2): 169–184. CiteSeerX 10.1.1.1031.1789. doi:10.1177/0021943612436973. S2CID 145301210.
- ^ Lee, Cynthia; Pillutla, Madan; Law, Kenneth S. (August 2000). "Power-Distance, Gender and Organizational Justice". Journal of Management. 26 (4): 685–704. doi:10.1177/014920630002600405. S2CID 220587601.
- ^ Tyler, Tom R.; Lind, E. Allan (1992), "A Relational Model of Authority in Group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lsevier, pp. 115–191, doi:10.1016/s0065-2601(08)60283-x, ISBN 978-0-12-015225-4
- ^ Bond, Michael H.; Wan, Kwok-Choi; Leung, Kwok; Giacalone, Robert A. (March 1985). "How are Responses to Verbal Insult Related to Cultural Collectivism and Power Distanc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6 (1): 111–127. doi:10.1177/0022002185016001009. S2CID 145613406.
- ^ Jump up to: a b c d e Winterich, Karen Page; Zhang, Yinlong (1 August 2014). "Accepting Inequality Deters Responsibility: How Power Distance Decreases Charitable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 (2): 274–293. doi:10.1086/675927.
- ^ Jump up to: a b 커밍스, 윌리엄 H.&Venkatesan, M.(1976년)."인지 불협화음과 소비 행태:검토 증거의".저널 마케팅 연구의. 13(3):303–308. doi:10.2307/3150746.JSTOR 3150746. 커밍스, 윌리엄 H. 및에서 제외, Venkatesan, M.(1975년)."인지 불협화음과 소비 행태:검토 증거의".Schlinger에서, 메리 제인(교육.).소비자 연구의 발전, 볼륨 2.NA-02. 앤 아버, 미시간:협회 소비자 연구.를 대신하여 서명함. 21–32.
- ^ Jump up to: a b Festinger Leon; Carlsmith James M (1959). "Cognitive Consequences of Forced Complia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8 (2): 203–210. CiteSeerX 10.1.1.497.2779. doi:10.1037/h0041593. PMID 13640824.
- ^ Jump up to: a b Betancourt, Hector (1990). "An Attribution–Empathy Model of Helping Behavior: Behavioral Intentions and Judgments of Help-Giv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 (3): 573–591. doi:10.1177/0146167290163015. S2CID 144925139.
- ^ Brickman, Philip; Rabinowitz, Vita Carulli; Karuza, Jurgis Jr; Coates, Dan; Cohn, Ellen & Kidder, Louise (1982). "Models of Helping and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37 (4): 368–384. doi:10.1037/0003-066x.37.4.368. ERIC EJ262702.
- ^ Shaver, Kelly G. (1985). The Attribution of Blame: Causality, Responsibility, and Blameworthiness. New York: Springer Verlag. ISBN 978-0-387-96120-0.
- ^ Skitka, Linda J. & Tetlock, Philip E. (1992). "Allocating Scarce Resources: A Contingency Model of Distributive Just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8 (6): 491–522. doi:10.1016/0022-1031(92)90043-J.
- ^ Karasawa, Kaori (1991). "The Effects of Onset and Offset Responsibility on Affects and Helping Judgm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6): 482–499. doi:10.1111/j.1559-1816.1991.tb00532.x.
- ^ Lerner Melvin J.; Reavy Patricia (1975). "Locus of Control, Perceived Responsibility for Prior Fate, and Helping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9 (1): 1–20. doi:10.1016/0092-6566(75)90029-x.
- ^ Aggarwal Pankaj; Law Sharmistha (2005). "Role of Relationship Norms in Processing Brand Inform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2 (3): 453–64. doi:10.1086/497557.
- ^ Jump up to: a b Clark, Margaret S.; Ouellette, Robert; Powell, Martha C. & Milberg, Sandra (1987). "Recipient's Mood, Relationship Type, and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 94–103. doi:10.1037/0022-3514.53.1.94. PMID 3612495.
- ^ Brockner, Joel; Paruchuri, Srikanth; Idson, Lorraine Chen; Higgins, E.Tory (January 2002). "Regulatory Focus and the Probability Estimates of Conjunctive and Disjunctive Event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87 (1): 5–24. doi:10.1006/obhd.2000.2938.
- ^ Johnson, Jennifer Wiggins & Grimm, Pamela E. (2010). "Communal and Exchange Relationship Perceptions as Separate Constructs and Their Role in Motivations to Donate".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0 (3): 282–294. doi:10.1016/j.jcps.2010.06.018.
- ^ Jump up to: a b c d Schermerhorn, John R.; Harris Bond, Michael (July 1997). "Cross‐cultural leadership dynamics in collectivism and high power distance settings".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18 (4): 187–193. doi:10.1108/01437739710182287.
- ^ Jump up to: a b Smith, Aileen; Hume, Evelyn C. (December 2005). "Linking Culture and Ethics: A Comparison of Accountants' Ethical Belief Systems in the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Power Distance Contexts". Journal of Business Ethics. 62 (3): 209–220. doi:10.1007/s10551-005-4773-1. S2CID 144181957.
- ^ Jump up to: a b Geier, Denise (1 January 2013).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online classroom".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1 (1): 29–41. Gale A319614502.
- ^ Jump up to: a b c Watson, James; Hill, Anne (2015). Communicati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ondon, UK: Bloomsbury.
- ^ Jump up to: a b Hofstede, Geert (1 December 2011). "Dimensionalizing Cultures: The Hofstede Model in Context".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 (1). doi:10.9707/2307-0919.1014.
- ^ Jump up to: a b Yuan, Feirong; Zhou, Jing (October 2015). "Effects of cultural power distance on group creativity and individual group member creativity: Power Distance and Creativity in Group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6 (7): 990–1007. doi:10.1002/job.2022.